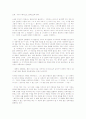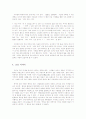목차
1. 작품의 선정이유
2. 작품의 설명과 구조파악
3. 시인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비판
4. 글을 마치며
2. 작품의 설명과 구조파악
3. 시인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비판
4.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 진짜 바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시인의 출생지가 항구 도시인 포항이라는 점이다. 어렸을 때부터 슬픈 일이 있거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찾던 곳이 바로 포항 앞바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도시 한가운데 닻을 내린 바다약국’이라는 점을 볼 때 진짜 바다이기 보다는 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다로 대표되는 자연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4. 글을 마치며
우리는 가끔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며 아름다운 바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한다. 분명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기에 어쩌면 이것이 귀소본능(歸巢本能) 일지도 모른다. 또한 삭막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떠나 정이 많고 믿음이 있는 농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곤 한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냄새가 많이 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점점 사회는 변하고 있다. 산업발전의 표상인 청계천 고가도로 대신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한강은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도시 곳곳에 마음의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자연이 생겨났다. 또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술취한 취객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자발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情)이 있는 사회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최근 “FREE HUGS"운동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뤄지고 있는데 참 따뜻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 운동은 호주에서 한 시민이 시작한 것인데 전쟁을 반대하고 포옹을 통해 사람의 체온을 느낌으로써 서로 보다 가까워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몇몇 젊은 대학생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나 역시 인사동길을 걷다가 그와 포옹을 한 적이 있다. 멋쩍은 면도 있었지만 너무나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느껴졌다. 그 체온은 바로 정(情)인 것 같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의 변화에는 항상 문학이 선봉의 역할을 맡고 있다. 60,70년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박노해 시인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가들에 의해 세상에 보여 졌다. 그로 인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운동이 이루어져 요즘에는 노동자들이 똑같은 경제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듯 김왕노 시인을 비롯한 지금의 도시 문학가들에 의해 세상은 좀 더 인간다운 사회,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바로 문학이 있기에.
4. 글을 마치며
우리는 가끔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며 아름다운 바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한다. 분명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기에 어쩌면 이것이 귀소본능(歸巢本能) 일지도 모른다. 또한 삭막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떠나 정이 많고 믿음이 있는 농촌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하곤 한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냄새가 많이 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점점 사회는 변하고 있다. 산업발전의 표상인 청계천 고가도로 대신 시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한강은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도시 곳곳에 마음의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자연이 생겨났다. 또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술취한 취객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자발적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情)이 있는 사회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최근 “FREE HUGS"운동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뤄지고 있는데 참 따뜻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이 운동은 호주에서 한 시민이 시작한 것인데 전쟁을 반대하고 포옹을 통해 사람의 체온을 느낌으로써 서로 보다 가까워지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몇몇 젊은 대학생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나 역시 인사동길을 걷다가 그와 포옹을 한 적이 있다. 멋쩍은 면도 있었지만 너무나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느껴졌다. 그 체온은 바로 정(情)인 것 같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의 변화에는 항상 문학이 선봉의 역할을 맡고 있다. 60,70년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박노해 시인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가들에 의해 세상에 보여 졌다. 그로 인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운동이 이루어져 요즘에는 노동자들이 똑같은 경제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듯 김왕노 시인을 비롯한 지금의 도시 문학가들에 의해 세상은 좀 더 인간다운 사회,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바로 문학이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