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는 ‘아무거나 다 좋다’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나아가 다른 의견에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는 것, 즉 기준이 다르므로 타인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문학작품을 감상한다고 할 때 어떤 학생은 그 작품에서 숭고미를 느꼈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은 숭고미가 아닌 비장미를 자아낸다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면 학생의 감상능력은 0점이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의 현실이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A라고 혹은 B라고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잣대를 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이러한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정해진 답을 인정하며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 형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왕따문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아 기피, 성적 소수자 배척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내가 유일한 존재이듯 타인도 그러하며 나와 기준이 다르므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는 개방성을 지닌, 즉 통약불가능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문학작품을 감상한다고 할 때 어떤 학생은 그 작품에서 숭고미를 느꼈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석은 숭고미가 아닌 비장미를 자아낸다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으면 학생의 감상능력은 0점이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학교육의 현실이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A라고 혹은 B라고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잣대를 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이러한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정해진 답을 인정하며 자라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 형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왕따문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아 기피, 성적 소수자 배척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내가 유일한 존재이듯 타인도 그러하며 나와 기준이 다르므로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는 개방성을 지닌, 즉 통약불가능성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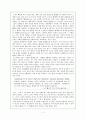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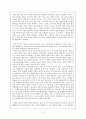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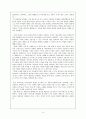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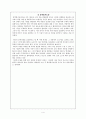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