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야수주의란?
Ⅱ. 야수파의 대표 작가들
1.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2. 블라맹크 (Maurice de Vlaminck)
3. 루오 (Georges Rouault)
4. 라울뒤피 (Raoul Dufy)
5. 드 랭 (Derain, Andre)
<참고문헌>
Ⅱ. 야수파의 대표 작가들
1. 앙리 마티스 (Henri Matisse)
2. 블라맹크 (Maurice de Vlaminck)
3. 루오 (Georges Rouault)
4. 라울뒤피 (Raoul Dufy)
5. 드 랭 (Derain, Andre)
<참고문헌>
본문내용
립하여, 유화 외에 수채화에도 뛰어나 부동의 명성을 획득하였다. 28세가 된 1905년 살롱 도톤느에서 마티스의 ‘호사, 정숙, 쾌락’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기까지는 주로 인상파류의 풍경화를 제작한다.
1920년을 분기점으로 현저히 달라진다. 그 해에 뒤피는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방스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 방스에서“여기서 빛에 대해 개안하지 못했다면 나는 인상파나 야수파의 아류화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일생을 통해 빛이야말로 색채의 원천으로 빛이 없는 색채는 생명을 잃은 무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확실히 그의 작품들, 그 중에서도 1920년 이후에 제작된 수채화들은 빛의 향연으로 눈부시다. 뒤피의 그림이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빛난다는 견해는 분명히 지나치다. 하지만 그의 그림 앞에서는 색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티스 혹은 피에르 보나르의 그림조차 빛을 잃고 만다.
그후 브라크와 피레네 산맥 언저리의 레스타크로 옮겨 세잔풍의 회화양식을 실험하고, 프리에스와는 뮌헨을 여행하며 빛의 미학가치를 모색한다. 빛을 찾는 그의 발길은 1910년의 노르망디해안, 에브르시, 견직물회사의 간부로 일하던 리옹 등을 거쳐 43세가 된 1920년에 빛의 고을인 방스로 흘러들어 ‘빛’의 음악적 조형언어를 창조하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친다.
‘모차르트송 바흐송‘드뷔시송 등 좋아하던 음악가를 위한 초상화를 제작했고, 오렌지 빛깔의 콘서트 가수가 있는 오케스트라 등을 통해 율동적인 붓놀림이 바로 음악임을 증명했다.이처럼 율동이며 리듬인 그의 경쾌한 붓놀림에는 불우했던 유년시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라고는 한 움큼도 찾아볼 수 없다. 잔업에 찌들린 금요일 밤의 노동을 그린다 해도 그의 음악적 붓질이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면 그것은 일요일의 휴식을 노래하는 일요일의 그림이 되고 만다. 그것은 일종의 마술이었다. 빛의 음악성을 추구하는 도정은 뒤피 자신의 해방의 몸부림에 다름 아니었다. 방스 체재 이후 그의 화면에서 인상파의 정지된 빛과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 대신 어린 풀과 나무와 사람이 불타오르는 듯한 색채로 변신하여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방스에 머물면서 그가 획득한 가장 큰 미학은 색채=빛이라는 등식의 발견이었다. 이 즈음부터 세잔풍의 엄격함은 화면에서 추방되었다.
1921년에 제작한 방스의 샘터는 뒤피가 자신만의 빛을 손에 넣었음을 보여준다. 경쾌한 데생과 온화한 곡선, 그리고 무성한 잎과 그림자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드러내고 있다. 중앙의 흰 탑과 밝은 청색 벽에 초점을 주고 연한 장밋빛과 황토색의 벽이 말하는 색채의 질서를,그 빛의 등가를 재어서는 악보를 작성하듯, 음악적으로 포착해 낸 것이었다. 1920년 이후 뒤피는 더욱 많은 수채화를 제작하게 된다. 수채화는 그에게 있어서만은 유화의 밑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유화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키워왔다. 그 투명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수채화로 나타났는데, 그 수채화의 신선한 생명력과 투명성은 순간적인 승부로 결정지어졌다.
그의 수채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질구레한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이었다. 다시 말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붓놀림에 의해 결정되는‘시간이 그의 수채화에 투명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소중한 구성요소였다. 그리하여 그의 수채화는 회화라기보다 하나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음악처럼 하나의 시간 예술이 된 수채화를 감상하는 감각은 나의 청각일까, 아니면 나의 시각일까. 방스로 가기 위해 잠시 들른 니스의 지중해는 그런 의문 속에 삼각파의 물결을 일으키며 뒤피풍의 상형문자로 나는 바다, 나는 바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22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을 여행한 후, 자유분방한 선과 명쾌한 색채성을 합성한 장식적 양식을 확립하여, 유화 외에 수채화에도 뛰어나 부동의 명성을 획득하였다.
작품에는 해안의 산책길·경마장·악회·요트경기 등을 다룬 것이 많다. 이들은 단순화된 소묘와 대담한 색채의 조화 속에서 현실과 환상, 프랑스적 매혹과 우아성을 강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유쾌한 생의 기쁨을 준다. 뒤피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자질구레한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고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이다. 그리고, 그 앙상불 속에서 놀라울 만큼 신선한 음악이 태어난다. 그것은 온전한 시간의 예술이다. 아마 뒤피 만큼 회화를 시간의 함수로 포착한 화가는 없을 것이다. 그는 빛을 추구하는 생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더욱 늠름하게, 더욱 비개성적인 그림을 소망하였다. 52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53년 파리에서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5. 드 랭 (1880.6.10~1954.9.8)
프랑스의 화가. 파리 교외인 샤토 출생. 일찍이 회화와 기계에 취미를 느껴, 공과대학 입학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회화를 전공하였다. 처음에는 샤토에 살고 있던 M.de 블라맹크와 친교를 맺고 같은 아틀리에에서 제작하였다.
1905년 H.마티스와 알게 되어 그 해의 살롱 도톤에 출품, 가장 대담한 포비즘(Fauvism:野獸派)의 화가로서 주목되었으나, 2∼3년 후에는 격정적 색채를 버리고 침정(沈靜)한 색조로 바꿨으며, P.세잔과 흑인조각의 단순화된 형태와 긴밀한 구성에 마음이 이끌린 것이 큐비즘(Cubism:立體派)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이지적인 그의 기질이, 포브[野獸]의 분방한 원색의 범람에서 궁극적으로 형태의 엄격함, 화면질서나 구성을 바라는 원래의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이탈리아 근세 초기의 회화나 고딕 예술, 프랑스 옛 대가의 화풍 등에 심취하면서 독자적인 탐구를 계속하여, 전통을 현대로 계승시킨 신고전주의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은근한 어두운 계통의 색채를 기조로 뚜렷한 명암과 오묘한 세부적인 잔손질로 화폭에 뛰어난 내면성과 청신한 현대감각을 담았다
<참고문헌>
김미정, 2006, 서양미술사, 미진사
김현화, 2007,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김영나, 2005, 서양미술의 기원, 시공사
최윤아 역, 2006, 미술의 유혹, 예담
김호경 역, 2005,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1920년을 분기점으로 현저히 달라진다. 그 해에 뒤피는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방스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 방스에서“여기서 빛에 대해 개안하지 못했다면 나는 인상파나 야수파의 아류화가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일생을 통해 빛이야말로 색채의 원천으로 빛이 없는 색채는 생명을 잃은 무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작업에 몰두했다. 확실히 그의 작품들, 그 중에서도 1920년 이후에 제작된 수채화들은 빛의 향연으로 눈부시다. 뒤피의 그림이 서양미술사에서 가장 빛난다는 견해는 분명히 지나치다. 하지만 그의 그림 앞에서는 색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티스 혹은 피에르 보나르의 그림조차 빛을 잃고 만다.
그후 브라크와 피레네 산맥 언저리의 레스타크로 옮겨 세잔풍의 회화양식을 실험하고, 프리에스와는 뮌헨을 여행하며 빛의 미학가치를 모색한다. 빛을 찾는 그의 발길은 1910년의 노르망디해안, 에브르시, 견직물회사의 간부로 일하던 리옹 등을 거쳐 43세가 된 1920년에 빛의 고을인 방스로 흘러들어 ‘빛’의 음악적 조형언어를 창조하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친다.
‘모차르트송 바흐송‘드뷔시송 등 좋아하던 음악가를 위한 초상화를 제작했고, 오렌지 빛깔의 콘서트 가수가 있는 오케스트라 등을 통해 율동적인 붓놀림이 바로 음악임을 증명했다.이처럼 율동이며 리듬인 그의 경쾌한 붓놀림에는 불우했던 유년시절에 대한 어두운 기억이라고는 한 움큼도 찾아볼 수 없다. 잔업에 찌들린 금요일 밤의 노동을 그린다 해도 그의 음악적 붓질이 바람결처럼 스쳐 지나면 그것은 일요일의 휴식을 노래하는 일요일의 그림이 되고 만다. 그것은 일종의 마술이었다. 빛의 음악성을 추구하는 도정은 뒤피 자신의 해방의 몸부림에 다름 아니었다. 방스 체재 이후 그의 화면에서 인상파의 정지된 빛과 그림자는 사라진다. 그 대신 어린 풀과 나무와 사람이 불타오르는 듯한 색채로 변신하여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방스에 머물면서 그가 획득한 가장 큰 미학은 색채=빛이라는 등식의 발견이었다. 이 즈음부터 세잔풍의 엄격함은 화면에서 추방되었다.
1921년에 제작한 방스의 샘터는 뒤피가 자신만의 빛을 손에 넣었음을 보여준다. 경쾌한 데생과 온화한 곡선, 그리고 무성한 잎과 그림자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눈부시게 드러내고 있다. 중앙의 흰 탑과 밝은 청색 벽에 초점을 주고 연한 장밋빛과 황토색의 벽이 말하는 색채의 질서를,그 빛의 등가를 재어서는 악보를 작성하듯, 음악적으로 포착해 낸 것이었다. 1920년 이후 뒤피는 더욱 많은 수채화를 제작하게 된다. 수채화는 그에게 있어서만은 유화의 밑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유화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키워왔다. 그 투명성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수채화로 나타났는데, 그 수채화의 신선한 생명력과 투명성은 순간적인 승부로 결정지어졌다.
그의 수채화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질구레한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이었다. 다시 말해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붓놀림에 의해 결정되는‘시간이 그의 수채화에 투명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가장 소중한 구성요소였다. 그리하여 그의 수채화는 회화라기보다 하나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음악처럼 하나의 시간 예술이 된 수채화를 감상하는 감각은 나의 청각일까, 아니면 나의 시각일까. 방스로 가기 위해 잠시 들른 니스의 지중해는 그런 의문 속에 삼각파의 물결을 일으키며 뒤피풍의 상형문자로 나는 바다, 나는 바다’라고 외치고 있었다.
22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을 여행한 후, 자유분방한 선과 명쾌한 색채성을 합성한 장식적 양식을 확립하여, 유화 외에 수채화에도 뛰어나 부동의 명성을 획득하였다.
작품에는 해안의 산책길·경마장·악회·요트경기 등을 다룬 것이 많다. 이들은 단순화된 소묘와 대담한 색채의 조화 속에서 현실과 환상, 프랑스적 매혹과 우아성을 강하게 표현하여 보는 이에게 유쾌한 생의 기쁨을 준다. 뒤피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자질구레한 세부의 정확함이 아니고 전체적인 진실과 긴장감이다. 그리고, 그 앙상불 속에서 놀라울 만큼 신선한 음악이 태어난다. 그것은 온전한 시간의 예술이다. 아마 뒤피 만큼 회화를 시간의 함수로 포착한 화가는 없을 것이다. 그는 빛을 추구하는 생을 통하여 더욱 정확하게, 더욱 늠름하게, 더욱 비개성적인 그림을 소망하였다. 52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53년 파리에서 회고전을 개최하였다.
5. 드 랭
프랑스의 화가. 파리 교외인 샤토 출생. 일찍이 회화와 기계에 취미를 느껴, 공과대학 입학준비를 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회화를 전공하였다. 처음에는 샤토에 살고 있던 M.de 블라맹크와 친교를 맺고 같은 아틀리에에서 제작하였다.
1905년 H.마티스와 알게 되어 그 해의 살롱 도톤에 출품, 가장 대담한 포비즘(Fauvism:野獸派)의 화가로서 주목되었으나, 2∼3년 후에는 격정적 색채를 버리고 침정(沈靜)한 색조로 바꿨으며, P.세잔과 흑인조각의 단순화된 형태와 긴밀한 구성에 마음이 이끌린 것이 큐비즘(Cubism:立體派) 탄생의 계기가 되었다.
이지적인 그의 기질이, 포브[野獸]의 분방한 원색의 범람에서 궁극적으로 형태의 엄격함, 화면질서나 구성을 바라는 원래의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도 이탈리아 근세 초기의 회화나 고딕 예술, 프랑스 옛 대가의 화풍 등에 심취하면서 독자적인 탐구를 계속하여, 전통을 현대로 계승시킨 신고전주의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은근한 어두운 계통의 색채를 기조로 뚜렷한 명암과 오묘한 세부적인 잔손질로 화폭에 뛰어난 내면성과 청신한 현대감각을 담았다
<참고문헌>
김미정, 2006, 서양미술사, 미진사
김현화, 2007, 20세기 미술사, 한길아트
김영나, 2005, 서양미술의 기원, 시공사
최윤아 역, 2006, 미술의 유혹, 예담
김호경 역, 2005,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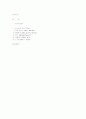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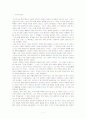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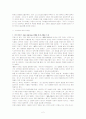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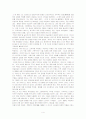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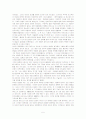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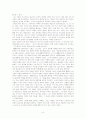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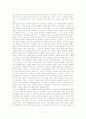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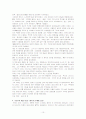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