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황제국 지향체제
1. 황제 칭호 사용과 그 배경
2. 국제 관계 속의 고려의 위상
Ⅲ. 음서제
Ⅳ. 귀족적 측면의 특성
1. 귀족적제 설에 관한 고찰
2. 관료제 설에 관한 고찰
3. 양측 입장에 관하여
Ⅳ. 맺음말
Ⅱ. 황제국 지향체제
1. 황제 칭호 사용과 그 배경
2. 국제 관계 속의 고려의 위상
Ⅲ. 음서제
Ⅳ. 귀족적 측면의 특성
1. 귀족적제 설에 관한 고찰
2. 관료제 설에 관한 고찰
3. 양측 입장에 관하여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이다. 또 군주권의 강약에 따라
귀족제 · 관료제도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군주권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5~15세기
의 비잔틴제국의 경우 관료제가 발달해 있으면서 귀족제가 병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 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귀족제 또는 관료제로 파악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고려사
회는 6전(典) 조직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지마 귀족의 존재도 건재하였으므로 이에 대
한 성격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중국사에도 귀족(貴族)이라는 용어(用語)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며, 송대 및 원대에 만들어진 각종 문헌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귀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귀한가문’, ‘귀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고, 특정 신분층을 의미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일본 메이지 명치시기(明治時期)에 새로운 사회체계로 설정(設定)된 화족(華族)
에 대한 신분을 합리화시키는 설명으로서 중국 중세에서 설정한 것이며, 일본학계에서의 귀
족제설은 경도대학(京都大學)의 학설일 뿐 일본학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고려에 일정한 영향을 준 당(唐)을 귀족제 사회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이다.
당에서도 귀족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제적 대우가 없었으며, 단지 관료신분에 대한 특권으로
서 죄지은 관료의 관품(官品)과 맞바꾸어 형벌을 면제해 주는 관당(官當)이라는 것이 있었는
데, 이는 관직을 가진 관료였기 때문에 우대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고려사회의 관료체제 및 전시과체제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 귀족
또는 관료들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검정된 이후에 정치적 성격이 규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연구상태는 기본 바탕이 잘 마련되지 못한 채 결론이 먼저 나온
것은 아닐까? 원점으로 돌아가 당시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
은 없는가? 곧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귀족적 특징이라고 열거된 사항들이 어느 사회에나 존
재할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기에, 장차의 연구과제는 유럽 · 중국 · 일본 그리고 고려 귀족제
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사회의 성격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지닌 고려 왕조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것은 황제국을 지향했던 나라 고려, 음서제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당대의 질서 유지 측
면에서의 시스템, 그리고 호족 중심의 지방 분권적 성격을 지녔던 사회라는 특징으로 요약
하여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바로 고려가 약 천 년전 이라는 긴 시간 속에 있던 나라지만, 현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구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종속되어 가는 많은 사회적 부분과 매 상황마다 중대한 선택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고려가 가졌던 주체적 사고, 강한 자신감의 표출인 황제국 지향체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변화된 사회에서 파편화된 우리들을 하나의 결합체로, 또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되며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하현강, <韓國中世史硏究>, 일조각 , 1984
박용운, <高麗時代史> 上, 일지사, 2004
박종기, <五百年 高麗史>, 푸른역사, 1999
박용운, <高麗時代 蔭敍制의 實際와 그 機能>, 한국사연구회, 1982
박재우, <高麗 君主의 국제적 위상>, 고려사학회, 2005
장동익, <高麗王祖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하나의 소견>, 한국중세사학회, 2001
귀족제 · 관료제도 좌우될 수 있으므로 군주권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5~15세기
의 비잔틴제국의 경우 관료제가 발달해 있으면서 귀족제가 병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 사회의 정치적 성격을 귀족제 또는 관료제로 파악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고려사
회는 6전(典) 조직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지마 귀족의 존재도 건재하였으므로 이에 대
한 성격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중국사에도 귀족(貴族)이라는 용어(用語)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며, 송대 및 원대에 만들어진 각종 문헌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귀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귀한가문’, ‘귀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고, 특정 신분층을 의미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일본 메이지 명치시기(明治時期)에 새로운 사회체계로 설정(設定)된 화족(華族)
에 대한 신분을 합리화시키는 설명으로서 중국 중세에서 설정한 것이며, 일본학계에서의 귀
족제설은 경도대학(京都大學)의 학설일 뿐 일본학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고려에 일정한 영향을 준 당(唐)을 귀족제 사회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이다.
당에서도 귀족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제적 대우가 없었으며, 단지 관료신분에 대한 특권으로
서 죄지은 관료의 관품(官品)과 맞바꾸어 형벌을 면제해 주는 관당(官當)이라는 것이 있었는
데, 이는 관직을 가진 관료였기 때문에 우대를 받은 것이었다.
결국 고려사회의 관료체제 및 전시과체제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 귀족
또는 관료들의 정치 · 사회 · 경제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검정된 이후에 정치적 성격이 규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연구상태는 기본 바탕이 잘 마련되지 못한 채 결론이 먼저 나온
것은 아닐까? 원점으로 돌아가 당시 사회의 여러 현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볼 필요성
은 없는가? 곧 지금까지 고려사회의 귀족적 특징이라고 열거된 사항들이 어느 사회에나 존
재할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기에, 장차의 연구과제는 유럽 · 중국 · 일본 그리고 고려 귀족제
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려사회의 성격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Ⅳ. 맺음말
이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지닌 고려 왕조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것은 황제국을 지향했던 나라 고려, 음서제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당대의 질서 유지 측
면에서의 시스템, 그리고 호족 중심의 지방 분권적 성격을 지녔던 사회라는 특징으로 요약
하여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바로 고려가 약 천 년전 이라는 긴 시간 속에 있던 나라지만, 현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구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종속되어 가는 많은 사회적 부분과 매 상황마다 중대한 선택에 놓여 있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고려가 가졌던 주체적 사고, 강한 자신감의 표출인 황제국 지향체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변화된 사회에서 파편화된 우리들을 하나의 결합체로, 또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되며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하현강, <韓國中世史硏究>, 일조각 , 1984
박용운, <高麗時代史> 上, 일지사, 2004
박종기, <五百年 高麗史>, 푸른역사, 1999
박용운, <高麗時代 蔭敍制의 實際와 그 機能>, 한국사연구회, 1982
박재우, <高麗 君主의 국제적 위상>, 고려사학회, 2005
장동익, <高麗王祖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하나의 소견>, 한국중세사학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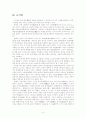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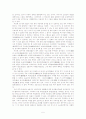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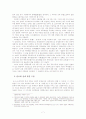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