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부의 만남, 만복(萬福)의 근원.
(2) 함께 고생한 어려운 시절
(3) 어미를 찾는 아이들
(4) 나 홀로 남아.
※ 제문(祭文)의 문학성.
(2) 함께 고생한 어려운 시절
(3) 어미를 찾는 아이들
(4) 나 홀로 남아.
※ 제문(祭文)의 문학성.
본문내용
교제할 사람에게 빼앗김이 있으면 잊어버리기가 쉬움을 얻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마흔 셋이다. 치아와 머리털이 쇠약해졌는데, 어찌 실인(室人)을 젊은 부인으로 둘 수 있겠는가. 이는 내가 잊지 못하는 마음이 전일하니, 내 몸을 마치기 전에는 당신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으리라.” 死生之際, 日遠而日忘固常情, 而吾之日愈遠而吾之恨愈多, 則此吾愈遠而愈不能忘也. 人固有妻亡而再娶者, 是猶得所思奪于所接, 而易於忘也. 吾今年四十有三矣. 齒髮皆衰, 豈可使室有少婦人乎. 是吾所不忘者專, 而有身之前, 無非思君之日也.
이런 다짐 속에 아내의 빈자리를 생활 곳곳에서 확인하면서 고독하게 여생을 마쳤다. 그의 「재곡실인문(再哭室人文)」의 한 대목은 그 절절한 감정이 오늘날 읽어보더라도 오래도록 깊은 여운을 품게 한다.
“내가 매양 나그네로 있을 때는 시골집에서 편지가 온 것을 만나면 그것이 당신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매양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을 어귀나 문을 바라보면서 장차 당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미 들어와서 방문이나 마루의 섬돌을 보면서는 당신이 있는 듯이 여기지 않은 적이 없고, 조석으로 우리 부모님께 진지를 올릴 때 당신이 주선하여 그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사내아이가 앓는 소리를 하고, 딸이 아플 때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이 생각되고, 마당의 곡식과 텃밭의 채소를 때에 맞게 맛볼 때에 생각나고, 추위와 더위를 당하여 나의 의복이 때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 생각나오. 생각이 이르면 슬픔이 이르지만, 곡(哭)을 하면 새어나가게 할 수가 있다오....그런즉 곡(哭)이 없는 슬픔은 곡이 있는 슬픔보다 심하오...정(情)을 잊으면 생각이 없을 수 있고, 생각이 없으면 슬픔을 잊을 수 있으련만, 나의 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吾每客而値鄕書至, 疑其有君之書也而思, 每歸而望閭及門, 而若將見君也而思, 旣入而睹房軒陛, 無非似君也者而思, 朝夕進食于我父母, 而若君周旋其傍焉而思, 男呻女病, 而聞其呼母也而思, 場圃蔬以時嘗也而思, 當寒暑吾衣服不時適也而思, 思至則哀至, 哭則可以泄也. 是無哭之哀, 甚於有哭也....忘情則可以無思, 無思則可以忘哀, 而吾之情其可以忘耶. (정범조,「재곡실인문(再哭室人文)」,(『한국문집총간240』79면))
사대부의 생활 진정(眞情)을, 아내에 대한 정감을 이렇게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제문(祭文) 밖에 없는 것이다.
※ 제문(祭文)의 문학성.
조문(弔文)이나 제문(祭文)은 죽은 이를 위로하고 추억한다는 점은 같지만 조문에 비해 제문이 일반적으로 더 격식을 갖춘 글이고 널리 쓰인다. 뿐만 아니라 조(弔)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설명한 글을 보면 “간혹 교만하고 귀한 체하다가 몸을 죽음으로 몰고간 자가 있고, 혹은 편협하고 화를 잘 내다가 도리를 무너뜨린 자가 있고, 혹은 뜻은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자도 있고, 혹은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도 얽매여 펴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후인들이 추억하며 위로하는 것을 아울러 조(弔)라고 명명한다” 이유원,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국역 임하필기1』, 민족문화추진회, 2000.
라고 하여 대상 인물의 생애가 순탄치 못했을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제문은 친척이나 벗에게 제전(祭奠)을 드릴 때 사용하는 글이라 하여 대상 인물을 일반적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추억하는 대상 인물의 생애적 특징이 ‘조문’과 ‘제문’의 명칭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이유원(李裕元:1814-1888)이 『문체명변』의「제문(祭文)」조항을 요약해 놓은 글 이유원,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국역 임하필기1』, 민족문화추진회, 2000, 165면.
을 보면 그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제문이라 하여 글을 짓지 않고 “단지 고향(告饗)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는데, 중세(中世) 이후로 언행(言行)까지 겸하여 찬양하고 애상하는 뜻”을 부쳤다고 하여 “대체로 축문(祝文)의 변체(變體)”로 제문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형식은 산문도 있고 운문도 있고 변려문도 있으며, 운문 중에도 산문, 사언(四言), 육언(六言), 잡언(雜言), 초사체(楚辭體), 변려체(騈儷體)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유협이 “제전(祭奠)은 본디 공순하고 애절해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공순함과 애절함이 중요하다고 한다. 제문의 문사(文辭)가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거나 정서가 맺혀서 펴지지 않는 경우는 모두 공력을 들이지 않은 글이라고 지적하였다.
제문은 실생활의 필요에 의한 글이긴 하지만, 글을 쓴 사람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는데다가 ‘제망실문’의 경우는 생활의 예절을 갖추는 이유도 희박하고 어디까지나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그 글의 감동이 깊게 전해진다. 특히 18세기 무렵으로 오면 정(情)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문체의 변화도 일어나 제문(祭文)의 경우도 글이 길어지고 정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형상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다. 문예적 형상성이 강화된 것이다. ‘노긍(盧兢:1737-1790)’이 그 문체를 파격적으로 구사하여 자신의 깊은 정감을 그대로 드러내기 좋도록 제문을 썼다 안대회, .......
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고, ‘심노숭(沈魯崇:1762-1837)’ 김영진, 「孝田 沈魯崇 文學 一攷 -悼亡文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회, 199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문)
이 아내에 대해 쓴 제문도, 망자(亡者)의 재(才)덕(德)에 대한 상투적 칭찬이 없고 ‘오호’ ‘애재’ 같은 단어로 슬픔의 진술을 반복하지도 않으며 마주 앉아 대화하듯 문답체를 구사하며 지난날을 추억하기도 하고 자신의 현재 일상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방식의 문체를 구사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편의 소설이 소설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문학적 수준과 완성도가 저절로 높아지지 않듯이, 한 편의 제문이 제문의 형식을 갖추었거나 파격을 보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학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것은 제문한편 한편의 문학적 수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운자를 넣어서 짓고, 문체의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그 감정의 진실함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이런 다짐 속에 아내의 빈자리를 생활 곳곳에서 확인하면서 고독하게 여생을 마쳤다. 그의 「재곡실인문(再哭室人文)」의 한 대목은 그 절절한 감정이 오늘날 읽어보더라도 오래도록 깊은 여운을 품게 한다.
“내가 매양 나그네로 있을 때는 시골집에서 편지가 온 것을 만나면 그것이 당신의 편지가 아닐까 생각되고, 매양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마을 어귀나 문을 바라보면서 장차 당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미 들어와서 방문이나 마루의 섬돌을 보면서는 당신이 있는 듯이 여기지 않은 적이 없고, 조석으로 우리 부모님께 진지를 올릴 때 당신이 주선하여 그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사내아이가 앓는 소리를 하고, 딸이 아플 때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이 생각되고, 마당의 곡식과 텃밭의 채소를 때에 맞게 맛볼 때에 생각나고, 추위와 더위를 당하여 나의 의복이 때에 적합하지 못할 때에 생각나오. 생각이 이르면 슬픔이 이르지만, 곡(哭)을 하면 새어나가게 할 수가 있다오....그런즉 곡(哭)이 없는 슬픔은 곡이 있는 슬픔보다 심하오...정(情)을 잊으면 생각이 없을 수 있고, 생각이 없으면 슬픔을 잊을 수 있으련만, 나의 정을 잊을 수 있겠는가.” 吾每客而値鄕書至, 疑其有君之書也而思, 每歸而望閭及門, 而若將見君也而思, 旣入而睹房軒陛, 無非似君也者而思, 朝夕進食于我父母, 而若君周旋其傍焉而思, 男呻女病, 而聞其呼母也而思, 場圃蔬以時嘗也而思, 當寒暑吾衣服不時適也而思, 思至則哀至, 哭則可以泄也. 是無哭之哀, 甚於有哭也....忘情則可以無思, 無思則可以忘哀, 而吾之情其可以忘耶. (정범조,「재곡실인문(再哭室人文)」,(『한국문집총간240』79면))
사대부의 생활 진정(眞情)을, 아내에 대한 정감을 이렇게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제문(祭文) 밖에 없는 것이다.
※ 제문(祭文)의 문학성.
조문(弔文)이나 제문(祭文)은 죽은 이를 위로하고 추억한다는 점은 같지만 조문에 비해 제문이 일반적으로 더 격식을 갖춘 글이고 널리 쓰인다. 뿐만 아니라 조(弔)라는 말을 쓰는 경우를 설명한 글을 보면 “간혹 교만하고 귀한 체하다가 몸을 죽음으로 몰고간 자가 있고, 혹은 편협하고 화를 잘 내다가 도리를 무너뜨린 자가 있고, 혹은 뜻은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한 자도 있고, 혹은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도 얽매여 펴지 못한 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후인들이 추억하며 위로하는 것을 아울러 조(弔)라고 명명한다” 이유원,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국역 임하필기1』, 민족문화추진회, 2000.
라고 하여 대상 인물의 생애가 순탄치 못했을 경우에 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제문은 친척이나 벗에게 제전(祭奠)을 드릴 때 사용하는 글이라 하여 대상 인물을 일반적으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추억하는 대상 인물의 생애적 특징이 ‘조문’과 ‘제문’의 명칭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이유원(李裕元:1814-1888)이 『문체명변』의「제문(祭文)」조항을 요약해 놓은 글 이유원, 「경전화시편(瓊田花市編)」,『국역 임하필기1』, 민족문화추진회, 2000, 165면.
을 보면 그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특별히 제문이라 하여 글을 짓지 않고 “단지 고향(告饗)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었는데, 중세(中世) 이후로 언행(言行)까지 겸하여 찬양하고 애상하는 뜻”을 부쳤다고 하여 “대체로 축문(祝文)의 변체(變體)”로 제문이 생겨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형식은 산문도 있고 운문도 있고 변려문도 있으며, 운문 중에도 산문, 사언(四言), 육언(六言), 잡언(雜言), 초사체(楚辭體), 변려체(騈儷體) 등으로 다양하지만, 그 내용은 유협이 “제전(祭奠)은 본디 공순하고 애절해야 한다\"고 말한 바와 같이 공순함과 애절함이 중요하다고 한다. 제문의 문사(文辭)가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거나 정서가 맺혀서 펴지지 않는 경우는 모두 공력을 들이지 않은 글이라고 지적하였다.
제문은 실생활의 필요에 의한 글이긴 하지만, 글을 쓴 사람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는데다가 ‘제망실문’의 경우는 생활의 예절을 갖추는 이유도 희박하고 어디까지나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에 의해 쓰여지기 때문에 그 글의 감동이 깊게 전해진다. 특히 18세기 무렵으로 오면 정(情)을 중시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문체의 변화도 일어나 제문(祭文)의 경우도 글이 길어지고 정감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구체적으로 형상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느낄 수 있다. 문예적 형상성이 강화된 것이다. ‘노긍(盧兢:1737-1790)’이 그 문체를 파격적으로 구사하여 자신의 깊은 정감을 그대로 드러내기 좋도록 제문을 썼다 안대회, .......
고 학계에 보고된 바 있고, ‘심노숭(沈魯崇:1762-1837)’ 김영진, 「孝田 沈魯崇 文學 一攷 -悼亡文을 중심으로-」(한국한문학회, 199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요지문)
이 아내에 대해 쓴 제문도, 망자(亡者)의 재(才)덕(德)에 대한 상투적 칭찬이 없고 ‘오호’ ‘애재’ 같은 단어로 슬픔의 진술을 반복하지도 않으며 마주 앉아 대화하듯 문답체를 구사하며 지난날을 추억하기도 하고 자신의 현재 일상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는 방식의 문체를 구사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편의 소설이 소설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문학적 수준과 완성도가 저절로 높아지지 않듯이, 한 편의 제문이 제문의 형식을 갖추었거나 파격을 보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학적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것은 제문한편 한편의 문학적 수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운자를 넣어서 짓고, 문체의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그 감정의 진실함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추천자료
 20세기 한국미술-부산지역조각을 통해서본 환경과미술
20세기 한국미술-부산지역조각을 통해서본 환경과미술 21세기 생활과학의 두 가능성에 관한 시론
21세기 생활과학의 두 가능성에 관한 시론 19세기 말의 서양 미술
19세기 말의 서양 미술 19세기 연극의 이해
19세기 연극의 이해 19세기의 교육 (대표했던 사상, 교육사상가)
19세기의 교육 (대표했던 사상, 교육사상가) 15세기 국어의 시간 표현
15세기 국어의 시간 표현 19세기 영국미국시, 19세기 영미시
19세기 영국미국시, 19세기 영미시 19세기 오페라
19세기 오페라 [21C 교사][교사][선생님][교사상][스승]21세기 교사의 역할, 21세기 교사의 개혁의식, 21세...
[21C 교사][교사][선생님][교사상][스승]21세기 교사의 역할, 21세기 교사의 개혁의식, 21세... [물리화학실험] 이온세기효과 - Dehye-Huckel 이론으로 이온세기와 전화관련 식을 볼 수 있다...
[물리화학실험] 이온세기효과 - Dehye-Huckel 이론으로 이온세기와 전화관련 식을 볼 수 있다... 10세기 20세기 세계경제, 전간기 개관, 1차대전 직후의 세계경제, 세계대공황, 전후 회복, 경...
10세기 20세기 세계경제, 전간기 개관, 1차대전 직후의 세계경제, 세계대공황, 전후 회복, 경... 21세기 가치관과 윤리 교사의 역할
21세기 가치관과 윤리 교사의 역할  [20세기 디자인사 - 미술공예 운동] 20세기디자인사에 관해 - 아르누보양식에서 부터 기계미...
[20세기 디자인사 - 미술공예 운동] 20세기디자인사에 관해 - 아르누보양식에서 부터 기계미... [보육학개론] 외국의 보육역사 - 프랑스(17세기부터 20세기 후반의 보육), 영국(보육시설, 부...
[보육학개론] 외국의 보육역사 - 프랑스(17세기부터 20세기 후반의 보육), 영국(보육시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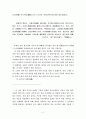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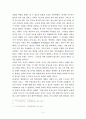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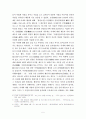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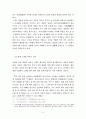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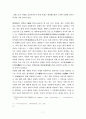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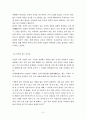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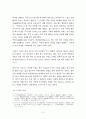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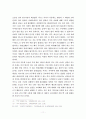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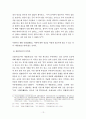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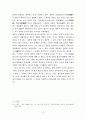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