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부터 멀어진 인간의 오만함은 일방적인 요구만을 자연에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파괴만은 일삼고 있으며,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옛날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도교를 근본으로 한 민간신앙사상을 바탕으로 산신을 숭배하고 그 자체의 기준에 행동양식을 맞춤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의 안정을 바라고 발전을 바래왔다고 한다. 이것은 엄연히 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당시 우리가 가졌던 제의식같은 행동양식들도 엄연히 신화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화는 시간을 초월하고 전 시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또한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동양의 전설이나 민담 역시 서양의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서로 다르게만 보였던 것들의 근본적인 면에서의 동일함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확장되어 서로 다른 종의 동일함을 구현하는 사고의 총체 또한 자리 잡게 해줄 수 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우월함을 버리고, 자연속의 나로서 살아감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옛날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도교를 근본으로 한 민간신앙사상을 바탕으로 산신을 숭배하고 그 자체의 기준에 행동양식을 맞춤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의 안정을 바라고 발전을 바래왔다고 한다. 이것은 엄연히 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당시 우리가 가졌던 제의식같은 행동양식들도 엄연히 신화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화는 시간을 초월하고 전 시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간을 또한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동양의 전설이나 민담 역시 서양의 신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서로 다르게만 보였던 것들의 근본적인 면에서의 동일함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확장되어 서로 다른 종의 동일함을 구현하는 사고의 총체 또한 자리 잡게 해줄 수 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우월함을 버리고, 자연속의 나로서 살아감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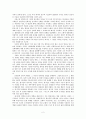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