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어진의 개념 및 분류
2.조선시대 어진의 제작 목적
3.어진의 제작과정
4.조선의 진전제도
5.어진의 양식적 특징
6.현존하는 어진
태조어진
영조어진
연잉군 초상
철종어진
고종어진
순종어진
1.어진의 개념 및 분류
2.조선시대 어진의 제작 목적
3.어진의 제작과정
4.조선의 진전제도
5.어진의 양식적 특징
6.현존하는 어진
태조어진
영조어진
연잉군 초상
철종어진
고종어진
순종어진
본문내용
식으로 그렸다. 얼굴의 전체적 형상은 배채로 그리고 이목구비는 부드러운 선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영조어진
조선시대 임금인 영조(재위 1724∼1776)의 초상화이다. 이 그림은 51세 때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로 68㎝, 세로 110㎝ 크기의 비단에 채색하여 그렸다. 영조의 어진은 붉은색 곤룡포의 좌안 반신상이다. 이본은 광무4년(1900) 선원전 실화로 어진이 소실되어 버리자 육상궁 내천정에 봉안되었던 영조 20년(1744) 어진 도사본을 이모한 것이다. 이때 조석진과 채용신을 비롯한 화사가 동원되었으며 선원전에 봉안하였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머리에는 임금이 쓰는 익선관을 쓰고, 양어깨와 가슴에는 용을 수놓은 붉은색의 곤룡포를 입고 있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있고 두 눈은 치켜 올라갔으며 높은 콧등과 코 가장자리, 입의 양끝은 조각처럼 직선적으로 표현되었다. 가슴에 있는 각대 역시 위로 올라가 있고, 옷의 외곽선을 따로 긋지 않았다. 비록 원본은 한국전쟁으로 불타 없어졌으나 원본을 충실하게 그린 것으로 현존하는 왕의 영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연잉군 초상
이 본은 숙종40년 (1714)영조 21세때 화원 진재해가 그린것이다. 연잉군 초상화는 영조 21년에 경회궁 태령전에 봉안했는데 태령전은 자정전서쪽에 위치했으며 원래는 당으로 부르다가 어진을 봉안함으로써 전으로 승격되었다. 정조가 즉위하자 경현당에 두었다가 정조 2년 선원전에 이봉했다. 연인군 초상은 오른쪽 3분의1정도가 소실되었지만 얼굴은 온전하고 복식은 절반 이상이 온전하다.이는 이모본이 아닌 원본으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연잉군초상>은 화면의 좌측 상단에 “\'초봉연잉군고호양성헌”이라 적혀있어 이 본이 영조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제작된 연잉군 시절 도사본임을 알 수 있다. 사모, 백택과 흉배를 부착한 녹포단령, 서대, 검은색 녹피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장관복차림에 공수자세로 앉아 있는 좌안8분면의 전신교의좌상이다. 결손된 상태이나 얼굴, 흉배, 관대, 족좌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어 18세기 초 정장 관복 형식 초상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철종어진
철종 어진은 철종12년(1861)에 도사한 것으로 구군복을 입고 있으며 왼쪽의 3분의 1정도가 소실되었다. 다행히 용안의 형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코와 입 부분은 타서 소실된 상태이다. 왼쪽 상단에 “予三十一歲 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이라고 적혀 있어 이 어진이 철종 12년(1861)에 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서 펴낸 “어진도사사실” 에 의하면, 이한철과 조중묵이 주관화사를 맡았고, 김하종, 이형록, 박기준, 백영배, 백은배, 유숙 등이 보조하였다고 한다. 당시 약 1개월 동안 강사포본과 군복본을 모사하였는데, 오늘날 군복본만 남아 있다. 이 <철종어진>은 임금이 구군복으로 입고 있는 초상화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리고 군복의 화려한 채색, 세련된 선염, 무늬의 정세한 표현 등에서 이한철과 조중묵 등 어진 도사에 참여한 화원 화가들의 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고종어진
고종은 대한 제국 황제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초상을 볼 수 있다. 고종은 사진도 여러 차례 제작했고 책을 출판되기도 하였다. 고종의 어진은 전통적 방법으로 어용화사에 의해 그려지기도 했고 유화로 서양화가에 의해 그려지기도 했다. 고종은 역대 왕 중 가장 다양하게 어진을 제작했다.
첫번째
어진은 통천관으로 구성된 황제의 조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강사포는 붉은색 옷으로 어깨에 화려한 문양은 없지만 풍성하고 붉은색 자체의 화려함과 통천관의 화려한 구슬 장식에서 임금의 위엄을 느낄 수 있다. 고종 어진은 조선초기 태조 어진과 같이 정면상을 취하며 좌상이다. 그리고 손은 공수 자세로 일반적인 어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어진은 서양화가 휴버트 보스가 유화로 그린 어진으로 정면상이며 입상이다. 1899년 서울에 와서 2개월간 체류하면서 고종의 어진을 그렸다. 입상 초상화는 47세 제왕의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 또한 좌상으로 그려진 전통 어진과는 달리 입상 작품이고 의자가 없으며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소품도 없다. 그리고 서있는 모습의 황룡포는 차분히 가라 앉아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세 번째
1901년 채용신이 제작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고종 어진으로 정면좌상이다. 의관은 익선관에 황룡포를 입은 차림이다.익선관은 모양을 세필로 정밀하게 그리고 음영을 넣었기에 단색의 검은색이지만 형태가 잘나타난다. 용안은 인자한 모습으로 덕을 갖춘 임금의 모습을 보여준다. 눈썹은 앞부분을 진하게 그리고 꼬리 쪽은 옅게 그렷다. 눈은 육리문에 의거하여 그렸다. 고종이 입은 황룡포는 구름 문양이 평문양으로 밑에 깔려 있으며 그 위에 옷의 주름과 다른 문양을 그렸다. 옷깃은 붉은 색으로 목을 가볍게 덥고 있으며 양 어깨와 가슴에 오조룡 문양이 있다. 의자는 양쪽에 각각 두 마리의 용을 그려 왕의 위엄을 나타내었다. 배경으로 오봉병을 상세히 그렸다. 오봉병 양쪽으로는 해와 달은 양옆의 두 봉우리 사이의 해와 달을 각각 그렸다.
순종어진
순종 어진은 김은호가 그린 대원수군복 차림의 반신상으로 근대 작품이다. 1916년 완성을 보았으나 1917년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고 현재는 유지초본만 남았다. 대폭이 아닌 소폭 어진이며 화면이 꽉차 대상 인물이 화면 가깝게 보인다. 그래서 초상화라기 보다 근대 초상사진을 보는것 같다.
조선 현존 어진의 본석을 통해 초기 어진은 선묘를 중심으로 그렸으며 후기는 선염이 가미 되었고 말기에는 서양의 명암법과 사진술의 보급으로 사진과 같은 사실에 가까운 입체적 재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이태호,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생각의 나무,2008
조선미,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돌베개,2009
조선미,초상화 연구 - 초상화와 초상화론 , 문예출판사
안휘준,한국 회화의 이해,시공사,2000
논문
이미경 ,조선시대 어진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7
영조어진
조선시대 임금인 영조(재위 1724∼1776)의 초상화이다. 이 그림은 51세 때 모습을 그린 것으로, 가로 68㎝, 세로 110㎝ 크기의 비단에 채색하여 그렸다. 영조의 어진은 붉은색 곤룡포의 좌안 반신상이다. 이본은 광무4년(1900) 선원전 실화로 어진이 소실되어 버리자 육상궁 내천정에 봉안되었던 영조 20년(1744) 어진 도사본을 이모한 것이다. 이때 조석진과 채용신을 비롯한 화사가 동원되었으며 선원전에 봉안하였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머리에는 임금이 쓰는 익선관을 쓰고, 양어깨와 가슴에는 용을 수놓은 붉은색의 곤룡포를 입고 있다.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있고 두 눈은 치켜 올라갔으며 높은 콧등과 코 가장자리, 입의 양끝은 조각처럼 직선적으로 표현되었다. 가슴에 있는 각대 역시 위로 올라가 있고, 옷의 외곽선을 따로 긋지 않았다. 비록 원본은 한국전쟁으로 불타 없어졌으나 원본을 충실하게 그린 것으로 현존하는 왕의 영정 가운데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연잉군 초상
이 본은 숙종40년 (1714)영조 21세때 화원 진재해가 그린것이다. 연잉군 초상화는 영조 21년에 경회궁 태령전에 봉안했는데 태령전은 자정전서쪽에 위치했으며 원래는 당으로 부르다가 어진을 봉안함으로써 전으로 승격되었다. 정조가 즉위하자 경현당에 두었다가 정조 2년 선원전에 이봉했다. 연인군 초상은 오른쪽 3분의1정도가 소실되었지만 얼굴은 온전하고 복식은 절반 이상이 온전하다.이는 이모본이 아닌 원본으로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연잉군초상>은 화면의 좌측 상단에 “\'초봉연잉군고호양성헌”이라 적혀있어 이 본이 영조가 임금이 되기 이전에 제작된 연잉군 시절 도사본임을 알 수 있다. 사모, 백택과 흉배를 부착한 녹포단령, 서대, 검은색 녹피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장관복차림에 공수자세로 앉아 있는 좌안8분면의 전신교의좌상이다. 결손된 상태이나 얼굴, 흉배, 관대, 족좌 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어 18세기 초 정장 관복 형식 초상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철종어진
철종 어진은 철종12년(1861)에 도사한 것으로 구군복을 입고 있으며 왼쪽의 3분의 1정도가 소실되었다. 다행히 용안의 형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코와 입 부분은 타서 소실된 상태이다. 왼쪽 상단에 “予三十一歲 哲宗熙倫正極粹德純聖文顯武成獻仁英孝大王”이라고 적혀 있어 이 어진이 철종 12년(1861)에 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서 펴낸 “어진도사사실” 에 의하면, 이한철과 조중묵이 주관화사를 맡았고, 김하종, 이형록, 박기준, 백영배, 백은배, 유숙 등이 보조하였다고 한다. 당시 약 1개월 동안 강사포본과 군복본을 모사하였는데, 오늘날 군복본만 남아 있다. 이 <철종어진>은 임금이 구군복으로 입고 있는 초상화로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리고 군복의 화려한 채색, 세련된 선염, 무늬의 정세한 표현 등에서 이한철과 조중묵 등 어진 도사에 참여한 화원 화가들의 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고종어진
고종은 대한 제국 황제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초상을 볼 수 있다. 고종은 사진도 여러 차례 제작했고 책을 출판되기도 하였다. 고종의 어진은 전통적 방법으로 어용화사에 의해 그려지기도 했고 유화로 서양화가에 의해 그려지기도 했다. 고종은 역대 왕 중 가장 다양하게 어진을 제작했다.
첫번째
어진은 통천관으로 구성된 황제의 조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강사포는 붉은색 옷으로 어깨에 화려한 문양은 없지만 풍성하고 붉은색 자체의 화려함과 통천관의 화려한 구슬 장식에서 임금의 위엄을 느낄 수 있다. 고종 어진은 조선초기 태조 어진과 같이 정면상을 취하며 좌상이다. 그리고 손은 공수 자세로 일반적인 어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
두 번째 어진은 서양화가 휴버트 보스가 유화로 그린 어진으로 정면상이며 입상이다. 1899년 서울에 와서 2개월간 체류하면서 고종의 어진을 그렸다. 입상 초상화는 47세 제왕의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준다. 또한 좌상으로 그려진 전통 어진과는 달리 입상 작품이고 의자가 없으며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소품도 없다. 그리고 서있는 모습의 황룡포는 차분히 가라 앉아 풍성하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 보인다.
세 번째
1901년 채용신이 제작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고종 어진으로 정면좌상이다. 의관은 익선관에 황룡포를 입은 차림이다.익선관은 모양을 세필로 정밀하게 그리고 음영을 넣었기에 단색의 검은색이지만 형태가 잘나타난다. 용안은 인자한 모습으로 덕을 갖춘 임금의 모습을 보여준다. 눈썹은 앞부분을 진하게 그리고 꼬리 쪽은 옅게 그렷다. 눈은 육리문에 의거하여 그렸다. 고종이 입은 황룡포는 구름 문양이 평문양으로 밑에 깔려 있으며 그 위에 옷의 주름과 다른 문양을 그렸다. 옷깃은 붉은 색으로 목을 가볍게 덥고 있으며 양 어깨와 가슴에 오조룡 문양이 있다. 의자는 양쪽에 각각 두 마리의 용을 그려 왕의 위엄을 나타내었다. 배경으로 오봉병을 상세히 그렸다. 오봉병 양쪽으로는 해와 달은 양옆의 두 봉우리 사이의 해와 달을 각각 그렸다.
순종어진
순종 어진은 김은호가 그린 대원수군복 차림의 반신상으로 근대 작품이다. 1916년 완성을 보았으나 1917년 화재로 소실되어 버렸고 현재는 유지초본만 남았다. 대폭이 아닌 소폭 어진이며 화면이 꽉차 대상 인물이 화면 가깝게 보인다. 그래서 초상화라기 보다 근대 초상사진을 보는것 같다.
조선 현존 어진의 본석을 통해 초기 어진은 선묘를 중심으로 그렸으며 후기는 선염이 가미 되었고 말기에는 서양의 명암법과 사진술의 보급으로 사진과 같은 사실에 가까운 입체적 재현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태호,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학고재, 1996
이태호,옛 화가들은 우리 얼굴을 어떻게 그렸나,생각의 나무,2008
조선미,한국의 초상화 -형과 영의 예술,돌베개,2009
조선미,초상화 연구 - 초상화와 초상화론 , 문예출판사
안휘준,한국 회화의 이해,시공사,2000
논문
이미경 ,조선시대 어진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2007
추천자료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직지심체요절.승정원일기)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유산(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직지심체요절.승정원일기)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수용의 조선왕조 통치체제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수용의 조선왕조 통치체제 개성지역의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화재와 차이점
개성지역의 고려시대, 조선시대 문화재와 차이점 [한국문화유산] 조선 왕조의 상징, 『종묘』에 대하여
[한국문화유산] 조선 왕조의 상징, 『종묘』에 대하여 [독서감상문] 기시모토 미오 &#8228; 미야지마 히로시의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
[독서감상문] 기시모토 미오 &#8228; 미야지마 히로시의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 [역사학] 조선시대의 통신과 교통수단, 교통이용의 변화과정
[역사학] 조선시대의 통신과 교통수단, 교통이용의 변화과정 조선시대 농경중심의 과학기술 및 동서양의 수차의 발달 응용조사와 세종의 수차장려 조사분석
조선시대 농경중심의 과학기술 및 동서양의 수차의 발달 응용조사와 세종의 수차장려 조사분석 4편 근세 관료국가 요약 - 조선 간단 요약
4편 근세 관료국가 요약 - 조선 간단 요약 [답사문] 조선의 궁궐 창덕궁
[답사문] 조선의 궁궐 창덕궁 신개념 한국사 정리노트(조선시대~근현대): 공무원-한국사능력검정 대비
신개념 한국사 정리노트(조선시대~근현대): 공무원-한국사능력검정 대비 [A+ 독후감]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A+ 독후감]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국사과 수업지도안 - 본시 수업의 전개 계획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왜란과 호란의 극복
국사과 수업지도안 - 본시 수업의 전개 계획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왜란과 호란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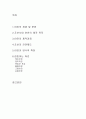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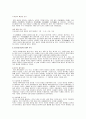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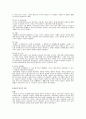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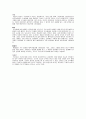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