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머리말
Ⅱ. 왕비의 간택과 왕비수업
1. 왕비 간택의 절차
2. 왕비수업
Ⅲ. 육례(六禮)의 절차와『가례도감의궤』
1. 가례도감의 설치와『가례도감의궤』
2. 육례의 절차
Ⅳ. 왕의 혼례 행렬
1. 행렬의 구성
2. 국혼의 복식과 주요 물품
Ⅴ. 맺음말
Ⅰ. 머리말
Ⅱ. 왕비의 간택과 왕비수업
1. 왕비 간택의 절차
2. 왕비수업
Ⅲ. 육례(六禮)의 절차와『가례도감의궤』
1. 가례도감의 설치와『가례도감의궤』
2. 육례의 절차
Ⅳ. 왕의 혼례 행렬
1. 행렬의 구성
2. 국혼의 복식과 주요 물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래로 조선시대에도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 착용되었다.
, 평천관(平天冠), 적말(赤襪), 적석(赤), 강사포(降紗袍), 원유관(遠遊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예복들은 가례의 육례 때마다 착용하는 옷이 달랐다.
면복은 국왕이 조회를 보거나 종묘사직 등에 제사를 지낼 때 입던 옷으로 국왕은 납채, 고기, 친영, 동뢰의 의식 때 면복을 입었다. 면복은 크게 평천관(면류관)과 곤복(袞服)으로 나뉘게 된다. 면류관은 면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관으로써 면판에 앞뒤에는 구슬이 달려 있는데 중국 황제가 12류를 단 데 비하여 조선의 왕은 9류를 달았다. 곤복 역시 중국의 천자가 12장복인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9장복을 사용했다. 하지만 후에 고종 대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황제를 칭하면서 왕실에서도 12장복을 착용하게 된다.
면복과 함께 혼인 예복으로 사용된 의복은 조복(朝服)으로 강사포와 원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복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조복 역시 공민왕 때부터 정착되었다. 국왕은 혼인 예복으로 납징, 책비 의식 때 조복을 입었다. 왕이 동뢰연을 마치면서 모든 혼례 일정이 끝나면 평상복에 해당하는 곤룡포와 익선관으로 갈아입었다.
⑵ 왕비의 혼례복
왕비의 혼례복 중 가장 화려한 것은 적의(翟衣)로 가례의 절차 중에서 책비, 친영, 동뢰를 행할 때 입던 예복이다. 적의는 조선시대 최고의 신분의 여성을 상징하는 복식으로 꿩무늬를 수놓은 포를 말한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 왕비의 법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 때 처음 중국에서 적의를 받아들였다. 인조 때 우리식으로 붉은색으로 옷을 바꾸어 적의를 입었지만 고종 때 왕이 황제로 격상되며 다시 황제비가 입던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예법대로라면 모자인 화관도 써야 했지만 조선의 왕비들은 화관 대신 머리장식을 하였다. 머리장식은 가체(加)라는 덧머리와 비녀가 주를 이루었다. 가체는 신분에 따라 크기와 장식하는 보석이 달랐는데, 왕비의 가체에는 금장식을 하였고 뒷부분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여덟 줄의 끈을 드리웠다. 또 옥, 비취, 진주 등으로 만든 비녀를 이용해 가체를 고정시켰다.
적의가 왕비의 대례복이라면 소례복은 원삼(圓衫)이었다. 원삼은 소매가 길고 넓으며 소매 끝단에는 넓은 한삼이 봉재되어 있었다. 평상복으로는 당의(唐衣)를 입었다.
2) 가례 주요 물품
가례도감에서 준비해야 할 각종 물품들은 혼인 의식인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에 따라 각기 구분하고 기록하고 있다. 가례의 육례에 준비한 물품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의식
소용 물품
납채
교문지 1장, 흑칠중함 1부, 당주홍칠 안상(홍색칠을 한 안상) 1좌, 산 기러기 1마리, 답전문지, 흑칠함 1부
납징
교문지 1장, 흑칠중함 1부, 당주홍칠 안상 1좌, 현색모단(玄色冒緞:검은색 비단) 6필, 훈색광직(色廣織:분홍색 베), 왜주홍칠 속백함(倭朱紅漆 束帛函) 1좌, 승마 4필, 답전문지 1장, 흑칠함 1부
고기
교문지 1장, 당주홍칠 중함 1부, 당주홍칠 안상 1좌, 답전문지 1장, 흑칠함 1부
책비
교명 1부, 왜주홍칠궤 1부, 왜주홍칠 배안상 1좌, 자적토주 요 1건, 왜주홍칠 명복함 1부, 당주홍칠 안상 1좌
친영
산 기러기 1마리, 왜주홍칠 전안상 1좌, 좌적토주 요 1건, 홍주 요 1건, 화룡촉 1쌍, 말 1필, 전안배위 만화단석 1건
동뢰
자적토주 요 1건, 홍주 요 1건, 화룡촉 2쌍, 당주홍칠 촉함 1부, 홍사촉 5쌍, 홍육촉 40자루, 홍팔촉 40자루, 당주홍칠 가함 1척, 요여 2부, 채여 2부
<표 4> 육례에 준비한 물품
또한 혼례식에 사용되는 물품들은 용도에 따라 빙재(聘財:혼례 때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물품), 별궁예물(別宮禮物), 정친 혼인을 정하는 것.
예물(定親禮物), 납징예물(納徵禮物), 본방 임금의 장인(丈人)댁.
예물(本房禮物), 대전법복(大殿法服), 의대(衣), 수라간소용(水剌間所用), 연여 임금이 타는 연(輦)과 임금의 왕비가 타는 여(轝)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의장(輦輿儀仗)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다.
위 모든 물품들은 일방, 이방, 삼방으로 나뉘어 각방에서 준비하였다. 의궤 안에는 다수 장인들의 실명이 모두 나타난다. 굳이 장인들의 실명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해준 조치로 보인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을 중심으로 왕실의 혼례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왕실의 혼례는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이 경축해야 할 행사로서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의례였다. 또한 한 나라의 국모를 받아들이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조선의 조정은 왕실의 혼례 과정에 생기는 모든 것을 의궤에 세세하게 기록하며 어느 기록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기록의 우수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어 현재까지 남겨지게 되었다.
왕실의 혼례, 특히 왕과 왕비의 혼례는 일국의 국모인 왕비를 받아들이는 의식인 만큼 왕에 비해 베일에 가렸었던 왕비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 왕비는 남녀유별로 대표되는 유교윤리에 따라서 그 역할이 철저하게 제한되었지만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또한 왕비에서 물러난 후라도 왕실의 큰 어른인 대비, 왕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정국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이면에는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험한 과정이 있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閑中錄)에 나와 있듯이 조선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한중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국역 국혼정례』국학자료원
국립민속박물관, 1995『한국복식 이천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2009『조선 국왕의 일생』글항아리
김문식 · 신병주, 2005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돌베개
신명호, 2002『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돌베개
신병주, 2001『66세의 영조 15세의 신부를 맞이하다』효형출판
, 평천관(平天冠), 적말(赤襪), 적석(赤), 강사포(降紗袍), 원유관(遠遊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예복들은 가례의 육례 때마다 착용하는 옷이 달랐다.
면복은 국왕이 조회를 보거나 종묘사직 등에 제사를 지낼 때 입던 옷으로 국왕은 납채, 고기, 친영, 동뢰의 의식 때 면복을 입었다. 면복은 크게 평천관(면류관)과 곤복(袞服)으로 나뉘게 된다. 면류관은 면복을 입을 때 착용하는 관으로써 면판에 앞뒤에는 구슬이 달려 있는데 중국 황제가 12류를 단 데 비하여 조선의 왕은 9류를 달았다. 곤복 역시 중국의 천자가 12장복인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9장복을 사용했다. 하지만 후에 고종 대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황제를 칭하면서 왕실에서도 12장복을 착용하게 된다.
면복과 함께 혼인 예복으로 사용된 의복은 조복(朝服)으로 강사포와 원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복제에서 비롯되었으며, 조복 역시 공민왕 때부터 정착되었다. 국왕은 혼인 예복으로 납징, 책비 의식 때 조복을 입었다. 왕이 동뢰연을 마치면서 모든 혼례 일정이 끝나면 평상복에 해당하는 곤룡포와 익선관으로 갈아입었다.
⑵ 왕비의 혼례복
왕비의 혼례복 중 가장 화려한 것은 적의(翟衣)로 가례의 절차 중에서 책비, 친영, 동뢰를 행할 때 입던 예복이다. 적의는 조선시대 최고의 신분의 여성을 상징하는 복식으로 꿩무늬를 수놓은 포를 말한다. 고려 공민왕 때 처음 왕비의 법복으로 착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 때 처음 중국에서 적의를 받아들였다. 인조 때 우리식으로 붉은색으로 옷을 바꾸어 적의를 입었지만 고종 때 왕이 황제로 격상되며 다시 황제비가 입던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예법대로라면 모자인 화관도 써야 했지만 조선의 왕비들은 화관 대신 머리장식을 하였다. 머리장식은 가체(加)라는 덧머리와 비녀가 주를 이루었다. 가체는 신분에 따라 크기와 장식하는 보석이 달랐는데, 왕비의 가체에는 금장식을 하였고 뒷부분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여덟 줄의 끈을 드리웠다. 또 옥, 비취, 진주 등으로 만든 비녀를 이용해 가체를 고정시켰다.
적의가 왕비의 대례복이라면 소례복은 원삼(圓衫)이었다. 원삼은 소매가 길고 넓으며 소매 끝단에는 넓은 한삼이 봉재되어 있었다. 평상복으로는 당의(唐衣)를 입었다.
2) 가례 주요 물품
가례도감에서 준비해야 할 각종 물품들은 혼인 의식인 납채, 납징, 고기, 책비, 친영, 동뢰에 따라 각기 구분하고 기록하고 있다. 가례의 육례에 준비한 물품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의식
소용 물품
납채
교문지 1장, 흑칠중함 1부, 당주홍칠 안상(홍색칠을 한 안상) 1좌, 산 기러기 1마리, 답전문지, 흑칠함 1부
납징
교문지 1장, 흑칠중함 1부, 당주홍칠 안상 1좌, 현색모단(玄色冒緞:검은색 비단) 6필, 훈색광직(色廣織:분홍색 베), 왜주홍칠 속백함(倭朱紅漆 束帛函) 1좌, 승마 4필, 답전문지 1장, 흑칠함 1부
고기
교문지 1장, 당주홍칠 중함 1부, 당주홍칠 안상 1좌, 답전문지 1장, 흑칠함 1부
책비
교명 1부, 왜주홍칠궤 1부, 왜주홍칠 배안상 1좌, 자적토주 요 1건, 왜주홍칠 명복함 1부, 당주홍칠 안상 1좌
친영
산 기러기 1마리, 왜주홍칠 전안상 1좌, 좌적토주 요 1건, 홍주 요 1건, 화룡촉 1쌍, 말 1필, 전안배위 만화단석 1건
동뢰
자적토주 요 1건, 홍주 요 1건, 화룡촉 2쌍, 당주홍칠 촉함 1부, 홍사촉 5쌍, 홍육촉 40자루, 홍팔촉 40자루, 당주홍칠 가함 1척, 요여 2부, 채여 2부
<표 4> 육례에 준비한 물품
또한 혼례식에 사용되는 물품들은 용도에 따라 빙재(聘財:혼례 때 신랑이 신부에게 보내는 물품), 별궁예물(別宮禮物), 정친 혼인을 정하는 것.
예물(定親禮物), 납징예물(納徵禮物), 본방 임금의 장인(丈人)댁.
예물(本房禮物), 대전법복(大殿法服), 의대(衣), 수라간소용(水剌間所用), 연여 임금이 타는 연(輦)과 임금의 왕비가 타는 여(轝)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의장(輦輿儀仗) 등 세부 항목으로 구분된다.
위 모든 물품들은 일방, 이방, 삼방으로 나뉘어 각방에서 준비하였다. 의궤 안에는 다수 장인들의 실명이 모두 나타난다. 굳이 장인들의 실명을 낱낱이 기록한 것은 그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해준 조치로 보인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영조정순후 가례도감의궤』을 중심으로 왕실의 혼례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왕실의 혼례는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이 경축해야 할 행사로서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의례였다. 또한 한 나라의 국모를 받아들이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조선의 조정은 왕실의 혼례 과정에 생기는 모든 것을 의궤에 세세하게 기록하며 어느 기록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 기록의 우수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어 현재까지 남겨지게 되었다.
왕실의 혼례, 특히 왕과 왕비의 혼례는 일국의 국모인 왕비를 받아들이는 의식인 만큼 왕에 비해 베일에 가렸었던 왕비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 왕비는 남녀유별로 대표되는 유교윤리에 따라서 그 역할이 철저하게 제한되었지만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 또한 왕비에서 물러난 후라도 왕실의 큰 어른인 대비, 왕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정국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이면에는 고통과 인내가 따르는 험한 과정이 있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閑中錄)에 나와 있듯이 조선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한중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국역 국혼정례』국학자료원
국립민속박물관, 1995『한국복식 이천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2009『조선 국왕의 일생』글항아리
김문식 · 신병주, 2005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돌베개
신명호, 2002『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돌베개
신병주, 2001『66세의 영조 15세의 신부를 맞이하다』효형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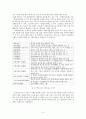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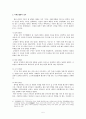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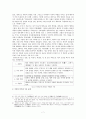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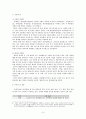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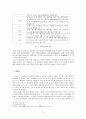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