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및 사료 강독
2. 진표의 생애
1) 진표 연보
2) 진표의 출생과 행적
3. 《점찰경》과 미륵신앙
1) 《점찰경》
2) 진표의 수행
3) 점찰법회와 교법 활동
4. 신라 사회와 진표의 미륵신앙
1) 신라 민중
2) 신라 왕실
3) 지방 세력
5. 결론
2. 진표의 생애
1) 진표 연보
2) 진표의 출생과 행적
3. 《점찰경》과 미륵신앙
1) 《점찰경》
2) 진표의 수행
3) 점찰법회와 교법 활동
4. 신라 사회와 진표의 미륵신앙
1) 신라 민중
2) 신라 왕실
3) 지방 세력
5. 결론
본문내용
적인 농민 봉기의 사회적 배경을 탐구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2) 신라 왕실
진표와 신라 왕실 간의 관계를 가장 대표하는 행보는 아마 경덕왕에게 보살수계를 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진표와 신라 왕실과의 관계는 <전간>에만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는 경덕왕이 진표를 궁궐로 받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왕족들 역시 귀의하여 많은 보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진표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서 행해지던 점찰법회에서는 ‘戒法(계법)’ 강조했는데, 이는 진표의 사상이 신라 불교 전통과 이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신라 성덕왕 대 당 현종의 밀교 후원은 지속되었고, 결국 관료들까지도 이를 따르게 되었다.
왕실과 진표의 관계는 왕권과 미륵신앙의 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한 적대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표가 왕의 보살계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네 가지 종류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유난히 고승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경덕왕은 진표를 불러들여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당시 신라 승려들은 종교 활동보다 정치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전력하고 있었고, 이들의 출신 성분이 귀족들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왕권을 수호하려는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진표를 통해 승려 및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을 것이다.
명주 지역에서의 진표의 명성에 힘입어 왕의 지방통치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진표는 이미 지방에서 이름을 떨친 승려였고, 그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러한 영향력을 지방 통제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경덕왕이 진표의 매혹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당의 경우 황제의 보살계사에게는 주술적 영험력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신라의 왕족·귀족들은 당 문화의 영향으로 영험력 있는 보살계사를 요했을 것이고, 그 적임자로 진표를 세우는 데에 동의했을 것이다.
신라 불교계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의림, 불가사의 등 밀교 승려들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법상계, 화엄계와 더불어 밀교계의 성장이 같은 밀교계 승려인 진표의 금성 입성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3) 지방 세력
지방 세력의 성장 역시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진표의 활동 영역이 경주에서 벗어난 전북, 충북, 강원 등의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의 결집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신라 말 가장 큰 지방 세력이었던 견훤과 궁예는 모두 미륵신앙을 이념적 기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견훤과 궁예는 둘 다 자신의 치세가 미륵불이 하생한 용화세계, 즉 반신라적 이상국가임을 내세워 세력과 백성들을 모았다. 궁예는 미륵을 자칭하였으나, 궁예의 미륵신앙이 어떤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 다만, 명주에서 궁예를 뒷받침한 ‘허월’이라는 승려가 금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진표의 제자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진표의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견훤이 내세운 전륜상왕의 치세와 용화세계의 출현은 진표의 미륵신앙에 기반한 내용으로, 미륵정토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견훤과 금산사, 그리고 진표의 연관성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금산사는 진표가 출가 후 중창한 사찰이며, 따라서 그 일대는 진표의 사상적 영향권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견훤 역시 그 영향권에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말년에는 유폐지로 지정되기까지 했으니 견훤과 진표가 전혀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로는, 서로 배타적인 세 정치 집단 - 중앙 왕실과 귀족 세력, 지방 세력, 일반 민중 - 이 모두 진표의 미륵신앙을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진표의 행보를 정치적 맥락에서만 해석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진표와 미륵신앙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지나친 정치사적 의미 부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층농민들로 하여금 반신라적 성격을 띠게 했다는 진표의 미륵신앙이 왕권 강화에도 이용되었다는 것은 언뜻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륵신앙의 내용 자체가 하층민들을 위한 사회 전복이나, 왕권과 체제를 옹호하는 전제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진표의 미륵신앙이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신라 왕실 유지에 기여했던 진표의 미륵신앙이 지방 후삼국 세력들의 반신라적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역설적이다. 다만, 진표의 미륵신앙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전제 왕권의 유지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군주를 자처하는 이들이 아전인수로 정치적인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진표의 미륵신앙은 탈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 일변도의 고대사연구가 사회적·문화적 현상에까지 권력관계나 이해관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종용하는 측면이 있어 비록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권력 집단으로서의 인간군이 아닌 당시대의 구성원들에게 진표의 미륵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연,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 수용」, 『韓國思想史學』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박미선,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韓國古代史硏究』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윤여성, 「新羅 眞表의 佛敎信仰과 金山寺」, 『전북사학』 11, 전북사학회, 1989
이기백,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1986
정미숙, 「眞表의 彌勒信仰과 理想社會論」, 『지역과 역사』 7, 부경역사연구소, 2000
조인성,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 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人文硏究論集』 2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2) 신라 왕실
진표와 신라 왕실 간의 관계를 가장 대표하는 행보는 아마 경덕왕에게 보살수계를 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진표와 신라 왕실과의 관계는 <전간>에만 등장하는데, 그 내용에는 경덕왕이 진표를 궁궐로 받아들여 보살계를 받고, 왕족들 역시 귀의하여 많은 보시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진표 이전부터 신라 사회에서 행해지던 점찰법회에서는 ‘戒法(계법)’ 강조했는데, 이는 진표의 사상이 신라 불교 전통과 이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신라 성덕왕 대 당 현종의 밀교 후원은 지속되었고, 결국 관료들까지도 이를 따르게 되었다.
왕실과 진표의 관계는 왕권과 미륵신앙의 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기본적으로 완벽한 적대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표가 왕의 보살계사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네 가지 종류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유난히 고승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경덕왕은 진표를 불러들여 왕권을 확고히 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당시 신라 승려들은 종교 활동보다 정치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전력하고 있었고, 이들의 출신 성분이 귀족들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왕권을 수호하려는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진표를 통해 승려 및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을 것이다.
명주 지역에서의 진표의 명성에 힘입어 왕의 지방통치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진표는 이미 지방에서 이름을 떨친 승려였고, 그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이러한 영향력을 지방 통제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경덕왕이 진표의 매혹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당의 경우 황제의 보살계사에게는 주술적 영험력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신라의 왕족·귀족들은 당 문화의 영향으로 영험력 있는 보살계사를 요했을 것이고, 그 적임자로 진표를 세우는 데에 동의했을 것이다.
신라 불교계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의림, 불가사의 등 밀교 승려들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법상계, 화엄계와 더불어 밀교계의 성장이 같은 밀교계 승려인 진표의 금성 입성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3) 지방 세력
지방 세력의 성장 역시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다. 진표의 활동 영역이 경주에서 벗어난 전북, 충북, 강원 등의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방 세력의 결집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신라 말 가장 큰 지방 세력이었던 견훤과 궁예는 모두 미륵신앙을 이념적 기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견훤과 궁예는 둘 다 자신의 치세가 미륵불이 하생한 용화세계, 즉 반신라적 이상국가임을 내세워 세력과 백성들을 모았다. 궁예는 미륵을 자칭하였으나, 궁예의 미륵신앙이 어떤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기 힘들다. 다만, 명주에서 궁예를 뒷받침한 ‘허월’이라는 승려가 금강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진표의 제자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어 간접적으로나마 진표의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견훤이 내세운 전륜상왕의 치세와 용화세계의 출현은 진표의 미륵신앙에 기반한 내용으로, 미륵정토신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견훤과 금산사, 그리고 진표의 연관성에 대해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금산사는 진표가 출가 후 중창한 사찰이며, 따라서 그 일대는 진표의 사상적 영향권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견훤 역시 그 영향권에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말년에는 유폐지로 지정되기까지 했으니 견훤과 진표가 전혀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로는, 서로 배타적인 세 정치 집단 - 중앙 왕실과 귀족 세력, 지방 세력, 일반 민중 - 이 모두 진표의 미륵신앙을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진표의 행보를 정치적 맥락에서만 해석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진표와 미륵신앙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성도 갖고 있지 않으며, 지나친 정치사적 의미 부여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층농민들로 하여금 반신라적 성격을 띠게 했다는 진표의 미륵신앙이 왕권 강화에도 이용되었다는 것은 언뜻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륵신앙의 내용 자체가 하층민들을 위한 사회 전복이나, 왕권과 체제를 옹호하는 전제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진표의 미륵신앙이 어떤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신라 왕실 유지에 기여했던 진표의 미륵신앙이 지방 후삼국 세력들의 반신라적 이상사회를 지향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역설적이다. 다만, 진표의 미륵신앙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전제 왕권의 유지에 어느 정도 일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군주를 자처하는 이들이 아전인수로 정치적인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진표의 미륵신앙은 탈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사 일변도의 고대사연구가 사회적·문화적 현상에까지 권력관계나 이해관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종용하는 측면이 있어 비록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권력 집단으로서의 인간군이 아닌 당시대의 구성원들에게 진표의 미륵신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광연, 「眞表의 占察法會와 密敎 수용」, 『韓國思想史學』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박미선,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韓國古代史硏究』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윤여성, 「新羅 眞表의 佛敎信仰과 金山寺」, 『전북사학』 11, 전북사학회, 1989
이기백,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硏究』, 一潮閣, 1986
정미숙, 「眞表의 彌勒信仰과 理想社會論」, 『지역과 역사』 7, 부경역사연구소, 2000
조인성, 「彌勒信仰과 新羅社會 : 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人文硏究論集』 2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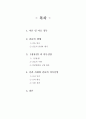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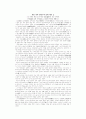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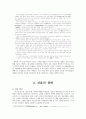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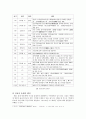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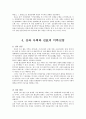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