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용산개발은 도심광역 개발인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요구와 자본의 요구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거대 도심 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용산4구역(용산국제빌딩주변 제4구역)개발이 어느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면서, 83%를 차기하던 지역의 세입자들이 대책없이 쫓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걸린 상가세입자들이, 생존권을 걸고 망루에 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뉴타운으로 표상되는 도심광역개발에 맞선 철거민들의 저항 운동의 특징은, 용산참사에서 보듯 이전과 달리 상가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이후 있었던 주요 철거민들의 투쟁인 홍대 두리반과 명동 마리 역시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특징으로, 상권개발이나 업무지구 개발이 늘어나면서 상가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의 철거민 투쟁으로,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점차 확대되고 제도화된 반면,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 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도심 광역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결국 참사를 부른 것이다.
이러한 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뉴타운으로 표상되는 도심광역개발에 맞선 철거민들의 저항 운동의 특징은, 용산참사에서 보듯 이전과 달리 상가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한 투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이후 있었던 주요 철거민들의 투쟁인 홍대 두리반과 명동 마리 역시 상가세입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특징으로, 상권개발이나 업무지구 개발이 늘어나면서 상가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문제가 폭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의 철거민 투쟁으로, 주거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점차 확대되고 제도화된 반면,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 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도심 광역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결국 참사를 부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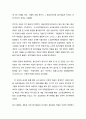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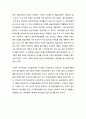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