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종의 다양성이 왜 필요할까’
- 어떻게 인종들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1.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
2. 문화적 선호 (Cultural Preference)
3. 소수의 고립된 인구집단들. 전체 인구 집단, 또는 여러 생물체들의 전체 집단은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집단 내에 가지고 있다
- 어떻게 인종들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1. 자연선택 (Natural Selection)
2. 문화적 선호 (Cultural Preference)
3. 소수의 고립된 인구집단들. 전체 인구 집단, 또는 여러 생물체들의 전체 집단은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집단 내에 가지고 있다
본문내용
라진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인종을 왜 구분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연구들인데,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만큼 유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생리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인들에게 피부암이 많은 것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적어서 자외선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 피부암의 발생율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싶이 백인들의 피부가 하얀 것은 햇빛이 약한 지역에 살았던 특성 상, 태양빛의 피부 투과를 지나치게 차단시키면 햇빛에 의해 합성이 촉진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져 뼈가 약해지고 뒤틀리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루병에 걸리게 되면 힘든 노동을 견뎌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구루병이 골반뼈까지 변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햇빛이 적은 지역에서는 피부색이 짙은 이들은 자손을 남길 수 없었으며 오랜 시간 이런 결과들이 반복된 결과, 햇빛이 적은 지역에는 피부가 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애초에 인종이 나타난 것은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슷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분명 유전적인 특징이 공유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유전적 특징들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약물의 대사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는 인종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더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에는 분명 인종을 구별하지만, 여기서도 그 목적은 단지 ‘구분’의 목적이다.
3. 이처럼 인종은 철저히 생물학적 특징과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종 개념을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인종을 둘러싼 모든 문제와 갈등은 바로 인종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생물학적으로 인종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생물학적 종을 구별할 만큼 크지 않아 다양한 혼인관계에 의해 이들은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고, 설사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멜라닌 색소의 차이, 코와 머리칼과 체모의 차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나 특정 약물의 대사 능력의 차이 등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 이 차이가 정신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뇌를 구성하는데 연관된 유전자가 인종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는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우리의 뇌는 유전적인 특징으로 인해 빚어지는 차이보다는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집단적 차이를 간단하게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사회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문제는 인종을 구분하는 시도 그 자체보다는,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확장시키는 잘못된 범주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악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싶이 백인들의 피부가 하얀 것은 햇빛이 약한 지역에 살았던 특성 상, 태양빛의 피부 투과를 지나치게 차단시키면 햇빛에 의해 합성이 촉진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져 뼈가 약해지고 뒤틀리는 구루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루병에 걸리게 되면 힘든 노동을 견뎌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구루병이 골반뼈까지 변형시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햇빛이 적은 지역에서는 피부색이 짙은 이들은 자손을 남길 수 없었으며 오랜 시간 이런 결과들이 반복된 결과, 햇빛이 적은 지역에는 피부가 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애초에 인종이 나타난 것은 주변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슷한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들 사이에는 분명 유전적인 특징이 공유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유전적 특징들은 특정 질병이나 특정 약물의 대사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는 인종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더 효과적이고 적합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에는 분명 인종을 구별하지만, 여기서도 그 목적은 단지 ‘구분’의 목적이다.
3. 이처럼 인종은 철저히 생물학적 특징과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개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종 개념을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인종을 둘러싼 모든 문제와 갈등은 바로 인종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생물학적으로 인종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는 생물학적 종을 구별할 만큼 크지 않아 다양한 혼인관계에 의해 이들은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고, 설사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멜라닌 색소의 차이, 코와 머리칼과 체모의 차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나 특정 약물의 대사 능력의 차이 등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 이 차이가 정신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뇌를 구성하는데 연관된 유전자가 인종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는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우리의 뇌는 유전적인 특징으로 인해 빚어지는 차이보다는 후천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집단적 차이를 간단하게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사회적인 개념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문제는 인종을 구분하는 시도 그 자체보다는,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 확장시키는 잘못된 범주화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 악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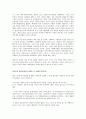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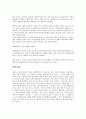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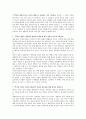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