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욕망하는 기계와 탈코드화
2. 유목민의 책들
3. 기관없는 신체
4. 밖으로의 사고 실험
5. 결론
1)형이상학의 또 다른 전도
2)욕망의 야누스
-참고자료
2. 유목민의 책들
3. 기관없는 신체
4. 밖으로의 사고 실험
5. 결론
1)형이상학의 또 다른 전도
2)욕망의 야누스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밖으로의 사고>에 대한 사고 실험이다. 우리는 귀속해야 할 의미 작용의 영토를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추구할 필요도 없다. 속령으로부터의 이탈은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포획에 저항하면서 처음도 끝도 없는 초원을 이동하는 유목민의 <도주>의 삶이다. 그것은 곧 <변신>의 삶인 것이다. <변신>이란 다른 무언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권력에 의해 일원화, 질서화 되지 않는 생활의 전략이다.
<도주>란 소극적인 주둔이 아니라 권력의 질서화에 대한 투쟁 전략이다. 도주란 곧 투쟁이다. 권력의 속령화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도망하는 것이고, 질서로부터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투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주란 결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출이자 출발이고, 탈속령화, 즉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다. 『앙티 오이디푸스』는 결국 이러한 절대적 탈속령화의 실험을 위한 지침서이자 프로그램이다.
5.결론
1)형이상학의 또 다른 전도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 그들에게 인간은 노마드이고, 그 욕망도 리좀적 다양태이므로 그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리좀을 위한 개방 공간이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 이론은 논리적으로 뒤죽박죽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심지어 그것은 유토피아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칭기즈 칸처럼 노마드의 욕망이 폭력적이거나 파시스트적인 사태로 돌변할 경우 그것에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들은 노마드들의 욕망과 다양한 권력과의 관계 설정에 미흡했다. 한편 그들이 주장하는 욕망의 원리는 오직 생산과 생산성에만 국한된다. 욕망은 곧 생산이므로 그 욕망론도 생산 중심주의적 욕망론인 셈이다. 생산 중심주의자들인 그들은 이성의 생산성을 욕망의 생산성으로 대치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물질적 욕망 기계론은 아무리 형이상학의 배제를 주장했을지라도 형이상학적 생산론, 즉 또 다른 생산의 형이상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전도된 형이상학에 불과할 뿐이다.
2)욕망의 야누스
들뢰즈 자신의 신체와 도주의 언설은 이율배반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란 기본적으로 근대의 의식적 주체와는 달리 무의식의 욕망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역사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목적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체란 <끊임없이 도주하여 무언가가 되려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율배반은 들뢰즈 자신의 신체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파리의 제8대학에 정주해온 자신의 현실을 한 번도 떠나려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앙티 오이디푸스』는 무의식의 욕망과 전의식의 이익과의 관계를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 그의 언설이 푸코의 예언만큼 집단적 연결agencement collectif 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푸코는 실제는 그가 지향하는 바대로 살려고 시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 세계의 이론만 제시하였을 뿐이지 그 자체를 자신들의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푸코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해체주의와 그 이후] - 지은이 이광래
참고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655&cid=41908&categoryId=41954
http://blog.naver.com/bluebellsong/300526498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908&cid=41978&categoryId=41985
http://blog.jinbo.net/ljydialogue/56
<도주>란 소극적인 주둔이 아니라 권력의 질서화에 대한 투쟁 전략이다. 도주란 곧 투쟁이다. 권력의 속령화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도망하는 것이고, 질서로부터 빠져나오는 구멍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투쟁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주란 결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탈출이자 출발이고, 탈속령화, 즉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다. 『앙티 오이디푸스』는 결국 이러한 절대적 탈속령화의 실험을 위한 지침서이자 프로그램이다.
5.결론
1)형이상학의 또 다른 전도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 그들에게 인간은 노마드이고, 그 욕망도 리좀적 다양태이므로 그에게 요구되는 것 역시 리좀을 위한 개방 공간이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 이론은 논리적으로 뒤죽박죽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다. 심지어 그것은 유토피아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칭기즈 칸처럼 노마드의 욕망이 폭력적이거나 파시스트적인 사태로 돌변할 경우 그것에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들은 노마드들의 욕망과 다양한 권력과의 관계 설정에 미흡했다. 한편 그들이 주장하는 욕망의 원리는 오직 생산과 생산성에만 국한된다. 욕망은 곧 생산이므로 그 욕망론도 생산 중심주의적 욕망론인 셈이다. 생산 중심주의자들인 그들은 이성의 생산성을 욕망의 생산성으로 대치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물질적 욕망 기계론은 아무리 형이상학의 배제를 주장했을지라도 형이상학적 생산론, 즉 또 다른 생산의 형이상학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 역시 전도된 형이상학에 불과할 뿐이다.
2)욕망의 야누스
들뢰즈 자신의 신체와 도주의 언설은 이율배반적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란 기본적으로 근대의 의식적 주체와는 달리 무의식의 욕망하는 기계에 지나지 않으므로 역사를 구축하려는 어떠한 목적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체란 <끊임없이 도주하여 무언가가 되려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율배반은 들뢰즈 자신의 신체에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파리의 제8대학에 정주해온 자신의 현실을 한 번도 떠나려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앙티 오이디푸스』는 무의식의 욕망과 전의식의 이익과의 관계를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 그의 언설이 푸코의 예언만큼 집단적 연결agencement collectif 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푸코는 실제는 그가 지향하는 바대로 살려고 시도 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었던 반면에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 세계의 이론만 제시하였을 뿐이지 그 자체를 자신들의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푸코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해체주의와 그 이후] - 지은이 이광래
참고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2655&cid=41908&categoryId=41954
http://blog.naver.com/bluebellsong/300526498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80908&cid=41978&categoryId=41985
http://blog.jinbo.net/ljydialogue/56
키워드
추천자료
 피터아이젠만의 하우스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특성에관한 연구
피터아이젠만의 하우스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특성에관한 연구 해체주의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해체주의(신학적관점)
후기구조주의-해체주의(신학적관점)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 이론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비평
해체주의비평 [데리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데리다의 해체주의
[데리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데리다의 해체주의 해체주의 [DECONSTRUCTION]
해체주의 [DECONSTRUCTION] 해체주의 건축의 이해
해체주의 건축의 이해 해체주의에 영향 받은 건축
해체주의에 영향 받은 건축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상의 시 『오감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 이상의 시 『오감도』 대중영화의 이해 : 본 교재 “영화의 역사” 부분(2장, 3장,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화들 ...
대중영화의 이해 : 본 교재 “영화의 역사” 부분(2장, 3장,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영화들 ...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교재 10장 “성과 정치, 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 ...
[세계의 정치와 경제 공통] 교재 10장 “성과 정치, 경제”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근자에 우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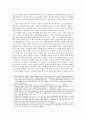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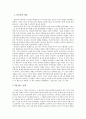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