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퇴계에 있어서의 이발이기수지와 기발이리승지의 함축
Ⅱ. 율곡의 논리의 이질성 및 그에 있어서의 퇴계적 요소의 발굴
Ⅲ. 이발의 논거 및 그것의 참된 뜻
1. 주자의 경우
2. 퇴계선생 자신의 언명
3. 주리파의 해석에 대한 관견
4. 절충파의 해석에 대한 관견
5. 율곡정통파의 경우의 분석
6. 외국학자의 견해
Ⅳ. 결 론
Ⅱ. 율곡의 논리의 이질성 및 그에 있어서의 퇴계적 요소의 발굴
Ⅲ. 이발의 논거 및 그것의 참된 뜻
1. 주자의 경우
2. 퇴계선생 자신의 언명
3. 주리파의 해석에 대한 관견
4. 절충파의 해석에 대한 관견
5. 율곡정통파의 경우의 분석
6. 외국학자의 견해
Ⅳ. 결 론
본문내용
,즉 그가 이른 바 <理의 宰制 또는 理의 명령에 기가 따르면>, 선이 되니 기발리승일도의 길에도 실상은 선 즉 이강기약일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 善> 즉 이강기약과 퇴계의 <이발이기수지에서의 순선> 즉 이강기약은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기가 用事하는>, 제각기 기질이 다른 <뭇 개인에 있어서의 선>이요, 후자는 <기가 용사하지 않는>,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보편적 선>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두 선을 구별>한 데(處)에 퇴계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퇴계는 「그러므로 기와 이가 서로 승부를 해서 기가 거칠어서 이기면 이가 지고 이가 달해서 이기면 기가 따른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매우 타당합니다.」
) 然則氣與理相爲勝負 氣 而勝則理負 理達而勝則氣順也-退溪先生文集 卷36 書 李宏仲問目 6枚 左, 影上 818面
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농암이 「天理는 본연에 輕重의 차가 있고 濁氣는 分數에 다소의 異가 있어서 이와 기 二者가 侵突해서 승부를 할 뿐이다.…이것이 생각컨대 이와 기가 서로 승부를 하는 것의 대략이다.」
) 天理有本然輕重之差 濁氣有分數多少之異 而二者迭爲勝負焉耳…此蓋理氣相勝負之大略也-農巖續集 卷2 說 四端七情說 42枚 右-左, 影799面
라고 쓴 것 역시 이런 뜻을 가진 말일 것이다. 다만 퇴계가 딴 자리에서 「기가 이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이는 스스로 나타나지만 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곧 순종하기 때문이요, 기가 만약에 이에 반항할 때면 이는 도리어 감추어지지만 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곧 추세 때문입니다.」
) 氣能順理時 理自顯 非氣之弱 乃順也 氣若反理時 理反隱 非理之弱 乃勢也-退溪先生文集 卷13 書 答李達李天機 18枚 右, 影上 354面
-464-
라고 쓴 것은 입재의 말처럼 <궁극적으로는 이가 기보다 단연히 강함>을 잘 의식하고는 있으나 <理無朕氣有迹이기에 이약기강>이라는 전통적인 관용구를 건드리기 싫으므로 강약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나아가서 理란 힘으로 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기를 순종시키는 것임을 은연리에 시사하고 싶어서였지 결코 <理의 규제력과 기의 용사력 사이에 각축이 있다>는 사실에서 외면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캐면 이것은 理發而氣隨之보다는 기발이리승지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발이기수지에서는 이가 너무 강해서 기가 전연 용사하지 못하기에 이와 기의 각축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발이기수지 즉 사단 즉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이란 인·의·예·지 즉 <가장 성실한 것 내지는 가장 진실한 것>의 단서이기 때문에 <기의 용사 없이> 이 情이 발하기란 성인의 경우라면 모르되 凡人의 경우에는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기에 <처음부터 범인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인간에게서는 기발이리승지 즉 喜·怒·哀·懼·愛·惡·欲이라는 개인적 정만이 발할 수 있다 함을 표현한 말이 기발리승이라고 <율곡이 직접 언급한 바 있었다면>, 그것은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율곡의 논거는 이런 점에 있지 않고 필자가 田艮齋에 관한 서술 첫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간단히 제시한 것같은 관점에 있다. 하여간 율곡은 기발리승 즉 개인적 선·악의 情 이외에 따로 이발이기수지 즉 보편적인 善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라건대, 그 이유가 앞에서와 바로 위에서 필자가 시사한 것처럼 기발이리승지 즉 기발리승에 있어서의 이강기약과 이발이기수지에 있어서의 이강기약 사이에는 범인의 경우에 관한 한 이의 강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율곡이 분명히 의식하고 문자화해서 였다면 좋으련만 말이다.
-465-
이상에서 밝힌 것 같은 여러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퇴계의 인성론에서의 정에 관한 학설이 지금 이 민족, 이 산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깊이 천착하면 그 핵심이 곧 「그대가 情을 나타냄(실천함)에서 가능하면 이치의 규제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기운이 전연 용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그러면 보편적 선이 될 수 있느니라.」(=이발이기수지)와 「不如意하여 그럴 수 없는 경우에조차 적어도 이치의 규제력이 용사하는 기운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그러면 개인적 선은 될 수 있느니라.」(기발이리승지)라는 법칙윤리라는 점을 이해하기란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발이기수지란 기의 용사가 전연 없는 정이기에 <단서이기는 하지만>, 理一에 가까운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분수는 기발이리승지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顯現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요컨대, <이와 기의 대대관계에서 이의 규제력과 기의 용사력이 승부를 하는 데서 스스로 자기를 제약(한정)하여 理分殊가 되는 것>이 퇴계에 있어서의 <理動의 뜻>이라 하겠다. 그리고 필자는 일반적으로 <理一分殊 즉 統體一太極·各具一太極이 있게 되는 참된 연유>는 본시 바로 이러한 <이와 기의 각축>에 收藏되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理一分殊의 함축이 제대로 음미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치되어 왔고, 이러한 타성에서 이를테면 율곡, 沙 같은 탁월한 두뇌조차 이일분수가 있게 되는 참된 연유룰 포착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 같다.
만약에, 퇴계선생조차 오직 몇 마디 밖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 이 미묘한 자리를 부각·확대시킴으로써 얻어진 필자의 통찰 즉 <理一分殊가 있게 되는 참된 연유란 서로 對待하는 이와 기의 각축에 있다 함>이 정곡을 쏜 해석이라면, 이 논의는 독일의 존재론적 실존철학의 최고권위자 마르틴·하이데거가 후기에 <開明과 은폐의 투쟁>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설명함에서 존재자 전체의 비은폐성인 <로고스( o )>가 <제약(dingen)>되어서 존재자 전체의 비은폐성의 하나 하나인 <物(Ding)>이 된다 한 논의
) M. Heidegger : Vortage und Aufsatze, 1954, S.176, S.207, S.209 ; Holzwege (2 Aufl.), 1952, S.325 참조
와 대비시킬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정녕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66-
) 然則氣與理相爲勝負 氣 而勝則理負 理達而勝則氣順也-退溪先生文集 卷36 書 李宏仲問目 6枚 左, 影上 818面
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농암이 「天理는 본연에 輕重의 차가 있고 濁氣는 分數에 다소의 異가 있어서 이와 기 二者가 侵突해서 승부를 할 뿐이다.…이것이 생각컨대 이와 기가 서로 승부를 하는 것의 대략이다.」
) 天理有本然輕重之差 濁氣有分數多少之異 而二者迭爲勝負焉耳…此蓋理氣相勝負之大略也-農巖續集 卷2 說 四端七情說 42枚 右-左, 影799面
라고 쓴 것 역시 이런 뜻을 가진 말일 것이다. 다만 퇴계가 딴 자리에서 「기가 이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이는 스스로 나타나지만 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곧 순종하기 때문이요, 기가 만약에 이에 반항할 때면 이는 도리어 감추어지지만 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곧 추세 때문입니다.」
) 氣能順理時 理自顯 非氣之弱 乃順也 氣若反理時 理反隱 非理之弱 乃勢也-退溪先生文集 卷13 書 答李達李天機 18枚 右, 影上 354面
-464-
라고 쓴 것은 입재의 말처럼 <궁극적으로는 이가 기보다 단연히 강함>을 잘 의식하고는 있으나 <理無朕氣有迹이기에 이약기강>이라는 전통적인 관용구를 건드리기 싫으므로 강약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나아가서 理란 힘으로 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기를 순종시키는 것임을 은연리에 시사하고 싶어서였지 결코 <理의 규제력과 기의 용사력 사이에 각축이 있다>는 사실에서 외면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캐면 이것은 理發而氣隨之보다는 기발이리승지에 해당되는 말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발이기수지에서는 이가 너무 강해서 기가 전연 용사하지 못하기에 이와 기의 각축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발이기수지 즉 사단 즉 측은·수오·사양·시비지심이란 인·의·예·지 즉 <가장 성실한 것 내지는 가장 진실한 것>의 단서이기 때문에 <기의 용사 없이> 이 情이 발하기란 성인의 경우라면 모르되 凡人의 경우에는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기에 <처음부터 범인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인간에게서는 기발이리승지 즉 喜·怒·哀·懼·愛·惡·欲이라는 개인적 정만이 발할 수 있다 함을 표현한 말이 기발리승이라고 <율곡이 직접 언급한 바 있었다면>, 그것은 그런대로 납득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율곡의 논거는 이런 점에 있지 않고 필자가 田艮齋에 관한 서술 첫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간단히 제시한 것같은 관점에 있다. 하여간 율곡은 기발리승 즉 개인적 선·악의 情 이외에 따로 이발이기수지 즉 보편적인 善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라건대, 그 이유가 앞에서와 바로 위에서 필자가 시사한 것처럼 기발이리승지 즉 기발리승에 있어서의 이강기약과 이발이기수지에 있어서의 이강기약 사이에는 범인의 경우에 관한 한 이의 강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율곡이 분명히 의식하고 문자화해서 였다면 좋으련만 말이다.
-465-
이상에서 밝힌 것 같은 여러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퇴계의 인성론에서의 정에 관한 학설이 지금 이 민족, 이 산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깊이 천착하면 그 핵심이 곧 「그대가 情을 나타냄(실천함)에서 가능하면 이치의 규제력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기운이 전연 용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그러면 보편적 선이 될 수 있느니라.」(=이발이기수지)와 「不如意하여 그럴 수 없는 경우에조차 적어도 이치의 규제력이 용사하는 기운을 능가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그러면 개인적 선은 될 수 있느니라.」(기발이리승지)라는 법칙윤리라는 점을 이해하기란 어렵기만 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발이기수지란 기의 용사가 전연 없는 정이기에 <단서이기는 하지만>, 理一에 가까운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분수는 기발이리승지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顯現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요컨대, <이와 기의 대대관계에서 이의 규제력과 기의 용사력이 승부를 하는 데서 스스로 자기를 제약(한정)하여 理分殊가 되는 것>이 퇴계에 있어서의 <理動의 뜻>이라 하겠다. 그리고 필자는 일반적으로 <理一分殊 즉 統體一太極·各具一太極이 있게 되는 참된 연유>는 본시 바로 이러한 <이와 기의 각축>에 收藏되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理一分殊의 함축이 제대로 음미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방치되어 왔고, 이러한 타성에서 이를테면 율곡, 沙 같은 탁월한 두뇌조차 이일분수가 있게 되는 참된 연유룰 포착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 같다.
만약에, 퇴계선생조차 오직 몇 마디 밖에 언급하지 않았을 뿐인 이 미묘한 자리를 부각·확대시킴으로써 얻어진 필자의 통찰 즉 <理一分殊가 있게 되는 참된 연유란 서로 對待하는 이와 기의 각축에 있다 함>이 정곡을 쏜 해석이라면, 이 논의는 독일의 존재론적 실존철학의 최고권위자 마르틴·하이데거가 후기에 <開明과 은폐의 투쟁>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설명함에서 존재자 전체의 비은폐성인 <로고스( o )>가 <제약(dingen)>되어서 존재자 전체의 비은폐성의 하나 하나인 <物(Ding)>이 된다 한 논의
) M. Heidegger : Vortage und Aufsatze, 1954, S.176, S.207, S.209 ; Holzwege (2 Aufl.), 1952, S.325 참조
와 대비시킬 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정녕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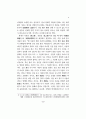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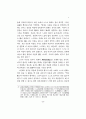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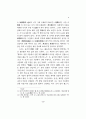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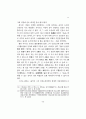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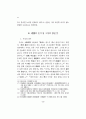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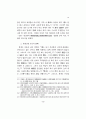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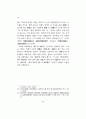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