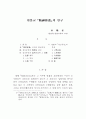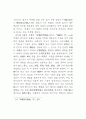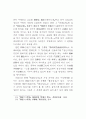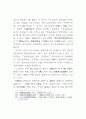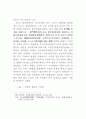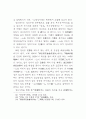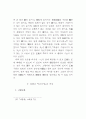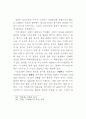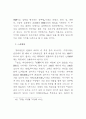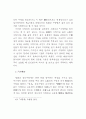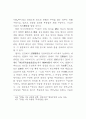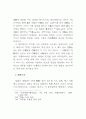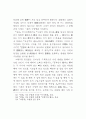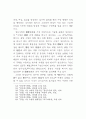목차
Ⅰ. 서 언
Ⅱ. [정신수양] 교리의 형성과정
Ⅲ. 정신수양과 유불선 삼교
Ⅳ. 정신수양의 설명방식과 그 지표
1. 정정 체득
2. 일심 양성
3. 정의 구현
Ⅴ.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
1. 삼학병진
2. 심신겸수
3. 내외쌍수
4. 동정호수
Ⅵ. 결 어
Ⅱ. [정신수양] 교리의 형성과정
Ⅲ. 정신수양과 유불선 삼교
Ⅳ. 정신수양의 설명방식과 그 지표
1. 정정 체득
2. 일심 양성
3. 정의 구현
Ⅴ.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
1. 삼학병진
2. 심신겸수
3. 내외쌍수
4. 동정호수
Ⅵ. 결 어
본문내용
해준다는 互修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動靜互修라는 말은 동정 중 어느 한편만을 택하여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나아가 동정이 합일하여 그 분별 조차 사라진 一如의 수양법을 지칭한다.
『정전』 무시선법에서는 「사람이 만일 참다운 禪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眞空으로 體를 삼고 妙有로 用을 삼아 … 動하여도 動하는 바가 없고 靜하여도 靜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 『정전』 제3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 참조.
고 하였고, 「단전주의 필요」에서는 丹田住禪의 수양하는 시간과 의두연마의 연구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실시함으로써 定慧를 쌍전시키면 「空寂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動靜없는 眞如性을 체득할 수 있다」
) 『정전』 제2 수행편 좌선법 「단전주의 필요」 참조.
고 하였다. 이는 이른바 동정을 초월한 참 眞如性의 체득은 動靜을 互修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함을 암시한 말이다.
그렇다면 동정없는 진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소태산 대종사는, 「공부인이 動하고 靜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세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일그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네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
) 『대종경』 수행품 2장 참조.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른바 동정간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으로 避境, 無心, 一心, 禪定의 네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이는 ①동할 때의 수양 은 피경, 무심, 일심을 양성하는 일이며 ②정할 때의 수양 방법은 선정을 체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동정이 서로 닦는 기초와 쓰임을 이루면 마침내 동정에 구애없는 수양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수양의 動靜互修를 가장 직접적으로 기술한 표현은 정산종사의 「수양은 動靜 간에 自性을 떠나지 아니하는 一心 공부」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3장 참조.
라는 말이다. 참된 수양은 동할 때나 정할 때에나 一心을 양성하여 自性을 떠나지 않는 공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정산종사는 일체 상대적 대극의 합일성을 강조하여 「定을 쌓되 動靜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慧를 닦되 智愚에 집착 않는 혜를 닦으며, 戒를 지키되 善惡에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52장 참조.
고 하기에 이른다. 동정이 서로 互修하는 공부를 하면 곧 동정에 구애없고 동정을 초월한 수양이 되며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공부가 된다. 그리될 때 마침내 마음의 자주력을 얻어 수양력을 얻게 되며
) 『정전』 제2 교의편 정신수양 「정신수양의 결과」 참조.
자성의 혜광이 나타나서 극락을 수용하고 생사에 자유를 얻게 된다.
) 『정전』 제3 수행편 좌선법 「좌선의 공덕」 참조.
정산종사는 「정신수양의 표준은 해탈」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8장 참조.
이며 「정신수양의 결과는 생사자유와 극락수용과 만사성공」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6장 참조.
이라고 밝힘으로써, 동정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공부 곧 動靜互修의 궁극 수양처를 짐작케해 주고 있다.
그러한 동정호수의 참수양 공부를 성취할 때 「動하여도 分別에 着이 없고 靜하여도 分別이 節度에 맞게 되는」
) 『정전』 제3 수행편 법위등급 「대각여래위」 조항 참조.
여래의 심법을 나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기교서의 표지들로 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不離自性 應用無念」 공부
) 『修養硏究要論』의 「工夫의 進行順序」에서는 그 진행순서로 初心 發心 立志 修養 硏究 取捨 細密 入靜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 다음에 따로 세밀, 입정 조항을 두고, 「일분일각이라도 마음이 自性을 떠나지 아니하며 應用하여도 생각이 업난 때」를 「入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의 참된 성취요, 『금강경』의 「應無所住而生其心」 공부의 구극처라고 여겨진다.
Ⅵ. 結 語
필자는 본 「원불교 '정신수양'의 연구」라는 논고를 정리함에 있어서 주로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그리고 대산종법사 시대까지 걸쳐 정신수양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양상을 주로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앞에서 정신수양 교리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정신수양과 유불도 삼교의 관련 가능성을 타진한 바탕 아래, 연구의 본론에 들어가 정신수양에 대한 설명방식.지표를 나름대로 「定靜體得」과 「一心養成」 그리고 「正義具現」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을 「三學竝進」과 「心身雙修」 「內外兼修」 「動靜互修」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다만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일컬리는 좌선과 염불 그리고 무시선 등에 대해서는 그 대체적인 의지만 원용했을 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 목적과 결과 등은 논외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소태산대종사가 삼교를 두루 융회시켜 삼학공부법을 제정하려 했다는 사실과 함께 정신수양은, 처음에는 도교적 養性법을 수용하여 설정된 공부법이며 나아가 삼교의 주요 수양상의 핵심적 개념들이 대거 원용하여 부연설명됨을 알았다. 또한 원불교 정신수양의 지표 및 설명방식은 定靜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이며, 一心을 양성하는 수양이며, 실생활에 正義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상에 보이는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은, 정신수양이 삼학의 竝進과 아울러 행해져야 그 참된 수양의 의미가 드러나고, 또한 정신수양은 心身을 겸하여 닦는 수양법이며, 內外를 함께 닦는 공부법이며, 動靜간을 서로 함께 닦는 대승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불교 정신수양은 「動靜간에 自性을 떠나지 않는 一心공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不離自性 應用無念」이고, 「應無所住而生其心」이며, 「動하여도 分別에 着이 없고 定하여도 分別이 節度에 맞는 如來 심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정전』 무시선법에서는 「사람이 만일 참다운 禪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眞空으로 體를 삼고 妙有로 用을 삼아 … 動하여도 動하는 바가 없고 靜하여도 靜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 『정전』 제3 수행편 제7장 「무시선법」 참조.
고 하였고, 「단전주의 필요」에서는 丹田住禪의 수양하는 시간과 의두연마의 연구하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실시함으로써 定慧를 쌍전시키면 「空寂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動靜없는 眞如性을 체득할 수 있다」
) 『정전』 제2 수행편 좌선법 「단전주의 필요」 참조.
고 하였다. 이는 이른바 동정을 초월한 참 眞如性의 체득은 動靜을 互修하는 방법을 통하여 가능함을 암시한 말이다.
그렇다면 동정없는 진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소태산 대종사는, 「공부인이 動하고 靜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세째는 이 일을 할 때에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에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일그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네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
) 『대종경』 수행품 2장 참조.
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른바 동정간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으로 避境, 無心, 一心, 禪定의 네가지를 제시한 것이다. 요컨대 이는 ①동할 때의 수양 은 피경, 무심, 일심을 양성하는 일이며 ②정할 때의 수양 방법은 선정을 체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하여 동정이 서로 닦는 기초와 쓰임을 이루면 마침내 동정에 구애없는 수양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수양의 動靜互修를 가장 직접적으로 기술한 표현은 정산종사의 「수양은 動靜 간에 自性을 떠나지 아니하는 一心 공부」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3장 참조.
라는 말이다. 참된 수양은 동할 때나 정할 때에나 一心을 양성하여 自性을 떠나지 않는 공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정산종사는 일체 상대적 대극의 합일성을 강조하여 「定을 쌓되 動靜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慧를 닦되 智愚에 집착 않는 혜를 닦으며, 戒를 지키되 善惡에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52장 참조.
고 하기에 이른다. 동정이 서로 互修하는 공부를 하면 곧 동정에 구애없고 동정을 초월한 수양이 되며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공부가 된다. 그리될 때 마침내 마음의 자주력을 얻어 수양력을 얻게 되며
) 『정전』 제2 교의편 정신수양 「정신수양의 결과」 참조.
자성의 혜광이 나타나서 극락을 수용하고 생사에 자유를 얻게 된다.
) 『정전』 제3 수행편 좌선법 「좌선의 공덕」 참조.
정산종사는 「정신수양의 표준은 해탈」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8장 참조.
이며 「정신수양의 결과는 생사자유와 극락수용과 만사성공」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6장 참조.
이라고 밝힘으로써, 동정간 자성을 떠나지 않는 일심공부 곧 動靜互修의 궁극 수양처를 짐작케해 주고 있다.
그러한 동정호수의 참수양 공부를 성취할 때 「動하여도 分別에 着이 없고 靜하여도 分別이 節度에 맞게 되는」
) 『정전』 제3 수행편 법위등급 「대각여래위」 조항 참조.
여래의 심법을 나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초기교서의 표지들로 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不離自性 應用無念」 공부
) 『修養硏究要論』의 「工夫의 進行順序」에서는 그 진행순서로 初心 發心 立志 修養 硏究 取捨 細密 入靜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 다음에 따로 세밀, 입정 조항을 두고, 「일분일각이라도 마음이 自性을 떠나지 아니하며 應用하여도 생각이 업난 때」를 「入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의 참된 성취요, 『금강경』의 「應無所住而生其心」 공부의 구극처라고 여겨진다.
Ⅵ. 結 語
필자는 본 「원불교 '정신수양'의 연구」라는 논고를 정리함에 있어서 주로 원불교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 그리고 대산종법사 시대까지 걸쳐 정신수양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흐름과 양상을 주로 그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앞에서 정신수양 교리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정신수양과 유불도 삼교의 관련 가능성을 타진한 바탕 아래, 연구의 본론에 들어가 정신수양에 대한 설명방식.지표를 나름대로 「定靜體得」과 「一心養成」 그리고 「正義具現」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을 「三學竝進」과 「心身雙修」 「內外兼修」 「動靜互修」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다만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일컬리는 좌선과 염불 그리고 무시선 등에 대해서는 그 대체적인 의지만 원용했을 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 목적과 결과 등은 논외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소태산대종사가 삼교를 두루 융회시켜 삼학공부법을 제정하려 했다는 사실과 함께 정신수양은, 처음에는 도교적 養性법을 수용하여 설정된 공부법이며 나아가 삼교의 주요 수양상의 핵심적 개념들이 대거 원용하여 부연설명됨을 알았다. 또한 원불교 정신수양의 지표 및 설명방식은 定靜을 체득하기 위한 공부이며, 一心을 양성하는 수양이며, 실생활에 正義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상에 보이는 원불교 정신수양의 특징은, 정신수양이 삼학의 竝進과 아울러 행해져야 그 참된 수양의 의미가 드러나고, 또한 정신수양은 心身을 겸하여 닦는 수양법이며, 內外를 함께 닦는 공부법이며, 動靜간을 서로 함께 닦는 대승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불교 정신수양은 「動靜간에 自性을 떠나지 않는 一心공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不離自性 應用無念」이고, 「應無所住而生其心」이며, 「動하여도 分別에 着이 없고 定하여도 分別이 節度에 맞는 如來 심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