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인명(匠人名)이 나타나게 된 연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장인명이 많이 발견되는 예들은 인화분청의 절정기인 세조연간(1455-1468)의 그릇들에서다.
제조지방이 표시된 예들은 경상도지방의 가마제품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密陽長興庫」 「慶州長興庫」 「彦陽仁壽府」 등에서처럼 경상도지방 이름과 주로 「장흥고」 「인수부」 등의 관청명이 조합되었다. 광주 충효동가마 출토 「內贍」 「茂珍內贍」의 파편들에서와 같이 전라도지방에도 지방명과 관청명이 합쳐진 예들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무안 고창 등지에서도 「內贍」이라는 도장이 찍힌 파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충청도지방에서는 「禮賓寺」(예빈시) 「內資寺」(내자시) 「內贍寺」(내섬시) 등의 관청명이 주로 발견된다.
제작시기와 사용처에 대한 명문은 앞에 소개한 충효동가마 출토 「未四」(1475), 「丁閏二」(1477), 「成化丁酉」(1477), 「光公」(光州지방의 公物), 「光上」(光州지방의 上品), 「光別」(광주지방에서 특별히 구운 제품) 등에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 분원(分院)의 설치로 인한 분청사기의 쇠퇴
광주시 충효동가마에서 나온 「未四」명 (乙未年 4月; 1475), 「丁閏二」명(丁酉年 閏 2월; 1477) 파편들과 「成化 丁酉」명(成化연간의 丁酉年; 1477) 분청묘지편들은 분명한 연대를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조잡한 양식을 갖추고 있어 1470년대에 들어서서 분청사기의 급격한 쇠퇴를 여실히 보여준다. 「內贍寺」와 같이 중앙의 여러 관청에 도자기를 납품하였던 충효동가마가 이처럼 지방가마로 급격히 쇠퇴한 원인은 중앙관청과 왕실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일군의 가마가 1467-1468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분원이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적어도 분원의 본청에 해당하는 사옹원이 사옹방으로 개칭되면서 祿官을 둔 146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예종 원년(1469) 1-3월 사이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최고급 백자를 제작했던 상품 자기소가 이미 사라졌고, 그 후 1469년 완성된 『經國大典』 「工典」에 사옹원 소속 사기장인 중 경공장(京工匠)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당시에 이미 분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1469년 이전에 이미 경기도 광주에 사옹원의 분원에서는 사옹원에 소속된 장인[官匠]들이 중앙공급용의 정교한 백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1467년 4월 이후 1468년 12월 사이에 경기도 광주에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였던 분원 관요가 설치되었다.
이렇듯 1467, 68년경 관요였던 분원을 설치한 후 중앙 관요였던 분원에서의 자기제작이 백자위주로 되고 또한 백자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남 광주 충효동가마를 비롯한 전국에 흩어져있는 가마에서는 더 이상 중앙공급용 도자기를 제작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방가마들은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분청사기 양식의 저질화가 가속화되었다. 왕실에서 분원을 설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세종조부터 백자를 전용하였다\'는 『용재총화』의 기록에서 보듯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양이 증가한 데에 있다.
1470년경부터 분청사기가 전반적으로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산 철회분청은 유행하였다. 흐릿한 백토 귀얄문 위에 음각으로 명문을 치졸하게 나타낸 국립박물관소장 「嘉靖十九年」명(1540) 묘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청사기는 1540년경이 되면 현저하게 퇴조(退調)하여 16세기 중후반경에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백자>
백자(白磁)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단단한 백자의 영향을 받아 최상품일 경우 하얀 태토에 파르스름한 투명유가 입혀지고, 세종대에는 중국 왕실에서 요구할정도로 매우 정교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일반 서민들은 계층에 따라 고급 백자에서부터 거친 막사기까지를 사용하였다.
。 종류와 양식적 특징
백자의 색과 질(質)은 시대와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눈같이 흰 설백색과 회백색, 청백색, 유백색 등을 띠며 정교한 것에서 부터 거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선시대에는 푸른 코발트안료로 문양을 나타낸 청화백자(靑花白磁)가 중국 원(元)·명(明) 도자의 영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조선 초의 청화백자에서는 중국 도자를 모방하여 당시 명(明) 자기에서 유행하던 도식화된 당초문이 시문된 예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들은 곧 한국화된 운동감있는 문양이나 토속적인 정취가 배어나는 회화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예를 들면, 매화가지 위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고 그 나무 아래 들국화가 피어있는 한 폭의 그림같은 문양이라든가 힘찬 필력의 매죽문 등이 한국화된 자기의 문양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양의 특징은 당시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는 점과 적당한 여백을 가진 점이다.
이 밖에 음양각문, 투각문, 상감문, 극소수의 인화문, 철회문, 진사문 등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해온 장식문양들이 백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석간주(石間朱)\'라고 부르는 도자기는 철사안료(이를 석간주라고 함)로 무늬를 그린 철회문, 그리고 그릇 전면 혹은 일부를 칠한 철채자기\'를 말한다. 혹은 철분을 함유한 유약을 입혀 흑갈색이나 적갈색을 띠는 자기를 일컫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흑유(黑釉)\' 또는 철유(鐵釉)\'라고도 한다. 철사안료로 시문된 자기는 임진왜란을 치른 후 17세기부터 다량 제작되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정국이 불안하고 전국토의 가마가 파괴된 상태에서 청화백자의 안료인 코발트는 구하기 힘들었으나 철사안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간주로 통칭되는 검붉은 색의 도자기는 제작이 용이한 관계로 생활자기로서 양산되어 조선도자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백자의 기형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활도자기의 형태이다. 귀족들을 위한 우아하고 섬세한 청자나 서민들의 정서를 담은 자유롭고 거침없이 표현된 분청사기와는 달리 백자에는 실용성을 강조한 형태나 단정한 형태, 혹은 풍만한 대형 항아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연적, 필통 등의 각종 문방구류와 제기(祭器)들이 만들어졌고, 민화의 유행과 더불어 도자기에도 민화가 그려졌다.
제조지방이 표시된 예들은 경상도지방의 가마제품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密陽長興庫」 「慶州長興庫」 「彦陽仁壽府」 등에서처럼 경상도지방 이름과 주로 「장흥고」 「인수부」 등의 관청명이 조합되었다. 광주 충효동가마 출토 「內贍」 「茂珍內贍」의 파편들에서와 같이 전라도지방에도 지방명과 관청명이 합쳐진 예들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무안 고창 등지에서도 「內贍」이라는 도장이 찍힌 파편들이 수습되었으며 충청도지방에서는 「禮賓寺」(예빈시) 「內資寺」(내자시) 「內贍寺」(내섬시) 등의 관청명이 주로 발견된다.
제작시기와 사용처에 대한 명문은 앞에 소개한 충효동가마 출토 「未四」(1475), 「丁閏二」(1477), 「成化丁酉」(1477), 「光公」(光州지방의 公物), 「光上」(光州지방의 上品), 「光別」(광주지방에서 특별히 구운 제품) 등에서 잘 살펴 볼 수 있다.
。 분원(分院)의 설치로 인한 분청사기의 쇠퇴
광주시 충효동가마에서 나온 「未四」명 (乙未年 4月; 1475), 「丁閏二」명(丁酉年 閏 2월; 1477) 파편들과 「成化 丁酉」명(成化연간의 丁酉年; 1477) 분청묘지편들은 분명한 연대를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조잡한 양식을 갖추고 있어 1470년대에 들어서서 분청사기의 급격한 쇠퇴를 여실히 보여준다. 「內贍寺」와 같이 중앙의 여러 관청에 도자기를 납품하였던 충효동가마가 이처럼 지방가마로 급격히 쇠퇴한 원인은 중앙관청과 왕실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일군의 가마가 1467-1468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분원이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적어도 분원의 본청에 해당하는 사옹원이 사옹방으로 개칭되면서 祿官을 둔 146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예종 원년(1469) 1-3월 사이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志』에 최고급 백자를 제작했던 상품 자기소가 이미 사라졌고, 그 후 1469년 완성된 『經國大典』 「工典」에 사옹원 소속 사기장인 중 경공장(京工匠)에 대한 기록이 있어 당시에 이미 분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1469년 이전에 이미 경기도 광주에 사옹원의 분원에서는 사옹원에 소속된 장인[官匠]들이 중앙공급용의 정교한 백자를 전문적으로 제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1467년 4월 이후 1468년 12월 사이에 경기도 광주에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였던 분원 관요가 설치되었다.
이렇듯 1467, 68년경 관요였던 분원을 설치한 후 중앙 관요였던 분원에서의 자기제작이 백자위주로 되고 또한 백자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남 광주 충효동가마를 비롯한 전국에 흩어져있는 가마에서는 더 이상 중앙공급용 도자기를 제작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방가마들은 급격히 쇠퇴하였으며 분청사기 양식의 저질화가 가속화되었다. 왕실에서 분원을 설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세종조부터 백자를 전용하였다\'는 『용재총화』의 기록에서 보듯이 왕실에서 사용하는 백자의 양이 증가한 데에 있다.
1470년경부터 분청사기가 전반적으로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산 철회분청은 유행하였다. 흐릿한 백토 귀얄문 위에 음각으로 명문을 치졸하게 나타낸 국립박물관소장 「嘉靖十九年」명(1540) 묘지에서 볼 수 있듯이 분청사기는 1540년경이 되면 현저하게 퇴조(退調)하여 16세기 중후반경에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백자>
백자(白磁)는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단단한 백자의 영향을 받아 최상품일 경우 하얀 태토에 파르스름한 투명유가 입혀지고, 세종대에는 중국 왕실에서 요구할정도로 매우 정교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일반 서민들은 계층에 따라 고급 백자에서부터 거친 막사기까지를 사용하였다.
。 종류와 양식적 특징
백자의 색과 질(質)은 시대와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눈같이 흰 설백색과 회백색, 청백색, 유백색 등을 띠며 정교한 것에서 부터 거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조선시대에는 푸른 코발트안료로 문양을 나타낸 청화백자(靑花白磁)가 중국 원(元)·명(明) 도자의 영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 따라서 조선 초의 청화백자에서는 중국 도자를 모방하여 당시 명(明) 자기에서 유행하던 도식화된 당초문이 시문된 예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들은 곧 한국화된 운동감있는 문양이나 토속적인 정취가 배어나는 회화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었다. 예를 들면, 매화가지 위에 두 마리의 새가 앉아 있고 그 나무 아래 들국화가 피어있는 한 폭의 그림같은 문양이라든가 힘찬 필력의 매죽문 등이 한국화된 자기의 문양이라 하겠다. 이러한 문양의 특징은 당시의 화풍을 반영하고 있는 점과 적당한 여백을 가진 점이다.
이 밖에 음양각문, 투각문, 상감문, 극소수의 인화문, 철회문, 진사문 등 그동안 우리에게 친숙해온 장식문양들이 백자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석간주(石間朱)\'라고 부르는 도자기는 철사안료(이를 석간주라고 함)로 무늬를 그린 철회문, 그리고 그릇 전면 혹은 일부를 칠한 철채자기\'를 말한다. 혹은 철분을 함유한 유약을 입혀 흑갈색이나 적갈색을 띠는 자기를 일컫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흑유(黑釉)\' 또는 철유(鐵釉)\'라고도 한다. 철사안료로 시문된 자기는 임진왜란을 치른 후 17세기부터 다량 제작되었다. 그 이유는 전쟁으로 정국이 불안하고 전국토의 가마가 파괴된 상태에서 청화백자의 안료인 코발트는 구하기 힘들었으나 철사안료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간주로 통칭되는 검붉은 색의 도자기는 제작이 용이한 관계로 생활자기로서 양산되어 조선도자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백자의 기형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활도자기의 형태이다. 귀족들을 위한 우아하고 섬세한 청자나 서민들의 정서를 담은 자유롭고 거침없이 표현된 분청사기와는 달리 백자에는 실용성을 강조한 형태나 단정한 형태, 혹은 풍만한 대형 항아리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연적, 필통 등의 각종 문방구류와 제기(祭器)들이 만들어졌고, 민화의 유행과 더불어 도자기에도 민화가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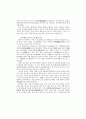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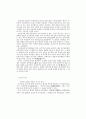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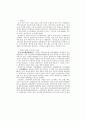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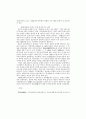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