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탄생과 의례
◎기자
◎산전
◎해산
◎산후
2>성장과 성년식
◎관례
◎계례
3>남녀 결연과 혼례
◎혼전
◎혼례식
◎혼후
4>장수와 환갑의례
◎기자
◎산전
◎해산
◎산후
2>성장과 성년식
◎관례
◎계례
3>남녀 결연과 혼례
◎혼전
◎혼례식
◎혼후
4>장수와 환갑의례
본문내용
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 때 풍습으로 \'신방 엿보기\'가 있다. 이는 나이 어린 신랑이 신부를 짝사랑하는 남자, 또는 사귀(邪鬼)의 해를 입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한편 동상례(東床禮)라는 의식이 있다. 동상례는 처가의 젊은이들과 이웃 청년들이 신랑의 다리에 끈을 매고 거꾸로 매달아 신랑의 발바닥을 나무나 마른 명태로 치면서 신랑의 지혜와 담력을 시험하는 의식이다. 신랑의 됨됨이를 엿보려는 놀이적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승인 받는 의미도 지닌다.
혼후
혼례식이 끝난 다음의 중심 의례는 신부가 시가로 가는 일이다. 이를 신행(新行), 또는 우귀(于歸)라 한다. 우귀의 시기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신부가 초례를 치른 당일 신랑과 같이 시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당일우귀, 3일째 되는 날 신랑과 같이 가는 3일우귀, 그 달을 넘기고 가는 1개월우귀(달묵이라 함), 그 해를 넘기고 가는 1년우귀(해묵이라 함) 등이 있으나, 3일우귀가 보편적이다.
신행 때 수행하는 사람은 상객, 하님(隨母, 웃각시라고도 하는 신부를 돌보아주는 사람), 짐꾼 등이다. 신부가 집을 떠날 때 갖가지 주술적인 행위들이 따른다. 부엌에 가서 솥뚜껑을 세 번 들썩거려 소리를 내어 조왕신에게 작별을 고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간단한 의식을 하기도 하며, 살(煞)을 없앤다 하여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 신행시에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 때 가마를 호피로 두르거나 흰 천으로 X자 모양으로 엮기도 한다. 이는 가마에 잡귀나 액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편 신부가 시가에 들어갈 때는 짚불을 놓아 가마꾼들이 그것을 차면서 들어오게 하고, 콩·팥·목화씨·소금 등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는 잡귀와 액을 쫓기 위한 것으로 정화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신부가 시가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의식이 현구고례(見舅姑禮)이다. 시부모를 비롯한 시가 어른들에게 올리는 첫 인사로서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신부는 준비해 간 대추·밤·안주 등을 상에 차려놓고 시부모에 술을 따라 올린 뒤에 신부 혼자 또는 신랑과 같이 큰절을 한다. 이때 시부모는 상위에 놓인 대추와 밤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주면서 부귀다남(富貴多男)을 당부하는 덕담을 한다.
이상에서 의혼에서부터 우귀에까지의 절차를 일별하여 보았다. 성년식이 보편화되지 못하였던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곧 성인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른\'이란 말은 \'얼다(婚)\'에서 파생된 말이다. 즉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 된다는 뜻으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와 통한다. 우리 나라에서 혼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가문과 자손의 번창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민족이다. 의혼에서 무엇보다도 중시된 것이 상대방의 가문이었으며,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에 해당되어 불행한 일생을 마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로 볼 때 혼례식이 혼인당사자의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의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혼인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가문과 가문간의 결합 및 자손의 번창을 위한 계기에 그 주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4>장수와 환갑의례
부모의 장수를 기리고 경하하는 수연(壽筵)에는 환갑(還甲, 61세 때 생신)·진갑(進甲, 62세 생신)·미수(美壽, 66세 때 생신)·희수(稀壽, 70세 때 생신, 七旬이라고도 함)·희수(喜壽, 77세 때 생신)·팔순(八旬, 80세 때 생신)·미수(米壽, 88세 때 생신)·졸수(卒壽, 90세 때 생신)·백수(白壽, 99세 때 생신)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환갑의례만 보기로 한다.
환갑은 61세가 되는, 곧 태어난 간지(干支)가 다시 돌아오는 해의 생일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화갑(華甲)·회갑(回甲)·주갑(周甲)이라고도 한다. 환갑의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고려말쯤이 아닌가 한다.
환갑은 사례(四禮)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선조 이후부터 중요한 인간의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옛말이 있듯이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인간의 수명이 70세는커녕 60세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부모가 갑년(甲年)까지 산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다.
환갑연의 상차림이나 의식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음식으로는 과일·유과류(油果類)·조과류(造菓類)·오색편류(五色餠類)·편육(片肉)·생성 등 제사상과 거의 동일한 종류이다. 상을 차릴 때 \'상을 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높이 괴는 것을 말한다. 상을 괴는 치수는 5치·7치·9치 등 기수(奇數)로 한다. 상차림을 할 때 회갑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별도의 돌상을 차린다. 부모의 입장에서 회갑을 맞는 아들이라도 돌을 맞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돌상을 별도로 차린 것이다.
헌수(獻壽)은 맏아들·둘째아들·맏달·둘째딸 순서로 부부가 같이 하며,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한다. 비록 어머니의 회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잔에 먼저 술을 따르며, 한쪽 부모만 계시면 술잔은 하나만 놓는다.
환갑은 생일을 기점으로 하는 의례로서는 일생의 마지막 의례인 셈이다. 진갑이나 고희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형편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환갑은 노인과 죽음(祖上)을 한데 섞은 시점이라 할 수 있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중간에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확인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손의 입장에서는 효도의 최후 단계이며, 조상숭배의 시발점이 되는 의례이기도 하다. 아들이나 자부가 술잔을 올리고 재배 또는 사배를 하는 경우에서 그런 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제사 때의 의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갑의례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교육적 기능도 한다. 환갑인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기 부모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림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게 하고, 조상숭배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r.
한편 동상례(東床禮)라는 의식이 있다. 동상례는 처가의 젊은이들과 이웃 청년들이 신랑의 다리에 끈을 매고 거꾸로 매달아 신랑의 발바닥을 나무나 마른 명태로 치면서 신랑의 지혜와 담력을 시험하는 의식이다. 신랑의 됨됨이를 엿보려는 놀이적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승인 받는 의미도 지닌다.
혼후
혼례식이 끝난 다음의 중심 의례는 신부가 시가로 가는 일이다. 이를 신행(新行), 또는 우귀(于歸)라 한다. 우귀의 시기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신부가 초례를 치른 당일 신랑과 같이 시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당일우귀, 3일째 되는 날 신랑과 같이 가는 3일우귀, 그 달을 넘기고 가는 1개월우귀(달묵이라 함), 그 해를 넘기고 가는 1년우귀(해묵이라 함) 등이 있으나, 3일우귀가 보편적이다.
신행 때 수행하는 사람은 상객, 하님(隨母, 웃각시라고도 하는 신부를 돌보아주는 사람), 짐꾼 등이다. 신부가 집을 떠날 때 갖가지 주술적인 행위들이 따른다. 부엌에 가서 솥뚜껑을 세 번 들썩거려 소리를 내어 조왕신에게 작별을 고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 간단한 의식을 하기도 하며, 살(煞)을 없앤다 하여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 신행시에 신부는 가마를 타고 가는데, 이 때 가마를 호피로 두르거나 흰 천으로 X자 모양으로 엮기도 한다. 이는 가마에 잡귀나 액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편 신부가 시가에 들어갈 때는 짚불을 놓아 가마꾼들이 그것을 차면서 들어오게 하고, 콩·팥·목화씨·소금 등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는 잡귀와 액을 쫓기 위한 것으로 정화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신부가 시가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의식이 현구고례(見舅姑禮)이다. 시부모를 비롯한 시가 어른들에게 올리는 첫 인사로서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신부는 준비해 간 대추·밤·안주 등을 상에 차려놓고 시부모에 술을 따라 올린 뒤에 신부 혼자 또는 신랑과 같이 큰절을 한다. 이때 시부모는 상위에 놓인 대추와 밤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주면서 부귀다남(富貴多男)을 당부하는 덕담을 한다.
이상에서 의혼에서부터 우귀에까지의 절차를 일별하여 보았다. 성년식이 보편화되지 못하였던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곧 성인됨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른\'이란 말은 \'얼다(婚)\'에서 파생된 말이다. 즉 결혼을 해야만 어른이 된다는 뜻으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와 통한다. 우리 나라에서 혼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가문과 자손의 번창에 남다른 애착을 가진 민족이다. 의혼에서 무엇보다도 중시된 것이 상대방의 가문이었으며,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에 해당되어 불행한 일생을 마치는 예가 비일비재하였다. 이로 볼 때 혼례식이 혼인당사자의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의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혼인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라기보다 가문과 가문간의 결합 및 자손의 번창을 위한 계기에 그 주된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다.
4>장수와 환갑의례
부모의 장수를 기리고 경하하는 수연(壽筵)에는 환갑(還甲, 61세 때 생신)·진갑(進甲, 62세 생신)·미수(美壽, 66세 때 생신)·희수(稀壽, 70세 때 생신, 七旬이라고도 함)·희수(喜壽, 77세 때 생신)·팔순(八旬, 80세 때 생신)·미수(米壽, 88세 때 생신)·졸수(卒壽, 90세 때 생신)·백수(白壽, 99세 때 생신)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인 환갑의례만 보기로 한다.
환갑은 61세가 되는, 곧 태어난 간지(干支)가 다시 돌아오는 해의 생일을 말하는 것으로, 달리 화갑(華甲)·회갑(回甲)·주갑(周甲)이라고도 한다. 환갑의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고려말쯤이 아닌가 한다.
환갑은 사례(四禮)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선조 이후부터 중요한 인간의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옛말이 있듯이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인간의 수명이 70세는커녕 60세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부모가 갑년(甲年)까지 산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잔치를 베풀었다.
환갑연의 상차림이나 의식은 집안의 형편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음식으로는 과일·유과류(油果類)·조과류(造菓類)·오색편류(五色餠類)·편육(片肉)·생성 등 제사상과 거의 동일한 종류이다. 상을 차릴 때 \'상을 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높이 괴는 것을 말한다. 상을 괴는 치수는 5치·7치·9치 등 기수(奇數)로 한다. 상차림을 할 때 회갑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별도의 돌상을 차린다. 부모의 입장에서 회갑을 맞는 아들이라도 돌을 맞는 어린애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돌상을 별도로 차린 것이다.
헌수(獻壽)은 맏아들·둘째아들·맏달·둘째딸 순서로 부부가 같이 하며, 남자는 재배, 여자는 사배를 한다. 비록 어머니의 회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잔에 먼저 술을 따르며, 한쪽 부모만 계시면 술잔은 하나만 놓는다.
환갑은 생일을 기점으로 하는 의례로서는 일생의 마지막 의례인 셈이다. 진갑이나 고희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형편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환갑은 노인과 죽음(祖上)을 한데 섞은 시점이라 할 수 있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중간에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확인 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손의 입장에서는 효도의 최후 단계이며, 조상숭배의 시발점이 되는 의례이기도 하다. 아들이나 자부가 술잔을 올리고 재배 또는 사배를 하는 경우에서 그런 사정을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제사 때의 의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환갑의례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교육적 기능도 한다. 환갑인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자기 부모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림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게 하고, 조상숭배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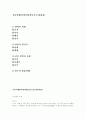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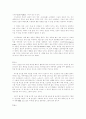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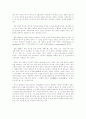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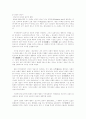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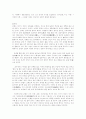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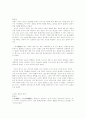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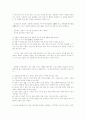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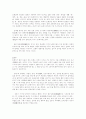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