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가기관의 구성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
1.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배경
2. 국가기관의 구성실제
3.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
4.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국가기관별 관여도
Ⅲ.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와 성향
1. 체제와 그에 대한 반응
2. 실질적 임명권과 형식적 임명권
3.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
4. 정당간의 성향비교
Ⅳ.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1. 공시된 결정의 기본적 분석
2. 결정의견의 유형분석
3. 재판관별 의견참여 내용분석
4. 재판관 상호간의 동조상태 분석
Ⅴ. 분야별 헌법재판소 결정실제
Ⅵ. 재판관별 결정실제와 평가
1. 체제유지적 성향
2. 체제중립적 성향
3. 체제개혁적 성향
Ⅶ. 향후 전망
1.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
2. 정치적 여건의 변화
3.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Ⅷ. 결 론
Ⅱ. 국가기관의 구성과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
1. 헌법재판소제도의 채택배경
2. 국가기관의 구성실제
3.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
4.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있어 국가기관별 관여도
Ⅲ.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와 성향
1. 체제와 그에 대한 반응
2. 실질적 임명권과 형식적 임명권
3.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
4. 정당간의 성향비교
Ⅳ.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1. 공시된 결정의 기본적 분석
2. 결정의견의 유형분석
3. 재판관별 의견참여 내용분석
4. 재판관 상호간의 동조상태 분석
Ⅴ. 분야별 헌법재판소 결정실제
Ⅵ. 재판관별 결정실제와 평가
1. 체제유지적 성향
2. 체제중립적 성향
3. 체제개혁적 성향
Ⅶ. 향후 전망
1.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
2. 정치적 여건의 변화
3.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Ⅷ. 결 론
본문내용
체제중립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 후임으로 김덕주 대법원장은 황도연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였다. 체제유지적인 성향인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황도연 재판관은 임명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여기서의 성향분류에 따르면 체제유지성향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관의 성향비율은 체제유지:체제중립:체제개혁이 종래 3:4:2에서 4:3:2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그만큼 위헌결정의 가능성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아무튼 이는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반영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할 것이다.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는 결정의 평의과정에 변화된 여건이 반영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아직은 속단하기에 이르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일련의 증후군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임을 의식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체제반응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3.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사죄광고의 위헌결정
) 헌재 91.4.1.선고 89헌마160결정 - 헌판집 3, 149.
이 있은 후 민자당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업무활동영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음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었었다
) 한겨레신문 1991.4.11.자 참조.
. 그때 그와 더불어 언급된 사항이 비상임재판관을 상임재판관으로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만약 비상임재판관을 상임재판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기존의 비상임재판관이 그대로 상임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비상임재판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崔光律·金鎭佑·황도연 재판관 등으로 그들의 체제반응은 각각 체제유지적, 체제개혁적, 체제유지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대체되는 인물들은 현재의 정국구도상 모두 체제유지적 성향으로 충원될 것이다.
)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은 당연히 체제유지적일 것이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신임 대법원장이 체제유지적 성향임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할 것이며, 그리고 국회에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과거 民主黨이 추천하였으나 民主黨은 民正黨과 共和黨과 함께 民自黨으로 통합하였으며 원내의석이 3분의 2 이상인 民自黨이 당연히 국회선출 케이스인 3인중 2인을 추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장래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성향비율은 체제유지:체제중립:체제개혁이 종래 3:4:2이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교체에 따라 4:3:2로 되었던 것이 다시 5:3:1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91.11.30. 법률 제4408호 헌법재판소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상임재판관과 비상임재판관은 이 법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Ⅷ. 결 론
이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와 관련시켜 그들의 성향에 관하여 지난 2년 동안 선고·공시된 결정례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체제반응사건에 있어 재판관들이 재판성향은 임명권자별 성향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제무관사건에서는 재판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초기 1년동안의 결정례는 체제반응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그 후 1년동안의 결정례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개혁적인 金鎭佑 재판관이 중립적 성향으로, 유지적인 金亮均 재판관이 중립적 성향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金汶熙 재판관이 유지적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제에 무관한 사건에서는 그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우선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반대의견이 일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권한의 획정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입법과 윤리도덕입법에 대해서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李時潤·金亮均 재판관은 양자 모두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金鎭佑·崔光律·金汶熙 재판관 등은 양자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韓柄寀 재판관은 전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비해서 曺圭光·李成烈·卞禎洙 재판관은 韓柄寀 재판관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국가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또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의 수호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갈등의 주체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때에만 이것은 가능하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준수한 것을 요구함은 타당치 않다.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에게 부과된 사명의 비중과 비교할 때 그가 발을 디딛고 서있는 헌법적 토양은 아주 척박하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유지에 소홀히 할 때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 확인기관으로 전락
) 崔大權, 憲裁의 違憲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法學(서울大 法學硏究所) 제30권 제3·4호, 1989, 248면(시류가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면 역기능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 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일련의 결정선고에서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얼마만큼 역할지각에 반응하였는가를 스스로 되집어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의미는 결정의 평의과정에 변화된 여건이 반영됨을 말한다. 이에 대해 아직은 속단하기에 이르다고 보여진다. 물론 그렇지만 그에 따른 일련의 증후군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임을 의식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의 체제반응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3.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사죄광고의 위헌결정
) 헌재 91.4.1.선고 89헌마160결정 - 헌판집 3, 149.
이 있은 후 민자당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업무활동영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논의를 하고 있음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었었다
) 한겨레신문 1991.4.11.자 참조.
. 그때 그와 더불어 언급된 사항이 비상임재판관을 상임재판관으로 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만약 비상임재판관을 상임재판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기존의 비상임재판관이 그대로 상임재판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비상임재판관의 직에 있는 사람은 崔光律·金鎭佑·황도연 재판관 등으로 그들의 체제반응은 각각 체제유지적, 체제개혁적, 체제유지적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그로 인하여 대체되는 인물들은 현재의 정국구도상 모두 체제유지적 성향으로 충원될 것이다.
)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은 당연히 체제유지적일 것이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신임 대법원장이 체제유지적 성향임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인물을 선택할 것이며, 그리고 국회에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과거 民主黨이 추천하였으나 民主黨은 民正黨과 共和黨과 함께 民自黨으로 통합하였으며 원내의석이 3분의 2 이상인 民自黨이 당연히 국회선출 케이스인 3인중 2인을 추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의 장래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성향비율은 체제유지:체제중립:체제개혁이 종래 3:4:2이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교체에 따라 4:3:2로 되었던 것이 다시 5:3:1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91.11.30. 법률 제4408호 헌법재판소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르면 상임재판관과 비상임재판관은 이 법에 의해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 전의 상임재판관 또는 재판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Ⅷ. 결 론
이상으로 헌법재판관의 임명실제와 관련시켜 그들의 성향에 관하여 지난 2년 동안 선고·공시된 결정례를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체제반응사건에 있어 재판관들이 재판성향은 임명권자별 성향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제무관사건에서는 재판관 고유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초기 1년동안의 결정례는 체제반응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었지만, 그 후 1년동안의 결정례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개혁적인 金鎭佑 재판관이 중립적 성향으로, 유지적인 金亮均 재판관이 중립적 성향으로 그리고 중립적인 金汶熙 재판관이 유지적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체제에 무관한 사건에서는 그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우선 사법부,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반대의견이 일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권한의 획정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입법과 윤리도덕입법에 대해서는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李時潤·金亮均 재판관은 양자 모두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金鎭佑·崔光律·金汶熙 재판관 등은 양자 모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韓柄寀 재판관은 전자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후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이다. 이에 비해서 曺圭光·李成烈·卞禎洙 재판관은 韓柄寀 재판관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국가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또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의 수호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갈등의 주체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때에만 이것은 가능하다.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준수한 것을 요구함은 타당치 않다.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선고함에 있어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에게 부과된 사명의 비중과 비교할 때 그가 발을 디딛고 서있는 헌법적 토양은 아주 척박하다고 보여진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유지에 소홀히 할 때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의 합헌성 확인기관으로 전락
) 崔大權, 憲裁의 違憲決定과 그 根據의 提示, 法學(서울大 法學硏究所) 제30권 제3·4호, 1989, 248면(시류가 바뀌었을 때를 가정하면 역기능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해 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국민으로 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도 있을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일련의 결정선고에서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얼마만큼 역할지각에 반응하였는가를 스스로 되집어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발표자료]유럽 연합 -EU- 에 관한 분석
[발표자료]유럽 연합 -EU- 에 관한 분석 권한쟁의심판_참고자료
권한쟁의심판_참고자료  민법 총칙 총정리 (각종 시험 준비 기본서 활용 가능) 최신 판례 정리 자료
민법 총칙 총정리 (각종 시험 준비 기본서 활용 가능) 최신 판례 정리 자료 민법총칙 중간고사 지필시험 대비 서브노트
민법총칙 중간고사 지필시험 대비 서브노트 대통령중심제미국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관료제차이 비교설명하시오oe
대통령중심제미국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관료제차이 비교설명하시오oe  [이란][이란 수도 테헤란][이란 정부형태][이란 수도][테헤란][이란 수도 테헤란 발전]이란의...
[이란][이란 수도 테헤란][이란 정부형태][이란 수도][테헤란][이란 수도 테헤란 발전]이란의... 독일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독일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현대정치의 이해 현대의 선거제도
현대정치의 이해 현대의 선거제도 가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지방행정론 요약
지방행정론 요약  몽골 건설시장 리포트
몽골 건설시장 리포트 브라질 상파울루의 지방분권,상파울루 주의 지방분권,상파울루 주 정부의 문제점,브라질 연방...
브라질 상파울루의 지방분권,상파울루 주의 지방분권,상파울루 주 정부의 문제점,브라질 연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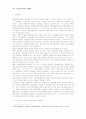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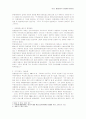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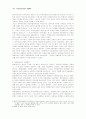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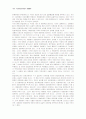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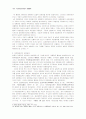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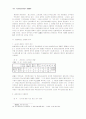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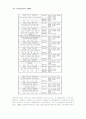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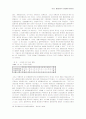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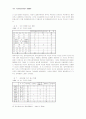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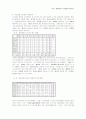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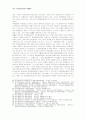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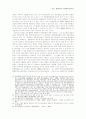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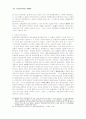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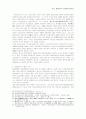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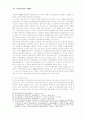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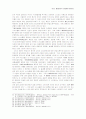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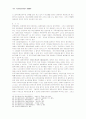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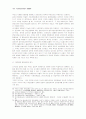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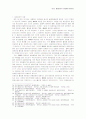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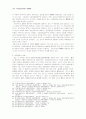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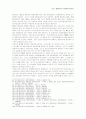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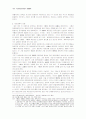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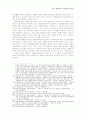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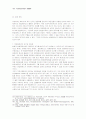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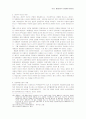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