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칸이 건립되었다. 이에 다음해 1573(선조6년) 2월 16일에 인근서악서원에 봉안되어 있었던 선생의 위판을 이안하고 처음으로 향사를 행하였으며 12월에는 감사 김계휘의 계달로 서액서원에 앞서 사액을 받았다. 옥산서원 설립 후 경주권 사림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유림사회에서 전개된 4현 또는 5현의 승무운동때 만유, 도유들과 함께 이언적의 승무를 적극 주장하고 당시 영남학파를 영도했던 정구와 장연광 문하를 출입하면서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안동, 상주권 유림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옥산서원 설립 당시 조선왕조의 서원진흥책에 힘입어 서원이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되는데 특히 봉사자인 회재 이언적이 1613(광해2년)에 동방5현의 한 분으로 문묘에 종사되자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증대되었다. 이 때 옥산서원은 유림들의 근거지로서 유생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등 영남 유림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3 위치와 입지조건.
- 옥산서원은 화개산, 자옥산, 무학산, 도덕산 등 4개의 명산이 둘러싸고 있는 명당에 자리해 있고, 서원은 서향을 하고 있다. 동북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증심대, 탁영대, 관어대, 영귀대, 영심대 등 5대로 불리는 반석이 계곡을 꾸미고 있어서 예로부터 4산 5대의 경승지로 꼽혀 왔다.
4.4 공간 구성
옥산 서원의 전면에 강의하는 장소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취하고 있다. 배치는 중심축을 따라서 외삼문인 역락문 문루, 강당, 내삼문인 체인문, 사당이 질서있게 배치되고 양재인 해립재와 양진재, 비각과 장판각이 각각 대칭을 이루고 남쪽에 관리사 영역이 덧붙어져 있다.골짜기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 외삼문인 역락문에 들어서면 계곡의 물을 끌어들인 인공 수로로 물의 공간을 두 번 건너게 된다. 물의 공간을 지나면 누가 나타난다. 무변루로 누하진입을 통해 강당인 구인당을 볼 수 있다.무변루와 구인당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양쪽에 해립재와 양진재가 대칭을 이룬다. 이들이 4개의 채가 둘러싸는 마당 영역은 학생들의 주생활 공간이다. 마당은 무변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계곡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그 이유는 누가 외부 공간을 끌어들이는 창이 아니라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경계짓는 하나의 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당을 향한 구인당에는 개구부가 없기에 깨끗한 입면을 보여주면 이는 시선을 막아 양재와 마당, 강당의 공간을 더욱 강조하며 사용하는 학생들의 시선을다른 곳으로 뺏기는 것을 막아준다. 구인당 뒤에는 사당과 비각 장경각이있다. 비각과 장경각은 담으로 둘러싸여 외부에 대해서는 폐쇠적이지만 내부에서는 오픈되어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방되어있는 공간이다.
(내부지향적인 마당)
4.5 옥산 서원의 구조 형태.
옥산서원의 건물들은 전면에 강당공간을 후면에 제향공간을 형성하여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재사가 강당 앞에 놓인 전재사후강당형이며,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묘가 일직선상에 놓인 전형적인 16세기 서원의 배치구성을 이루고 있다. 서원의 진입로에서 서원의 정문인 역락문보다 먼저 측면의 담장과 함께 고직사로 통하는 문이 보이고, 우측에는 1972년 새로 건축된 청분각이 보이며, 좌측의 자계계곡과 함께 역락문 앞의 넓은 공간이 시야에 들어온다. 외부에서는 담장에 의해 내부 건물이 지붕만 드러날 뿐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다. 전체적인 대지는 역락문 앞 공간과 체인묘 앞의 높이가 약 5.4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저후고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역락문을 통해 진입하면 시야는 다시 무변로에 의해 차단된다. 무변루는 다른 일반적인 개방적인 누 건축과는 달리 2층에 온돌을 깐 특이한 형태로서 양 측면의 1칸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2층의 가운데 3칸은 문에 의해 개방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누에서 바라볼 때의 개방성을 드러낼 뿐 외부에서의 시야는 차단되어있다. 또한 역락문과 마당과의 1.6m의 단차로 인해 누하부의 문을 통해서도 마당의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누하진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무변루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비로서 강당인 구인당이 시야에 들어온다. 강학공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구인당은 1893년 강당 화재로 중건되었고,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가운데 3칸은 대청으로 되어 잇고, 양 옆칸은 온돌이 깔린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원장이 거주할 수 있는 온돌방과 강의를 위한 대청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면 방은 모두 마당을 향한 개구부가 없고, 양옆으로 개구부가 나 있다. 이에 비해 마당의 양옆에 있는 민구재와 암수재는 맞배지붕으로 강당의 기단보다 낮은 단위에 있으며, 각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2칸의 대청과 3칸의 온돌방으로 구서오디어 있으며, 강당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숙사와 같은 역할로 해석될 수 있다. 동,서재는 서로 마주보며 대청과 온돌방의 위치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무변루는 정면 7칸, 측면2칸으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출입구와 아궁이로 되어있고, 문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층은 강당의 평면형태에서 양옆으로 1칸씩 마루가 더 나와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층에 위치한 방 역시 강당의 평면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마당을 향한 개구부는 나와있지 않고, 양옆과 역락문 방향으로 개구부가 나 있다. 이와 같이 방과 마루가 같이 있는 루의 형태는 예천향교, 풍기향교의 루와 안동의 칠성루, 봉화의 명월루, 옥동서원의 청월루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향공간은 사묘인 체인묘와 전사청이 같이 강당의 뒤편 단위에 배치되어있다. 체인묘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있으며,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전사청은 체인묘와 90°를 이루고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체인묘의 측면 폭을 고려하여 건물의 규모가 설정된 듯 하다. 전사청의 규모와 위치에 있어 실재 이용목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향
4.3 위치와 입지조건.
- 옥산서원은 화개산, 자옥산, 무학산, 도덕산 등 4개의 명산이 둘러싸고 있는 명당에 자리해 있고, 서원은 서향을 하고 있다. 동북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증심대, 탁영대, 관어대, 영귀대, 영심대 등 5대로 불리는 반석이 계곡을 꾸미고 있어서 예로부터 4산 5대의 경승지로 꼽혀 왔다.
4.4 공간 구성
옥산 서원의 전면에 강의하는 장소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취하고 있다. 배치는 중심축을 따라서 외삼문인 역락문 문루, 강당, 내삼문인 체인문, 사당이 질서있게 배치되고 양재인 해립재와 양진재, 비각과 장판각이 각각 대칭을 이루고 남쪽에 관리사 영역이 덧붙어져 있다.골짜기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 외삼문인 역락문에 들어서면 계곡의 물을 끌어들인 인공 수로로 물의 공간을 두 번 건너게 된다. 물의 공간을 지나면 누가 나타난다. 무변루로 누하진입을 통해 강당인 구인당을 볼 수 있다.무변루와 구인당은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며 양쪽에 해립재와 양진재가 대칭을 이룬다. 이들이 4개의 채가 둘러싸는 마당 영역은 학생들의 주생활 공간이다. 마당은 무변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계곡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다. 그 이유는 누가 외부 공간을 끌어들이는 창이 아니라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경계짓는 하나의 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당을 향한 구인당에는 개구부가 없기에 깨끗한 입면을 보여주면 이는 시선을 막아 양재와 마당, 강당의 공간을 더욱 강조하며 사용하는 학생들의 시선을다른 곳으로 뺏기는 것을 막아준다. 구인당 뒤에는 사당과 비각 장경각이있다. 비각과 장경각은 담으로 둘러싸여 외부에 대해서는 폐쇠적이지만 내부에서는 오픈되어 있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방되어있는 공간이다.
(내부지향적인 마당)
4.5 옥산 서원의 구조 형태.
옥산서원의 건물들은 전면에 강당공간을 후면에 제향공간을 형성하여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재사가 강당 앞에 놓인 전재사후강당형이며, 외삼문, 강당, 내삼문, 사묘가 일직선상에 놓인 전형적인 16세기 서원의 배치구성을 이루고 있다. 서원의 진입로에서 서원의 정문인 역락문보다 먼저 측면의 담장과 함께 고직사로 통하는 문이 보이고, 우측에는 1972년 새로 건축된 청분각이 보이며, 좌측의 자계계곡과 함께 역락문 앞의 넓은 공간이 시야에 들어온다. 외부에서는 담장에 의해 내부 건물이 지붕만 드러날 뿐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다. 전체적인 대지는 역락문 앞 공간과 체인묘 앞의 높이가 약 5.4m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전저후고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역락문을 통해 진입하면 시야는 다시 무변로에 의해 차단된다. 무변루는 다른 일반적인 개방적인 누 건축과는 달리 2층에 온돌을 깐 특이한 형태로서 양 측면의 1칸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2층의 가운데 3칸은 문에 의해 개방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누에서 바라볼 때의 개방성을 드러낼 뿐 외부에서의 시야는 차단되어있다. 또한 역락문과 마당과의 1.6m의 단차로 인해 누하부의 문을 통해서도 마당의 전체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누하진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무변루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비로서 강당인 구인당이 시야에 들어온다. 강학공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구인당은 1893년 강당 화재로 중건되었고,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으며,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의 가운데 3칸은 대청으로 되어 잇고, 양 옆칸은 온돌이 깔린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향교의 명륜당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원장이 거주할 수 있는 온돌방과 강의를 위한 대청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측면 방은 모두 마당을 향한 개구부가 없고, 양옆으로 개구부가 나 있다. 이에 비해 마당의 양옆에 있는 민구재와 암수재는 맞배지붕으로 강당의 기단보다 낮은 단위에 있으며, 각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2칸의 대청과 3칸의 온돌방으로 구서오디어 있으며, 강당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기숙사와 같은 역할로 해석될 수 있다. 동,서재는 서로 마주보며 대청과 온돌방의 위치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무변루는 정면 7칸, 측면2칸으로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출입구와 아궁이로 되어있고, 문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층은 강당의 평면형태에서 양옆으로 1칸씩 마루가 더 나와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2층에 위치한 방 역시 강당의 평면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마당을 향한 개구부는 나와있지 않고, 양옆과 역락문 방향으로 개구부가 나 있다. 이와 같이 방과 마루가 같이 있는 루의 형태는 예천향교, 풍기향교의 루와 안동의 칠성루, 봉화의 명월루, 옥동서원의 청월루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방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다. 제향공간은 사묘인 체인묘와 전사청이 같이 강당의 뒤편 단위에 배치되어있다. 체인묘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있으며,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 전사청은 체인묘와 90°를 이루고 배치되어 있으며,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체인묘의 측면 폭을 고려하여 건물의 규모가 설정된 듯 하다. 전사청의 규모와 위치에 있어 실재 이용목적에는 차이가 있으나,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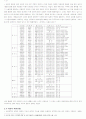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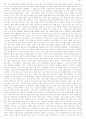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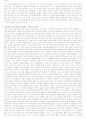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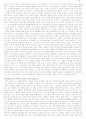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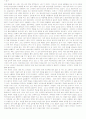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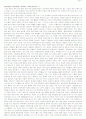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