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조선의 武器所持
Ⅲ. 還刀의 所持와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Ⅳ. 粧刀의 所持와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Ⅴ. 기타 칼의 所持와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Ⅵ. 맺는 말
*참고문헌
Ⅱ. 조선의 武器所持
Ⅲ. 還刀의 所持와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Ⅳ. 粧刀의 所持와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Ⅴ. 기타 칼의 所持와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Ⅵ.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은 바로 이처럼 스스로 자결하는 것이었다. 평상시에는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용도로 활동되나, 비상시 자결을 하거나 상대방을 찌르는 식으로서 호신 및 자결의 용도로 변환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구전되었고, 기록에 남았다. 민승기, 『조선의 무기와 갑옷』, 2004, 가람기획, 143p ~ 144p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보면, 충주목사 원신의 처인 원주 심씨는 왜적이 가까운 곳까지 쳐들어오자 2개의 장도를 옷고름에 달고 다니다가 왜적이 그녀를 겁탈하려들자 장도를 빼어들고 적을 꾸짖다가 살해되었다. 또한 서울에 사는 부제학 신체제의 딸은 정유재란 때 부친을 따라 산속으로 피난을 갔다가 왜적을 만나게 되자, 오른손에 장도를 들고 왼손에 각목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붓고 항거하니, 적이 그녀의 어깨를 찔러 땅에 쓰러뜨려 죽였다고 한다.”
소설이나 다른 기록 등에서는 寶刀나 寶劍으로 기록된다. 이는 이 장도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 꾸밈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절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들의 필수 품목 중 하나였다. 장신구의 성격이 강한 장도는, 남녀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치풍조가 일어나자, 이를 경계하기까지 하였다.
제6조. 갓끈은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하고, 은장도자(銀粧刀子)는 단지 서민에게만 금할 것이며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 6월 15일 기사.
위의 기사는 당시 여러 대신들이 정한 사치 금지 품목 목록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장도를 서민들에게 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미 서민들에게 장도가 널리 퍼져있었고, 이게 문제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치 품목으로서 장도가 이미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제를 하는 대상이 단지 서민들에게만 미친다는 것이다. 즉 양반들이 이런 장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서민들도 누구나 銀粧刀를 한번쯤은 소유하고 싶어 하였으며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소유한 은장도는 집안 자손 대대로 물려 가보로 삼기도 하였다 鄭光龍, 「韓國 銀粧刀에 關한 考察」『大韓金屬學會會報 제 12권 제 1호』, 1999, 大韓金屬學會會報, 21p.
고 한다.
그런데 저 법령은 시행되지 않고 보류되었다. 즉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러한 장도를 소유하는 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도 등의 사치에 대해서는 후에 또다시 언급된다.
김징을 조사하여 아뢴 계사 가운데 ‘은을 남용하고 공장(工匠)을 부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것은, 대개 숟가락 젓가락이나 장도(粧刀) 같은 물건들은 수연(壽宴)이나 생일(生日)에 으레 올리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거운 법으로 단죄를 한다면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종개수실록』 헌종 11년 5월 6일 기사.
장도는 은으로 장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장도로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치풍조로 이어지고, 은의 남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염려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기사는 당시에 장도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장도는 그 값이 비쌌기에 종종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윤탁(尹濁)은 공술(供述)하기를, “이식(李)이 우리집 장도(粧刀)와 우황(牛黃)을 훔쳐간 뒤로 다른 데서도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포도청에 갇혀 있음을 듣고서 또한 정장(呈狀)을 했던 것인데, 이식이 이로 인해 난장(亂杖)을 더 맞고서는 이때부터 종적을 끊고 원한을 품어 이번의 측량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35년 10월 9일 기사. 정장은 訴狀을 낸다는 말이다.
이를 보면 이식이라는 사람이 장도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만큼 장도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조한문단편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보인다.
김경화(金景華)는 동래부(東萊府) 사람이다. 칼을 애호하는 벽(癖)이 있어, 일본 단도 한 자루를 순금 30냥 값을 치르고 3년 만에 구입하였다. 칼서슬에다 털을 놓고 불면 영락 끊어질 정도였다. 이에 속향(速香)으로 집을 만들고 주석으로 장식을 한 다음 차고서 서울로 놀러 갔다. 경화는 새문안의 박씨 집에 사관을 정하였는데, 박씨 또한 칼을 좋아하는 벽이 있었다. 그 단도를 보고 욕심을 내어서 만 이천 전(錢)으로 바꾸자고 청하였다. 李佑成 林熒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中)』, 1996, 一朝閣. 227p.「市奸記」라는 소설로 원제목은 이옥(李鈺)의 「桃花流水館小藁」이다. 속향은 香木의 일종이다. 舍館은 객지에 머무는 동안 남의 집에서 잠시 기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칼은 장도를 의미한데, 일본의 장도 일본의 무기사에서는 장도라고 하면 흔히 長刀를 의미하는 나기나타[치도 : 刀]를 의미한다. 그리고 작은 칼은 와키자시[협차 : 脇差]를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단토[단도 : 短刀]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나기나타가 아닌 단토를 말하는 것이니 혼동 없길 바란다.
이다. 즉 이 이야기를 보면 일본에서까지 고급 장도를 수입하였고, 이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차고 서울로 놀러 갔다고 하는데, 즉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과시이다. 즉 조선시대에 장도를 통한 사치풍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의 이야기를 보면 박씨라는 인물이 소매치기를 고용하여 장도를 훔쳐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서울의 시장인데,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이 소매치기가 횡횡하고, 상업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일면에서 무뢰배와 挾雜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물품들을 수집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類의 장도는 민간에도 퍼져있었다. 민간에서는 양반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못하나 생활용품으로서의 장도가 존재하였다.
주인은 “오늘 가봅시다.”하고 그에게 예리한 칼 한자루를 주는 것이었다.……수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곧
소설이나 다른 기록 등에서는 寶刀나 寶劍으로 기록된다. 이는 이 장도가 굉장히 사치스럽고, 그 꾸밈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절개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에 여성들의 필수 품목 중 하나였다. 장신구의 성격이 강한 장도는, 남녀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치풍조가 일어나자, 이를 경계하기까지 하였다.
제6조. 갓끈은 예조에서 아뢴 대로 하고, 은장도자(銀粧刀子)는 단지 서민에게만 금할 것이며 『연산군일기』 연산군 4년 6월 15일 기사.
위의 기사는 당시 여러 대신들이 정한 사치 금지 품목 목록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장도를 서민들에게 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미 서민들에게 장도가 널리 퍼져있었고, 이게 문제화 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치 품목으로서 장도가 이미 널리 퍼져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제제를 하는 대상이 단지 서민들에게만 미친다는 것이다. 즉 양반들이 이런 장도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반 서민들도 누구나 銀粧刀를 한번쯤은 소유하고 싶어 하였으며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소유한 은장도는 집안 자손 대대로 물려 가보로 삼기도 하였다 鄭光龍, 「韓國 銀粧刀에 關한 考察」『大韓金屬學會會報 제 12권 제 1호』, 1999, 大韓金屬學會會報, 21p.
고 한다.
그런데 저 법령은 시행되지 않고 보류되었다. 즉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러한 장도를 소유하는 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도 등의 사치에 대해서는 후에 또다시 언급된다.
김징을 조사하여 아뢴 계사 가운데 ‘은을 남용하고 공장(工匠)을 부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 것은, 대개 숟가락 젓가락이나 장도(粧刀) 같은 물건들은 수연(壽宴)이나 생일(生日)에 으레 올리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거운 법으로 단죄를 한다면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종개수실록』 헌종 11년 5월 6일 기사.
장도는 은으로 장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은장도로 많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치풍조로 이어지고, 은의 남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염려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기사는 당시에 장도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장도는 그 값이 비쌌기에 종종 도둑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였다.
윤탁(尹濁)은 공술(供述)하기를, “이식(李)이 우리집 장도(粧刀)와 우황(牛黃)을 훔쳐간 뒤로 다른 데서도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포도청에 갇혀 있음을 듣고서 또한 정장(呈狀)을 했던 것인데, 이식이 이로 인해 난장(亂杖)을 더 맞고서는 이때부터 종적을 끊고 원한을 품어 이번의 측량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숙종실록』 숙종 35년 10월 9일 기사. 정장은 訴狀을 낸다는 말이다.
이를 보면 이식이라는 사람이 장도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만큼 장도의 가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조한문단편집』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사가 보인다.
김경화(金景華)는 동래부(東萊府) 사람이다. 칼을 애호하는 벽(癖)이 있어, 일본 단도 한 자루를 순금 30냥 값을 치르고 3년 만에 구입하였다. 칼서슬에다 털을 놓고 불면 영락 끊어질 정도였다. 이에 속향(速香)으로 집을 만들고 주석으로 장식을 한 다음 차고서 서울로 놀러 갔다. 경화는 새문안의 박씨 집에 사관을 정하였는데, 박씨 또한 칼을 좋아하는 벽이 있었다. 그 단도를 보고 욕심을 내어서 만 이천 전(錢)으로 바꾸자고 청하였다. 李佑成 林熒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中)』, 1996, 一朝閣. 227p.「市奸記」라는 소설로 원제목은 이옥(李鈺)의 「桃花流水館小藁」이다. 속향은 香木의 일종이다. 舍館은 객지에 머무는 동안 남의 집에서 잠시 기숙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칼은 장도를 의미한데, 일본의 장도 일본의 무기사에서는 장도라고 하면 흔히 長刀를 의미하는 나기나타[치도 : 刀]를 의미한다. 그리고 작은 칼은 와키자시[협차 : 脇差]를 말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단토[단도 : 短刀]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나기나타가 아닌 단토를 말하는 것이니 혼동 없길 바란다.
이다. 즉 이 이야기를 보면 일본에서까지 고급 장도를 수입하였고, 이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차고 서울로 놀러 갔다고 하는데, 즉 이러한 행태는 일종의 과시이다. 즉 조선시대에 장도를 통한 사치풍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의 이야기를 보면 박씨라는 인물이 소매치기를 고용하여 장도를 훔쳐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서울의 시장인데,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이 소매치기가 횡횡하고, 상업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그 일면에서 무뢰배와 挾雜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귀한 물품들을 수집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類의 장도는 민간에도 퍼져있었다. 민간에서는 양반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못하나 생활용품으로서의 장도가 존재하였다.
주인은 “오늘 가봅시다.”하고 그에게 예리한 칼 한자루를 주는 것이었다.……수기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곧
추천자료
 대구 사회복지 발달의 변천
대구 사회복지 발달의 변천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생각
국가보안법에 대한 나의 생각 초등교육이 나아갈 길
초등교육이 나아갈 길 [음식 문화] 개고기 식용과 문화상대주의
[음식 문화] 개고기 식용과 문화상대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 부당한 이용약관의 사례 및 나의 의견
부당한 이용약관의 사례 및 나의 의견 [인문과학] 아리랑 서평
[인문과학] 아리랑 서평 [의병전쟁][의병전쟁 의의][의병전쟁 역사적 위치][의병 지도층과 조직편제][의병전쟁 전개]...
[의병전쟁][의병전쟁 의의][의병전쟁 역사적 위치][의병 지도층과 조직편제][의병전쟁 전개]... 동시에 다양한 직업(Multi-job)을 구현한 인물 거칠부(居柒夫)
동시에 다양한 직업(Multi-job)을 구현한 인물 거칠부(居柒夫) 서정주의 시세계
서정주의 시세계 견학보고서-동화사
견학보고서-동화사 북한의 토지제도 개관과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북한의 토지제도 개관과 정책방향에 관한 소고 호텔업 {호텔의 어원과 개념 및 분류 호텔의 발전사, 호텔 기업의 특성, 호텔경영}.pptx
호텔업 {호텔의 어원과 개념 및 분류 호텔의 발전사, 호텔 기업의 특성, 호텔경영}.pptx 현대시인탐방 - 「부정의 진실을 노래한 민중시인 오장환」
현대시인탐방 - 「부정의 진실을 노래한 민중시인 오장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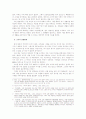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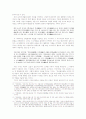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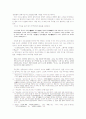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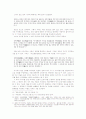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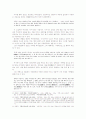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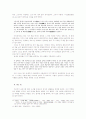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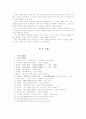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