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사 정리
Ⅱ. 작품 분석
1. 시조의 이해와 감상
<참고 문헌>
1. 문제제기
2. 연구사 정리
Ⅱ. 작품 분석
1. 시조의 이해와 감상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위백규에 한정된 논의이지만, 농가구장을 농가의 생활 체험이나 생활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시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조에 관한 연구는 80년대 이후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에는 역사성에 좀더 주의를 기울인 작품 논의도 나오게 된다.
또한 가객을 포함하는 담당층에 대한 논의가 사설시조의 창작 문제와 관련을 맺으면서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논의에 쟁점은 사설시조를 17~18세기에 주도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한 집단이 중간계층인지 아니면 사대부인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전자의 입장에선 고미숙 고미숙,「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어문논집』,1991
과 강명관 강명관,「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하여」,『민족문학사연구』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은 사설시조는 부농, 역관, 상인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중간 계급의 물질적, 이론적 지원 위에 그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향유되었다고 보았다.
그와는 반대로 김학성 김학성,「사설시조의 담당층」,『성균어문연구』29집, 성균관대 국어국문학회, 1993
은 후자의 입장에서 18세기에도 역시 사설시조를 주도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한 계층은 사대부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18세기 이전에도 사대부들은 사설시조를 창작했고 그들의 가악 풍류 생활에서 사설시조와 같은 성격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실연되었다고 주장한다.
Ⅱ. 작품 분석
1. 시조의 이해와 감상
(1) 이별의 정한
<청구영언 367 - 계랑>
梨花雨 흣릴 제 울며 잡고 離別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각가
千里에 외로온 만 오락가락 노매
이화우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이 시조는 호가 ‘매창’이라 익히 알려진 계랑의 시조이다. 계랑은 가창과 거문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 그에 대한 기록은 허균과 이수광 등의 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또한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매창집』이라고 하는 문집도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기생의 역할은 다양했으니, 우선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여악을 위해 기생을 두어 내연에서 연회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악이 필요했으며, 내연은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행하였다. 또 지방의 여러 군(郡)에 명하여 기녀를 뽑아 올려 악원(樂院)에 예속시켜 노래와 춤을 익히도록 하였다. 태종조에는 의녀 제도를 만들어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고, 지방의 관비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영리한 자를 뽑아 어려 침구술을 익혀 내의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업(妓業)을 겸행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약방기생이라 불렀고, 침비는 상의사 소속으로 의녀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겸행하였다. 황충기,『기생 시조와 한시』, 푸른 사상, 2004
이처럼 ‘계랑’도 전북 부안의 유명한 명기 중 하나였던 것이다.
기녀들의 노래는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사랑과 이별, 그리고 기다림의 주제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여성들의 실생활의 고통이나 사회적 구속, 혹은 차별에 대한 인식은 외면한 채 손쉽게 애정 세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원,『한국 고전시가의 내면 미학』, 신구문화사, 2001
그래서 김영수 김영수,『조선시가 연구』, 새문사,2004
는 절절한 감정보다는 절제를 통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지난날의 추억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별한 슬픔의 정도는 신분과는 상관없는, 즉 기생이라는 신분을 떠나 ‘이별한 여성’의 일반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시조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경우,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노래 전체에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시이다. 실제로 이 시조에는 계랑이 사랑했던 사람이 오랜 동안 소식이 없자 시조를 지어 노래하였으며 또한 그 후에 사랑하던 사람인 유희경(劉希慶 : 1545~1636)이 상경 후 소식이 없자 이 노래를 짓고 수절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더 자세히 내용을 분석하자면 시적화자는 어느 봄날에 비처럼 내리는 배꽃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임과 눈물이 날 정도의 가슴 아픈 이별을 한다. 사랑을 하고 이별한 후의 아픈 상처는 치유되기 힘든 것이고 그리움의 마음과 슬픔은 커져만 간다. 시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 되어도 떨어지는 낙엽에 헤어진 그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의 변화가 있어도 여전히 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부분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조사 ‘도’이다. 그리운 임을 먼저 떠올린 것은 시적 화자 자신일 것이고 ‘그 사람도 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 혹은 바람일 것이다. 어찌 할 수 없어 울며 잡고 이별한 임이지만 시간이 흘러 추풍낙엽이 질 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만큼 그도 나를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녀 자신은 추억에 휩싸여 있다. 특히 종장에서는 ‘외로움’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천리라는 시어를 통해 떨어져 있는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조에서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이다. 아마 여기에서의 꿈은 사랑하는 임인 유희경이 나타난 꿈이었을 것이며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임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부풀어 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 시조의 화자이자 작자인 계랑은 꿈에 나타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간절히 그리고 있는 것이다.
(2) 안분지족 (安分之足)
<청구영언 319 - 한호>
집 方席 내지 마라 落葉넨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도다온다
아야 濁酒山菜 만졍 업다 말고 내여라
짚방석 내지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아해야 탁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청구영언 370 - 송순>
十年을 經營여 草廬 三間 지여 내니
나 간 간에 淸風 간 맛져두고
江山은 들일 듸 업스니 둘러두고 보리라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청구영언 323 - 김굉필>
삿갓세 되롱이 닙고 細雨中에 호
또한 가객을 포함하는 담당층에 대한 논의가 사설시조의 창작 문제와 관련을 맺으면서 치밀하게 전개되었다. 논의에 쟁점은 사설시조를 17~18세기에 주도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한 집단이 중간계층인지 아니면 사대부인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전자의 입장에선 고미숙 고미숙,「사설시조의 역사적 성격과 그 계급적 기반 분석」,『어문논집』,1991
과 강명관 강명관,「사설시조의 향유층에 대하여」,『민족문학사연구』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3
은 사설시조는 부농, 역관, 상인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중간 계급의 물질적, 이론적 지원 위에 그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향유되었다고 보았다.
그와는 반대로 김학성 김학성,「사설시조의 담당층」,『성균어문연구』29집, 성균관대 국어국문학회, 1993
은 후자의 입장에서 18세기에도 역시 사설시조를 주도적으로 창작하고 향유한 계층은 사대부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18세기 이전에도 사대부들은 사설시조를 창작했고 그들의 가악 풍류 생활에서 사설시조와 같은 성격의 노래가 자연스럽게 실연되었다고 주장한다.
Ⅱ. 작품 분석
1. 시조의 이해와 감상
(1) 이별의 정한
<청구영언 367 - 계랑>
梨花雨 흣릴 제 울며 잡고 離別 님
秋風落葉에 저도 날 각가
千里에 외로온 만 오락가락 노매
이화우 흩뿌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이 시조는 호가 ‘매창’이라 익히 알려진 계랑의 시조이다. 계랑은 가창과 거문고 실력이 매우 뛰어나 그에 대한 기록은 허균과 이수광 등의 글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또한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매창집』이라고 하는 문집도 간행되어 전해지고 있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기생의 역할은 다양했으니, 우선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여악을 위해 기생을 두어 내연에서 연회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악이 필요했으며, 내연은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행하였다. 또 지방의 여러 군(郡)에 명하여 기녀를 뽑아 올려 악원(樂院)에 예속시켜 노래와 춤을 익히도록 하였다. 태종조에는 의녀 제도를 만들어 부인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였고, 지방의 관비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영리한 자를 뽑아 어려 침구술을 익혀 내의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업(妓業)을 겸행시켰기 때문에 이들을 약방기생이라 불렀고, 침비는 상의사 소속으로 의녀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겸행하였다. 황충기,『기생 시조와 한시』, 푸른 사상, 2004
이처럼 ‘계랑’도 전북 부안의 유명한 명기 중 하나였던 것이다.
기녀들의 노래는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사랑과 이별, 그리고 기다림의 주제가 주종을 이루는데 이는 여성들의 실생활의 고통이나 사회적 구속, 혹은 차별에 대한 인식은 외면한 채 손쉽게 애정 세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혜원,『한국 고전시가의 내면 미학』, 신구문화사, 2001
그래서 김영수 김영수,『조선시가 연구』, 새문사,2004
는 절절한 감정보다는 절제를 통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지난날의 추억에 안주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별한 슬픔의 정도는 신분과는 상관없는, 즉 기생이라는 신분을 떠나 ‘이별한 여성’의 일반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 시조는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경우,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노래 전체에 나타남을 볼 수 있는 시이다. 실제로 이 시조에는 계랑이 사랑했던 사람이 오랜 동안 소식이 없자 시조를 지어 노래하였으며 또한 그 후에 사랑하던 사람인 유희경(劉希慶 : 1545~1636)이 상경 후 소식이 없자 이 노래를 짓고 수절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더 자세히 내용을 분석하자면 시적화자는 어느 봄날에 비처럼 내리는 배꽃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임과 눈물이 날 정도의 가슴 아픈 이별을 한다. 사랑을 하고 이별한 후의 아픈 상처는 치유되기 힘든 것이고 그리움의 마음과 슬픔은 커져만 간다. 시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 되어도 떨어지는 낙엽에 헤어진 그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고 계절의 변화가 있어도 여전히 임을 잊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부분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조사 ‘도’이다. 그리운 임을 먼저 떠올린 것은 시적 화자 자신일 것이고 ‘그 사람도 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 혹은 바람일 것이다. 어찌 할 수 없어 울며 잡고 이별한 임이지만 시간이 흘러 추풍낙엽이 질 때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그리워하는 만큼 그도 나를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그녀 자신은 추억에 휩싸여 있다. 특히 종장에서는 ‘외로움’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로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천리라는 시어를 통해 떨어져 있는 임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조에서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이다. 아마 여기에서의 꿈은 사랑하는 임인 유희경이 나타난 꿈이었을 것이며 그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임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부풀어 오를 것이다. 따라서 이 시조의 화자이자 작자인 계랑은 꿈에 나타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임을 간절히 그리고 있는 것이다.
(2) 안분지족 (安分之足)
<청구영언 319 - 한호>
집 方席 내지 마라 落葉넨들 못 안즈랴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 도다온다
아야 濁酒山菜 만졍 업다 말고 내여라
짚방석 내지마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
솔불 켜지마라 어제 진 달 돋아온다
아해야 탁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청구영언 370 - 송순>
十年을 經營여 草廬 三間 지여 내니
나 간 간에 淸風 간 맛져두고
江山은 들일 듸 업스니 둘러두고 보리라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청구영언 323 - 김굉필>
삿갓세 되롱이 닙고 細雨中에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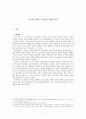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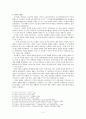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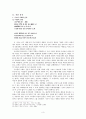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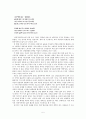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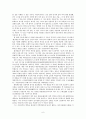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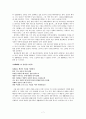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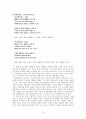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