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Ⅱ. 버클리
1. 생애
2. 사상
Ⅲ. 흄
1. 생 애
2. 사 상
1. 생애
2. 사상
Ⅲ. 흄
1. 생 애
2. 사 상
본문내용
문제). Hume은 인과성을 상상력을 통해 설명하며, 더 나아가 18세기 철학의 근본 문제들(외부 세계는 실재하는가, 정신은 물질적인가, 자아는 자기동일적인가 등등)도 상상력을 토대로 해명하려 한다.
Hume의 결론은 실체, 마음, 인과성을 모두 논리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즉 단지 custom에 의해 생긴 상상력의 소산으로만 보는 것이다. Hume은 실체, 마음, 인과성 등을 믿는 철학을 ‘독단론’(Dogmatism)이라고 보고, 독단론이 서로 화해될 수 없는 두 원리(자연적인 믿음과 철학적 반성)를 결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Hume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경계와 토대를 허무는 혁명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근대를 넘어서는 탈(脫)근대적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 g. 독단론자들(dogmatists)은 색이나 맛 등은 물체에 객관적으로 속하지 않는 주관적 성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색, 맛 등의 기계적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독단론자들이 일상적 믿음을 비판하면서 그 믿음이 물체와 성질을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외부 세계의 실재를 철학적으로 정초(定礎)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Hume이 보기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야말로 일상적 믿음인 것이다.
3) 종교 비판
* Hume에 의하면 철학(그때까지의 전통 철학)은 무의식적 믿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쓸모 없는 상부구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자연 종교(Natural Religion)의 전제가 되고 있던 정신의 비물질성(非物質性)과 자아의 자기동일성 등도 비판될 수 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에 호소하여 종교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의 산물일 뿐이다(기독교와 다른 여러 종교가 알려지기 전에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입장이었다). 또 정신의 비물질성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부르든, 모든 것을 정신이라고 부르든 그 어느 쪽도 종교에 해가 되거나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Spinoza나 Berkeley나 단 하나의 실체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또 물체의 identity를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자아(self) 또한 자기동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Hume은 당시 유행하던 ‘목적론적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목적론적 신 존재 증명’은 잘못된 비유일 뿐이다. cf. ‘위대한 시계공(Great Clock-Maker)’의 비유.
* 결국 Hume은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믿음을 철학적 반성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거부했다. 그러나 “Skepticism is for rare moments of reflection, Belief for a whole lifetime”. 그렇다고 해서 Hume이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 속에서도 영원하고 보편적인 원리(e. g. 인과성 등)가 있는 반면에, 불규칙적이고 변하기 쉬운 원리도 있다. 실정 종교의 많은 교리들은 이러한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상상에 기초한 것이다.
e. g. 외부 세계의 사물에 대한 믿음과 귀신에 대한 믿음의 비교: 전자는 그것이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후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것이기는 하나 정당하지는 않다.
이어서 Hume은 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에서 종교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교적 믿음에서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결국 실천적 입장에서는 보수주의자였던 Hume은 최종적으로 종교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4) 윤리학과 정치
* 윤리 문제에 대한 Hume의 기본 입장: 인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합리주의(ethical rationalism) 윤리적 합리주의는 도덕적 관계들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덕(德)이란 이성에 따라 판별된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한다.
를 거부하고 믿음(belief)과 감정(sentiment)에 호소하는 것--- ‘moral sentimentalism’.
Hume은 본래 모든 도덕적 원리가 ‘도덕감’(moral sentiment) Hume의 친구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글래스고우 대학에 재직할 때 Theory of Moral Sentiment(1759)이라는 책을 썼다.
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여기서도 그것이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극단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취하지는 않는다.
Hume에 따르면 덕(德)이란 그 행위를 보는 사람에게 쾌감(pleasure)과 시인(是認, approval)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처럼 도덕적인 행위를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을 도덕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도덕감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사회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즉 관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 비판: 만일 그렇다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도덕 원리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Hume은 물론 구체적인 원리들이 달라지지만 중요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e. g. 성실성, 용기 등등)는 언제나 일치한다고 답변. 또 Hume은 계속해서 상상력과 감정이 보편성, 통합, 진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함으로써 경험론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 경험을 통해 얻어진 건전한 합리성의 인정.
* 정치적 견해: 당시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던 Whig당에 반대. Locke의 자유주의(liberalism)에도 반대하여 사회 계약에 의한 정부를 부정했다. 한편 그는 귀족을 대변하던 Tory당에도 반대하고 왕권의 절대성에도 반대했다. 그는 정부의 정당성을 그 기원(origin)에서 찾지 않고 현실적인 사회적 유용성, 즉 공리(公利/功利; utility)에서 찾는다. 따라서 정부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은 불가하지만, 사회에 해가 되는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모든 것을 관습과 사실의 문제로 봄으로써, 실천의 영역에서는 현존하는 세계와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함.
Hume의 결론은 실체, 마음, 인과성을 모두 논리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 즉 단지 custom에 의해 생긴 상상력의 소산으로만 보는 것이다. Hume은 실체, 마음, 인과성 등을 믿는 철학을 ‘독단론’(Dogmatism)이라고 보고, 독단론이 서로 화해될 수 없는 두 원리(자연적인 믿음과 철학적 반성)를 결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런 점에서 Hume의 철학은 근대 철학의 경계와 토대를 허무는 혁명적 관점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근대를 넘어서는 탈(脫)근대적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 g. 독단론자들(dogmatists)은 색이나 맛 등은 물체에 객관적으로 속하지 않는 주관적 성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색, 맛 등의 기계적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독단론자들이 일상적 믿음을 비판하면서 그 믿음이 물체와 성질을 분리시키지 않음으로써 외부 세계의 실재를 철학적으로 정초(定礎)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Hume이 보기에는 이러한 생각 자체야말로 일상적 믿음인 것이다.
3) 종교 비판
* Hume에 의하면 철학(그때까지의 전통 철학)은 무의식적 믿음을 토대로 만들어진 쓸모 없는 상부구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시 자연 종교(Natural Religion)의 전제가 되고 있던 정신의 비물질성(非物質性)과 자아의 자기동일성 등도 비판될 수 있다.
자연 종교는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에 호소하여 종교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변화의 산물일 뿐이다(기독교와 다른 여러 종교가 알려지기 전에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입장이었다). 또 정신의 비물질성을 철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부르든, 모든 것을 정신이라고 부르든 그 어느 쪽도 종교에 해가 되거나 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Spinoza나 Berkeley나 단 하나의 실체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또 물체의 identity를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할 수 없듯이 우리의 자아(self) 또한 자기동일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Hume은 당시 유행하던 ‘목적론적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목적론적 신 존재 증명’은 잘못된 비유일 뿐이다. cf. ‘위대한 시계공(Great Clock-Maker)’의 비유.
* 결국 Hume은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믿음을 철학적 반성에 의해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거부했다. 그러나 “Skepticism is for rare moments of reflection, Belief for a whole lifetime”. 그렇다고 해서 Hume이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 속에서도 영원하고 보편적인 원리(e. g. 인과성 등)가 있는 반면에, 불규칙적이고 변하기 쉬운 원리도 있다. 실정 종교의 많은 교리들은 이러한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상상에 기초한 것이다.
e. g. 외부 세계의 사물에 대한 믿음과 귀신에 대한 믿음의 비교: 전자는 그것이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후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자연적인 것이기는 하나 정당하지는 않다.
이어서 Hume은 The Natural History of Religion에서 종교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종교적 믿음에서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 결국 실천적 입장에서는 보수주의자였던 Hume은 최종적으로 종교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4) 윤리학과 정치
* 윤리 문제에 대한 Hume의 기본 입장: 인식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합리주의(ethical rationalism) 윤리적 합리주의는 도덕적 관계들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덕(德)이란 이성에 따라 판별된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입장을 말한다.
를 거부하고 믿음(belief)과 감정(sentiment)에 호소하는 것--- ‘moral sentimentalism’.
Hume은 본래 모든 도덕적 원리가 ‘도덕감’(moral sentiment) Hume의 친구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글래스고우 대학에 재직할 때 Theory of Moral Sentiment(1759)이라는 책을 썼다.
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여기서도 그것이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극단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취하지는 않는다.
Hume에 따르면 덕(德)이란 그 행위를 보는 사람에게 쾌감(pleasure)과 시인(是認, approval)의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다. 이처럼 도덕적인 행위를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을 도덕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도덕감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사회와 관련되어야만 한다. 즉 관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 비판: 만일 그렇다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도덕 원리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Hume은 물론 구체적인 원리들이 달라지지만 중요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e. g. 성실성, 용기 등등)는 언제나 일치한다고 답변. 또 Hume은 계속해서 상상력과 감정이 보편성, 통합, 진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주장함으로써 경험론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 경험을 통해 얻어진 건전한 합리성의 인정.
* 정치적 견해: 당시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지를 대변하던 Whig당에 반대. Locke의 자유주의(liberalism)에도 반대하여 사회 계약에 의한 정부를 부정했다. 한편 그는 귀족을 대변하던 Tory당에도 반대하고 왕권의 절대성에도 반대했다. 그는 정부의 정당성을 그 기원(origin)에서 찾지 않고 현실적인 사회적 유용성, 즉 공리(公利/功利; utility)에서 찾는다. 따라서 정부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은 불가하지만, 사회에 해가 되는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모든 것을 관습과 사실의 문제로 봄으로써, 실천의 영역에서는 현존하는 세계와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함.
추천자료
 사르트르의 생애와 작품 세계
사르트르의 생애와 작품 세계 국사과 7차 교육과정(6차 포함)
국사과 7차 교육과정(6차 포함) 실존주의적 치료 접근
실존주의적 치료 접근 밀의 자유론을 통해서 본 자유주의
밀의 자유론을 통해서 본 자유주의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보나벤투라에 대해서,.. 스트롱 프로그램과 행위자 연결망 이론
스트롱 프로그램과 행위자 연결망 이론 서양의 고대/중세과학과 구분되는 17C 근대과학의 특징
서양의 고대/중세과학과 구분되는 17C 근대과학의 특징 서양사학사 -19세기에 출현한 학파들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에 관해.
서양사학사 -19세기에 출현한 학파들의 특징과 사회적 배경에 관해. 마르크스의 종교이론과 한국의 종교
마르크스의 종교이론과 한국의 종교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중국의역사][고대의 중국역사][춘추전국시대의 국가][진한제국 분석]춘추전국시대와 진&...
[중국의역사][고대의 중국역사][춘추전국시대의 국가][진한제국 분석]춘추전국시대와 진&... 바로크시대의 기독교 교육
바로크시대의 기독교 교육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기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심리, 클라이언트의 환경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기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심리, 클라이언트의 환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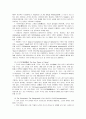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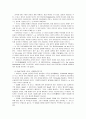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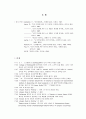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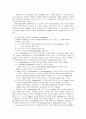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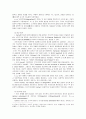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