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혼돈된 시각
Ⅱ.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 분석
Ⅲ. 대북지원의 방향
Ⅱ. 북한의 식량위기 실태 분석
Ⅲ. 대북지원의 방향
본문내용
18
2
출처 :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1948년판』, I-239.
김운근·성명환(1996), p.41.
(5) 북한의 곡물수급상황 추이
<표 7>은 농촌진흥청과 FAO 추계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수치들은 북한의 주식용 곡물인 쌀과 옥수수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타작물과 개인농 형태로 수확된 생산량을 제외한 것이다. 식량안보용 비축곡물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94년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바닥난 것으로 추정한다.
<표 7> 북한의 곡물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정곡 기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년 생산량
548.2
481.2
442.7
426.8
388.4
412.5
345.0
299.5
수입량
59.6
129.0
83.0
109.0
36.0
89.3
113.2
북한당국은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곡물 생산량을 파악하여 양곡년도, 즉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식량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곡물수확이 저조했다면 배급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당국은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순식용 수요를 495만톤에서 369만톤으로 낮추었으며, 용도별 곡물수요 구성도 1960년대 남한의 형태에서 1943/44년 조선에 가까운 형태로 바꿔나갔을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이 1990년초부터 식량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여 그때부터 순식용 수요를 한계수준인 369만톤으로 낮췄다면 상당한 규모의 곡물을 비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곡물섭취량이 최소한 1962년의 남한 수준은 되어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양인 439만톤 정도의 순식용 곡물과 171만톤 정도의 기타용도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한 북한은 외화난에 시달리며 농약·비료의 부족으로 곡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했고, 자연재해로 농업의 하부구조가 손상되는 불운도 겪었다.
1996년에 들어 궁지에 몰린 북한당국은 일반주민에게 춘궁기 동안 하루 1인당 200그램 정도로 감량배급하고 감자와 풋옥수수를 배급식량으로 긴급투입했으며, 추수 직후에야 배급량을 500그램 정도까지 높여 주민들이 그동안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영양분을 보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했다. 일반주민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중단을 중단한 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나무껍질까지 빻아 먹고 있는 형편이다.
) 김정일이 1996년 12월 7일의 연설에서 식량문제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 것도 정치적인 무정부상태를 우려했다기보다는 사회주의 배급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 pp.306-317.
<표 8> 1997년의 북한 곡물수급상황 예측
만톤
비고
1996년의 곡물 생산량
299.5
이미 소비한 풋옥수수 116만톤 제외
순식용외 수요량
60.0
전체의 20%로 추정
협동농장원 결산분배량
55.0
1인당 90∼130kg (500만명), 1일당 301g
국영농장원 배급량
33.0
협동농장원과 같은 기준 적용 (300만명)
평양거주자 등 특수계층 배급량
98.6
1인 1일당 450g (600만명) ※ 군인 700g
일반주민에게 남는 몫
52.9
1인 1일당 181g에 해당 (800만명)
Ⅲ. 대북지원의 방향
이제 북한은 외부의 도움없이는 현재의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김일성 기념궁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노선의 전환이 없는 한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이고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이다.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도 않은 정권이 \'개과천선\'하기 전까지는 주민이 고통을 겪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정책이다.
또, 북한의 식량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면 북한에서 식량폭동이라도 나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폭동이 나려면 가시적인 불평등과 부패가 만연하여 주민들을 자극해야 할 텐데 지금 북한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주민 모두가 \'고난의 행군\'을 함께 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은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내부결속을 다지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막고 있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군량미 문제 때문에 대북지원을 유보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비축미는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보이며 순수한 의미의 군량미는 상대적으로 소량에 불과하므로 군량미를 풀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당국에게 무기수입 등 군사비 중 경화를 사용하는 부분을 줄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안보차원에서도 훨씬 더 논리적일 것이다. 만약 지원식량의 군량미 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우선 배급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기간이 짧은 옥수수 가루 형태로 식량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1995년 여름처럼 아무런 감시장치도 확보하지 못한채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한내 실용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의 소규모 긴급지원은 북한정권의 정책노선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규모 경협 사업은 이와 분리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출처 :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1948년판』, I-239.
김운근·성명환(1996), p.41.
(5) 북한의 곡물수급상황 추이
<표 7>은 농촌진흥청과 FAO 추계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곡물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수치들은 북한의 주식용 곡물인 쌀과 옥수수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타작물과 개인농 형태로 수확된 생산량을 제외한 것이다. 식량안보용 비축곡물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1994년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바닥난 것으로 추정한다.
<표 7> 북한의 곡물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정곡 기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년 생산량
548.2
481.2
442.7
426.8
388.4
412.5
345.0
299.5
수입량
59.6
129.0
83.0
109.0
36.0
89.3
113.2
북한당국은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곡물 생산량을 파악하여 양곡년도, 즉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의 식량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만약 곡물수확이 저조했다면 배급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대처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당국은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순식용 수요를 495만톤에서 369만톤으로 낮추었으며, 용도별 곡물수요 구성도 1960년대 남한의 형태에서 1943/44년 조선에 가까운 형태로 바꿔나갔을 것이다.
물론, 북한당국이 1990년초부터 식량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여 그때부터 순식용 수요를 한계수준인 369만톤으로 낮췄다면 상당한 규모의 곡물을 비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곡물섭취량이 최소한 1962년의 남한 수준은 되어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양인 439만톤 정도의 순식용 곡물과 171만톤 정도의 기타용도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한 북한은 외화난에 시달리며 농약·비료의 부족으로 곡물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했고, 자연재해로 농업의 하부구조가 손상되는 불운도 겪었다.
1996년에 들어 궁지에 몰린 북한당국은 일반주민에게 춘궁기 동안 하루 1인당 200그램 정도로 감량배급하고 감자와 풋옥수수를 배급식량으로 긴급투입했으며, 추수 직후에야 배급량을 500그램 정도까지 높여 주민들이 그동안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영양분을 보충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했다. 일반주민들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중단을 중단한 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서고 있고 나무껍질까지 빻아 먹고 있는 형편이다.
) 김정일이 1996년 12월 7일의 연설에서 식량문제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 것도 정치적인 무정부상태를 우려했다기보다는 사회주의 배급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 (1997년 4월), pp.306-317.
<표 8> 1997년의 북한 곡물수급상황 예측
만톤
비고
1996년의 곡물 생산량
299.5
이미 소비한 풋옥수수 116만톤 제외
순식용외 수요량
60.0
전체의 20%로 추정
협동농장원 결산분배량
55.0
1인당 90∼130kg (500만명), 1일당 301g
국영농장원 배급량
33.0
협동농장원과 같은 기준 적용 (300만명)
평양거주자 등 특수계층 배급량
98.6
1인 1일당 450g (600만명) ※ 군인 700g
일반주민에게 남는 몫
52.9
1인 1일당 181g에 해당 (800만명)
Ⅲ. 대북지원의 방향
이제 북한은 외부의 도움없이는 현재의 식량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김일성 기념궁을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노선의 전환이 없는 한 북한을 돕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이고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정권이다.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되지도 않은 정권이 \'개과천선\'하기 전까지는 주민이 고통을 겪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정책이다.
또, 북한의 식량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면 북한에서 식량폭동이라도 나서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폭동이 나려면 가시적인 불평등과 부패가 만연하여 주민들을 자극해야 할 텐데 지금 북한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주민 모두가 \'고난의 행군\'을 함께 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정권은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내부결속을 다지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막고 있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의 허구성을 폭로할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군량미 문제 때문에 대북지원을 유보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비축미는 거의 바닥이 난 것으로 보이며 순수한 의미의 군량미는 상대적으로 소량에 불과하므로 군량미를 풀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북한당국에게 무기수입 등 군사비 중 경화를 사용하는 부분을 줄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안보차원에서도 훨씬 더 논리적일 것이다. 만약 지원식량의 군량미 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우선 배급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존기간이 짧은 옥수수 가루 형태로 식량을 지원하면 될 것이다. 이에 반해 1995년 여름처럼 아무런 감시장치도 확보하지 못한채 북한에 쌀을 지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북한내 실용주의 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대북 식량지원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의 소규모 긴급지원은 북한정권의 정책노선과 상관없이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규모 경협 사업은 이와 분리해서 북한정권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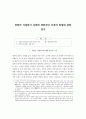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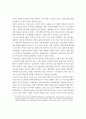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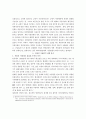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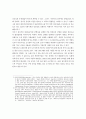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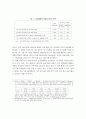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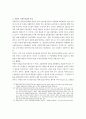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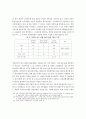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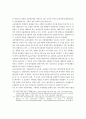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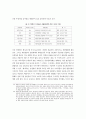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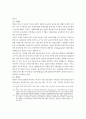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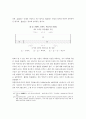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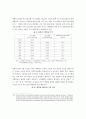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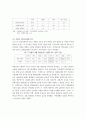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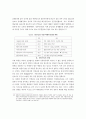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