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라통일 이후 불교철학
2. 원효의 생애
3. 『대승기신론소』
4. 원효의 ‘일심(一心)’철학
5. 원효의 화쟁철학
6.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2. 원효의 생애
3. 『대승기신론소』
4. 원효의 ‘일심(一心)’철학
5. 원효의 화쟁철학
6.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본문내용
으로 간주했다. 불교에 있어서의 화(和)의 원리는 이처럼 실천원리를 중시하는 석가모니에서 그 싹이 나타난 셈이고 이는 대중교화에 뜻을 두어 진속일여를 주장한 대승불교 후기에까지 면면히 이어진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 이후 1200여 년 만에 신라통일기에 나타난 기치를 높이 든 것은 바로 석가모니 이후 대승에 이르기까지의 화의 정신의 시대적 재현 또는 재창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효가 화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것은 신라에 들어온 불교 이론들이 매우 다양하여 논쟁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론들을 배척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이론적인 상호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 화쟁의 방법이다. 화쟁의 대상은 그의 시대에 나타난 모든 불교 이론들이며, 논리적 근거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일심(一心)에 두었다. 또한 화쟁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이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원효에 따르면 진리를 전달하고자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와 진리가 고정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다만 진리의 전달 도구로 사용할 뿐이므로, 이러한 언어의 도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언어의 이중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원효는 극단을 버리고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하며, 경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구체적인 화쟁을 전개했다. 우선적인 화쟁의 방법은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부정을 통하여 집착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만으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 자체에 집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여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떠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긍정과 부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는 불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이다. 어느 한 가지의 경전에 집착하지 않고 두루 불경의 내용을 이해하여 폭넓은 시각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화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저술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다. 이 문헌은 원래 10가지 주제에 대한 화쟁을 담고 있었으나 현재는 공(空)과 유(有), 불성(佛性)의 유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만 남아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후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화엄종(華嚴宗)을 집대성한 법장(法藏)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제자인 징관(澄觀)도 원효를 높이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의천(義天)과 지눌(知訥)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모두 원효를 높이 평가하고 숭앙했으며, 당시 대립적인 위치에 있던 선(禪)과 교(敎)를 회통시키기 위해 의천은 교관병수(敎觀幷修)를,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함으로써 화쟁정신을 이어갔다. 이처럼 화쟁사상은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적인 사상으로 확립되었으며, 이 영향 아래 조선시대에는 함허(涵虛)와 휴정(休靜)의 삼교조화론(三敎調和論)으로 발전했다.
6.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신라 승려 원효(元曉:617~686)가 불교의 여러 이론(異論)을 10문(門)으로 분류·정리한 책. 2권 1책. 목판본. 원문은 2권이었으나 지금은 상권 9·10·15·16의 4장과 불분명한 1장만 해인사에 남아 있으며, 최범술(崔凡述)·이종익(李鍾益) 등이 원효의 다른 저술에서 발췌·정리했다. 이 책은 제종문(諸宗門)의 이론(異論)을 모아 분류하고 난구(難句)·이설(異說)을 모아 정리하여 여러 이론과 논쟁점을 10문으로 나누어 지양·화해시킨다는 것으로, 그의 화쟁사상의 핵심적인 저술이다. 원효는 여러 학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쟁론이 일어나며, 이러한 쟁론은 각각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림으로써 지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일승불교(一乘佛敎) 건설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제1문 삼승일승화쟁문(三乘一乘和諍門)은 화쟁의 출발에 해당한다. 삼승[三乘: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보살승(菩薩乘)]이 일불승(一佛乘)이며, 무량승(無量乘)이 모두 일승이라 하여, 일체불법(一切佛法)이 곧 일불승이라는 화쟁에 의한 제종문(諸宗門)의 회통사상(會通思想)을 전개하고 있다. 제2문 공유이집화쟁문(空有異執和諍門)에서 유와 공은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므로 본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님을 변증해나감으로써 인도의 중관학파·유가학파, 중국의 삼론종(三論宗)과 자은법상종(慈恩法相宗)의 주요쟁점이 되어온 공과 유의 대립을 화해시켰다. 제3문 불성유무화쟁문(佛性有無和諍門)에서는“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모두 마땅히 성불할 수 있다”는 열반경의 설에 기초하여, 무성중생(無性衆生)의 불성불을 주장하는 이집(異執)을 타파했다. 제4문 인법이집화쟁문(人法異執和諍門)에서는 인계와 법계에 대한 불교계의 쟁점에 대해 중도(中道)의 원리로써 논쟁을 화쟁했다. 제5문 삼성이의화쟁문(三性異義和諍門)은 변계소집성(邊計所執性)·의타기성(依他起性)·원성실성(圓成實性)의 삼성(三性)에 대한 이론(異論)을 화쟁한 것이다. 제6문 진속이의화쟁문(眞俗異義和諍門)에서 공유(空有)의 이론(異論)과 함께 이제(二諦), 즉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에 대한 이론(異論)을 화쟁시켰다. 제7문 이장이의화쟁문(二障異義和諍門)에서 원효는 이장의(二障義)를 지어서 소지장(所智障: 智障)과 번뇌장(煩惱障:惑障)에 대한 여러 주장을 은밀의(隱密義)와 현료의(顯了義)로 판정함으로써 해결했다. 제8문 열반이의화쟁문(涅槃異義和諍門)에서는 열반에 대한 제종문의 이론을 화쟁시켜 열반의 올바른 뜻을 드러내고 있다. 제9문 불신이의화쟁문(佛身異義和諍門)에서는 불신의 상과 무상의 이론을 화쟁시켰으며, 제10문 불성이의화쟁문(佛性異義和諍門)에서는 불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회통시켰다. 결국 원효는 이 책을 통해‘백가의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해시켜 일미의 법해로 돌아가게 한다’는 화쟁사상을 천명했다.
원효가 화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것은 신라에 들어온 불교 이론들이 매우 다양하여 논쟁이 격심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론가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론들을 배척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이론적인 상호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한 것이 화쟁의 방법이다. 화쟁의 대상은 그의 시대에 나타난 모든 불교 이론들이며, 논리적 근거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일심(一心)에 두었다. 또한 화쟁은 언어적으로 표현된 이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원효에 따르면 진리를 전달하고자 언어를 사용하지만 언어와 진리가 고정적이고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다만 진리의 전달 도구로 사용할 뿐이므로, 이러한 언어의 도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진리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언어의 이중적인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하나의 이론에 집착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원효는 극단을 버리고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로 하며, 경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구체적인 화쟁을 전개했다. 우선적인 화쟁의 방법은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고 부정을 통하여 집착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만으로 집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 자체에 집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정의 부정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하여 긍정과 부정의 극단을 떠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긍정과 부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는 불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이다. 어느 한 가지의 경전에 집착하지 않고 두루 불경의 내용을 이해하여 폭넓은 시각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견해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화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저술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다. 이 문헌은 원래 10가지 주제에 대한 화쟁을 담고 있었으나 현재는 공(空)과 유(有), 불성(佛性)의 유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만 남아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후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국외적으로는 중국의 화엄종(華嚴宗)을 집대성한 법장(法藏)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제자인 징관(澄觀)도 원효를 높이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의천(義天)과 지눌(知訥)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모두 원효를 높이 평가하고 숭앙했으며, 당시 대립적인 위치에 있던 선(禪)과 교(敎)를 회통시키기 위해 의천은 교관병수(敎觀幷修)를, 지눌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함으로써 화쟁정신을 이어갔다. 이처럼 화쟁사상은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적인 사상으로 확립되었으며, 이 영향 아래 조선시대에는 함허(涵虛)와 휴정(休靜)의 삼교조화론(三敎調和論)으로 발전했다.
6.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신라 승려 원효(元曉:617~686)가 불교의 여러 이론(異論)을 10문(門)으로 분류·정리한 책. 2권 1책. 목판본. 원문은 2권이었으나 지금은 상권 9·10·15·16의 4장과 불분명한 1장만 해인사에 남아 있으며, 최범술(崔凡述)·이종익(李鍾益) 등이 원효의 다른 저술에서 발췌·정리했다. 이 책은 제종문(諸宗門)의 이론(異論)을 모아 분류하고 난구(難句)·이설(異說)을 모아 정리하여 여러 이론과 논쟁점을 10문으로 나누어 지양·화해시킨다는 것으로, 그의 화쟁사상의 핵심적인 저술이다. 원효는 여러 학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쟁론이 일어나며, 이러한 쟁론은 각각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내림으로써 지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일승불교(一乘佛敎) 건설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제1문 삼승일승화쟁문(三乘一乘和諍門)은 화쟁의 출발에 해당한다. 삼승[三乘: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보살승(菩薩乘)]이 일불승(一佛乘)이며, 무량승(無量乘)이 모두 일승이라 하여, 일체불법(一切佛法)이 곧 일불승이라는 화쟁에 의한 제종문(諸宗門)의 회통사상(會通思想)을 전개하고 있다. 제2문 공유이집화쟁문(空有異執和諍門)에서 유와 공은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하므로 본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님을 변증해나감으로써 인도의 중관학파·유가학파, 중국의 삼론종(三論宗)과 자은법상종(慈恩法相宗)의 주요쟁점이 되어온 공과 유의 대립을 화해시켰다. 제3문 불성유무화쟁문(佛性有無和諍門)에서는“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으며 모두 마땅히 성불할 수 있다”는 열반경의 설에 기초하여, 무성중생(無性衆生)의 불성불을 주장하는 이집(異執)을 타파했다. 제4문 인법이집화쟁문(人法異執和諍門)에서는 인계와 법계에 대한 불교계의 쟁점에 대해 중도(中道)의 원리로써 논쟁을 화쟁했다. 제5문 삼성이의화쟁문(三性異義和諍門)은 변계소집성(邊計所執性)·의타기성(依他起性)·원성실성(圓成實性)의 삼성(三性)에 대한 이론(異論)을 화쟁한 것이다. 제6문 진속이의화쟁문(眞俗異義和諍門)에서 공유(空有)의 이론(異論)과 함께 이제(二諦), 즉 진제(眞諦)와 속제(俗諦)에 대한 이론(異論)을 화쟁시켰다. 제7문 이장이의화쟁문(二障異義和諍門)에서 원효는 이장의(二障義)를 지어서 소지장(所智障: 智障)과 번뇌장(煩惱障:惑障)에 대한 여러 주장을 은밀의(隱密義)와 현료의(顯了義)로 판정함으로써 해결했다. 제8문 열반이의화쟁문(涅槃異義和諍門)에서는 열반에 대한 제종문의 이론을 화쟁시켜 열반의 올바른 뜻을 드러내고 있다. 제9문 불신이의화쟁문(佛身異義和諍門)에서는 불신의 상과 무상의 이론을 화쟁시켰으며, 제10문 불성이의화쟁문(佛性異義和諍門)에서는 불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회통시켰다. 결국 원효는 이 책을 통해‘백가의 서로 다른 쟁론을 화해시켜 일미의 법해로 돌아가게 한다’는 화쟁사상을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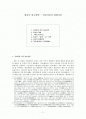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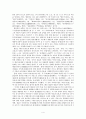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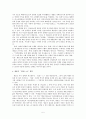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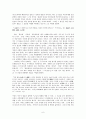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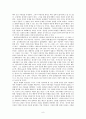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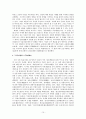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