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기
Ⅱ. 서구 사회에서의 이미지의 흐름
2. 1. 합리주의와 이원론
2. 2. 청각 중심주의와 시각 중심주의
2. 3. 성상 파괴주의의 변화
2. 3. 1. 근원적 성상 파괴주의
2. 3. 2. 초월적 인식의 배제된 성상 파괴주의
2. 4. 성상 숭배의 흐름
Ⅲ. 맺음말
Ⅱ. 서구 사회에서의 이미지의 흐름
2. 1. 합리주의와 이원론
2. 2. 청각 중심주의와 시각 중심주의
2. 3. 성상 파괴주의의 변화
2. 3. 1. 근원적 성상 파괴주의
2. 3. 2. 초월적 인식의 배제된 성상 파괴주의
2. 4. 성상 숭배의 흐름
Ⅲ. 맺음말
본문내용
상징의(象徵意)는 일반적인 기호의 기표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암시한다. 예술가의 창조성은 현상계 내부에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찾는 수준에 뛰어넘어 다른 세계까지 그 의미가 연장되는 상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상징주의에 이르러 현상계의 의미는 가시적인 현상 너머까지 연장된다. 상징주의는 20세기 전반기에 초현실주의로 이어진다. 초현실주의에서 상상력은 현실을 뛰어넘어 보다 완전한 현실에 도달하려고 한다.
Ⅲ. 맺음말
드디어 글쓴이의 여정은 현대의 이미지에 다다른다. 현대가 영상 매체 시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활자 매체 시대를 거쳐 이른 영상 매체 시대를 성상 옹호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 영상 매체 시대는 이미지를 억압했던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의 결과이다. 이미지 파괴주의의 최극단과 그 속에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성상 옹호주의가 만난 것이다. 그런데 성상 옹호주의가 옹호했던 이미지는 성찰과 몽상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인도했었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서 강조했던 이미지들은 인간의 능동적 참여와 창조적 상상력을 유도하는 것들이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이미지이다. 현대의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이미지들에 의해 정보 조작이 가능해졌다. 9.11 테러 이후 미국 TV에 연일 방송되었던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인(人)의 이미지는 전 세계인에게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를 남겼고, 테러와의 전쟁은 합리화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여론은 여론 주체의 가치 판단이나 참여가 아니라 이미지가 가진 힘과 이미지의 전파 기술이 만들어 낸다. 영상 매체 시대는 ‘1984년’이 묘사했던 획일적 가치를 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글쓴이는 이미지 자체가 가진 위험 요소의 탓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지 자체가 지닌 폭발력에 대한 심각한 고려한 없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아니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자본의 논리가 더 큰 문제이다. 자본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진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현대의 인간이 과거의 인간보다 진보했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기술의 진보는 앞선 시대의 인간들이 욕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욕망하게 했다. 이미지를 옹호했던 성상 옹호주의에는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시도했던 흐름이다. 현대의 이미지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오직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모토이다.
Ⅲ. 맺음말
드디어 글쓴이의 여정은 현대의 이미지에 다다른다. 현대가 영상 매체 시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활자 매체 시대를 거쳐 이른 영상 매체 시대를 성상 옹호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 영상 매체 시대는 이미지를 억압했던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의 결과이다. 이미지 파괴주의의 최극단과 그 속에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성상 옹호주의가 만난 것이다. 그런데 성상 옹호주의가 옹호했던 이미지는 성찰과 몽상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인도했었다.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에서 강조했던 이미지들은 인간의 능동적 참여와 창조적 상상력을 유도하는 것들이었다. 이에 비해 현대의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이미지이다. 현대의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이미지들에 의해 정보 조작이 가능해졌다. 9.11 테러 이후 미국 TV에 연일 방송되었던 환호하는 팔레스타인 인(人)의 이미지는 전 세계인에게 그들이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를 남겼고, 테러와의 전쟁은 합리화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여론은 여론 주체의 가치 판단이나 참여가 아니라 이미지가 가진 힘과 이미지의 전파 기술이 만들어 낸다. 영상 매체 시대는 ‘1984년’이 묘사했던 획일적 가치를 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글쓴이는 이미지 자체가 가진 위험 요소의 탓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지 자체가 지닌 폭발력에 대한 심각한 고려한 없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아니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자본의 논리가 더 큰 문제이다. 자본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진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현대의 인간이 과거의 인간보다 진보했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기술의 진보는 앞선 시대의 인간들이 욕망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욕망하게 했다. 이미지를 옹호했던 성상 옹호주의에는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시도했던 흐름이다. 현대의 이미지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오직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모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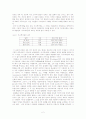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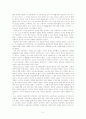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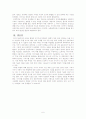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