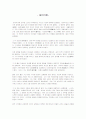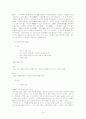본문내용
. 문신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무인세력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1258년(고종 45년) 최의가 문신 유경과 무신 김준 등에 의하여 살해되면서 정권은 일단 국왕에게 돌아가고 몽고에 대한 강화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무인들은 여전히 몽고와의 강화를 내키지 않아 했고, 친몽정책을 한 원종을 폐하기까지 하였으나 이미 몽고의 강력한 간섭을 받고 있을 만큼 외교관계가 진전되어있었다. 몽고의 압력으로 원종은 복위되고, 원종의 요청으로 몽고의 군대가 출동하여 임연과 임유무가 죽은 뒤, 무인정권은 완전히 몰락하였다.
《무신정변의 결과 및 의의( 고려사회의 일대 전환점)》
1. 문벌귀족 사회가 몰락
한뢰(韓賴)를 비롯한 이복기(李復基), 임종식(林宗植)등의 문신관료들과 환관 50여명을 참살한 뒤, 고려의 황도(皇都)인 개경(開京)으로 입성하여 '무릇 문관을 쓴 자는 비록 서리(胥吏)라도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급무관들을 선동하여 고위문신 200여명을 참살하고 의종을 경녕전(慶寧殿)에 유폐시킨다.
황도에서 이러하니, 문벌귀족들은 모두 패망하고 만다.
2. 전시과가 붕괴되고 농장이 확대됨
문벌귀족의 부패도 만연하였지만, 무신들의 집권은 그 정도가 심함이 배를 하였다.
그리하여 정해진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붕괴되고 산과 큰강을 경계로 하는 무신들의 경제적 기반인 농장이 생성되었다. 이는 훗날, 권문세족들에게도 이어진다.
3. 하극상 풍조의 만연으로 신분 질서 동요
무신들에서도 가장 높은 상장군이 정 3품이었다. 이는 곧 재추회의는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국가의 중요한 대사에 참여를 못하였다. 무신정변중 정중부는 그래도 벼슬이 높았지만, 이의민 같은 경우는 가장 천한 천민이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 그리하여 망이 망소이 난 같은 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4. 서방 -> 패관 문학 발달
서방은 최충헌이 무신들의 득세속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자, 그의 아들 최우가 문사들을 위해 설치한 문사기구였다. 서방이 설치되는 것은 정방이 설치되고나서 2년 후인 고종 14년이다. 정방 역시 문사들의 기구로서 양자가 이와 같은 시차를 두고 설치된 것에 대해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일단 최우는 먼저 정방을 설치하여 文士들을 정치적으로 등용하고 뒤에 다시 서방을 설치하여 나머지 인원을 편입시켰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무신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패관문학(고려 때 소설의 모체인 설화를 한문으로 적은 가전체 문학으로, 근대 소설문학의 기원이 되었다. 패관문학으로는 「파한집」「보한집」「백운소설」「역옹패설」등이 대표적 작품이다.)이 발달하였다.
5.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 때문에 조계종 발달
문신 귀족사회의 사상을 뒷바침 해준 것은 의천이 가져온 천태종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무신들도 그들만의 사상이 필요하게 되자 신라 말엽부터 형성된 온 산문산파가 9산으로 이여져 오다가 하나의 종으로 결합되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불교 최대종파가 되었다.
◎ 문신들의 역 쿠데타
ㄱ. 김보당의 난(1173) - 의종 복위를 시도 -> 실패
ㄴ. 조위총의 난(1174) -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 -> 실패, 서북 지방 주민들 대규모 봉기의 계기
- 마치며 -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이 ' 무인시대 '가 존재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려의 무인정권, 특히 최씨정권과 그 시조인 최충헌은 일본 무인정권 어느 시대의 누구와 견줄 수 있을까?
필자는 고려 최씨정권은 일본의 초기 무인정권 평씨( 平氏 )정권에, 그리고 그 최씨정권의 시조인 최충헌은 일본 평씨정권의 시조인 평청성( 平淸盛 )에 견줄 수 있다고 말하겠다. 12세기 중엽 일본에서도 고려와 같이 귀족시대인 평안( 平安 ) 시대가 끝나고 무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인들을 제압하고 무인정권을 세운 자가 바로 평청성이다. 그는 잔인한 공포정치를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귀족들을 기반으로 하여 무인정권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최충헌의 공포정치, 독재체제 구축, 문벌귀족 우대와 유사하다. 평씨정권 역시 최씨정권과 마찬가지로 중앙 귀족계급에 기반을 둔 무인정권이었으며 두 정권 모두 군주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권력을 전횡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나라 무인정권의 역사는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강대한 지방 무사들의 존재로 인하여 평씨정권의 지배는 단기간에 끝난다. 경쟁자인 원뢰조( 源賴朝 )는 평씨정권을 타도하고 집권하여 평씨정권의 단점을 개선해 지방마저 막부체제로 편입시켜 체제의 기틀을 다지고 조정과 막부, 두 정권이 양립하다 결국은 막부가 조정을 압도해 일본 700여 년의 ' 무인시대 '가 열리게 된다.
고려에서도 지방 무신세력은 존재하였지만 일본보다 더욱 중앙집권적이었던 고려에서 지방 무신들의 세력은 미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 유일하게 중앙에 대항했던 지방의 무신세력을 찾아본다면 조위총의 난이 있을 뿐이다. )은 결국 실패하였다. 이러한 지방 무신세력의 부재로 인하여 고려의 최씨정권은 일본 평씨정권보다 오래 지속되었지만 지방을 막부체제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평씨정권처럼 조정에서만 세력을 떨치다 마침내는 자멸하여 무인정권은 귀족들에 의해 흡수되었고 고려의 ' 무인시대 '는 딱 100년으로 막을 내렸다. 문벌귀족과 잔존무신의 결합으로 인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권문세족 계층이다.( 최씨정권이 주로 조정에서만 활동한 이유로 인하여 고려는 일본에 비해 무인정권만의 고유한 특색이 적었다. 우리가 일본 무인정권의 장인 장군(將軍)은 알아도 고려 무인정권의 장인 교정별감(敎定別監)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이리하여 일본 무인정권이 계속 발전을 이루는데 비하여 고려 무인정권은 일본의 초기 무인정권에 해당되는 최씨정권에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를 고려 무인정권이 일본에 비하여 뒤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며 단지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려에서는 다른 체제로 바뀐 무인정권이 일본에서는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아울러 역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무신정변의 결과 및 의의( 고려사회의 일대 전환점)》
1. 문벌귀족 사회가 몰락
한뢰(韓賴)를 비롯한 이복기(李復基), 임종식(林宗植)등의 문신관료들과 환관 50여명을 참살한 뒤, 고려의 황도(皇都)인 개경(開京)으로 입성하여 '무릇 문관을 쓴 자는 비록 서리(胥吏)라도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말라'고 하급무관들을 선동하여 고위문신 200여명을 참살하고 의종을 경녕전(慶寧殿)에 유폐시킨다.
황도에서 이러하니, 문벌귀족들은 모두 패망하고 만다.
2. 전시과가 붕괴되고 농장이 확대됨
문벌귀족의 부패도 만연하였지만, 무신들의 집권은 그 정도가 심함이 배를 하였다.
그리하여 정해진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붕괴되고 산과 큰강을 경계로 하는 무신들의 경제적 기반인 농장이 생성되었다. 이는 훗날, 권문세족들에게도 이어진다.
3. 하극상 풍조의 만연으로 신분 질서 동요
무신들에서도 가장 높은 상장군이 정 3품이었다. 이는 곧 재추회의는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국가의 중요한 대사에 참여를 못하였다. 무신정변중 정중부는 그래도 벼슬이 높았지만, 이의민 같은 경우는 가장 천한 천민이 나라의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 그리하여 망이 망소이 난 같은 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4. 서방 -> 패관 문학 발달
서방은 최충헌이 무신들의 득세속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자, 그의 아들 최우가 문사들을 위해 설치한 문사기구였다. 서방이 설치되는 것은 정방이 설치되고나서 2년 후인 고종 14년이다. 정방 역시 문사들의 기구로서 양자가 이와 같은 시차를 두고 설치된 것에 대해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일단 최우는 먼저 정방을 설치하여 文士들을 정치적으로 등용하고 뒤에 다시 서방을 설치하여 나머지 인원을 편입시켰던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무신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패관문학(고려 때 소설의 모체인 설화를 한문으로 적은 가전체 문학으로, 근대 소설문학의 기원이 되었다. 패관문학으로는 「파한집」「보한집」「백운소설」「역옹패설」등이 대표적 작품이다.)이 발달하였다.
5. 새로운 사상의 필요성 때문에 조계종 발달
문신 귀족사회의 사상을 뒷바침 해준 것은 의천이 가져온 천태종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 무신들도 그들만의 사상이 필요하게 되자 신라 말엽부터 형성된 온 산문산파가 9산으로 이여져 오다가 하나의 종으로 결합되었다.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불교 최대종파가 되었다.
◎ 문신들의 역 쿠데타
ㄱ. 김보당의 난(1173) - 의종 복위를 시도 -> 실패
ㄴ. 조위총의 난(1174) - 서경 유수 조위총의 난 -> 실패, 서북 지방 주민들 대규모 봉기의 계기
- 마치며 -
일본에서도 한국과 같이 ' 무인시대 '가 존재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려의 무인정권, 특히 최씨정권과 그 시조인 최충헌은 일본 무인정권 어느 시대의 누구와 견줄 수 있을까?
필자는 고려 최씨정권은 일본의 초기 무인정권 평씨( 平氏 )정권에, 그리고 그 최씨정권의 시조인 최충헌은 일본 평씨정권의 시조인 평청성( 平淸盛 )에 견줄 수 있다고 말하겠다. 12세기 중엽 일본에서도 고려와 같이 귀족시대인 평안( 平安 ) 시대가 끝나고 무인들이 득세하기 시작했는데 이 무인들을 제압하고 무인정권을 세운 자가 바로 평청성이다. 그는 잔인한 공포정치를 통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귀족들을 기반으로 하여 무인정권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최충헌의 공포정치, 독재체제 구축, 문벌귀족 우대와 유사하다. 평씨정권 역시 최씨정권과 마찬가지로 중앙 귀족계급에 기반을 둔 무인정권이었으며 두 정권 모두 군주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권력을 전횡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두 나라 무인정권의 역사는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다.
일본에서는 강대한 지방 무사들의 존재로 인하여 평씨정권의 지배는 단기간에 끝난다. 경쟁자인 원뢰조( 源賴朝 )는 평씨정권을 타도하고 집권하여 평씨정권의 단점을 개선해 지방마저 막부체제로 편입시켜 체제의 기틀을 다지고 조정과 막부, 두 정권이 양립하다 결국은 막부가 조정을 압도해 일본 700여 년의 ' 무인시대 '가 열리게 된다.
고려에서도 지방 무신세력은 존재하였지만 일본보다 더욱 중앙집권적이었던 고려에서 지방 무신들의 세력은 미약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도전( 유일하게 중앙에 대항했던 지방의 무신세력을 찾아본다면 조위총의 난이 있을 뿐이다. )은 결국 실패하였다. 이러한 지방 무신세력의 부재로 인하여 고려의 최씨정권은 일본 평씨정권보다 오래 지속되었지만 지방을 막부체제로 편입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평씨정권처럼 조정에서만 세력을 떨치다 마침내는 자멸하여 무인정권은 귀족들에 의해 흡수되었고 고려의 ' 무인시대 '는 딱 100년으로 막을 내렸다. 문벌귀족과 잔존무신의 결합으로 인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권문세족 계층이다.( 최씨정권이 주로 조정에서만 활동한 이유로 인하여 고려는 일본에 비해 무인정권만의 고유한 특색이 적었다. 우리가 일본 무인정권의 장인 장군(將軍)은 알아도 고려 무인정권의 장인 교정별감(敎定別監)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
이리하여 일본 무인정권이 계속 발전을 이루는데 비하여 고려 무인정권은 일본의 초기 무인정권에 해당되는 최씨정권에서 더 이상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를 고려 무인정권이 일본에 비하여 뒤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니며 단지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고려에서는 다른 체제로 바뀐 무인정권이 일본에서는 지속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 이 점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아울러 역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