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교의 출현배경
-싯다르타의 불교 탄생 기원전 500년경
-불교탄생과 불교전파과정
-석가와 불교 탄생
-불교의 탄생
-인도 원시불교의 출현
-싯다르타의 불교 탄생 기원전 500년경
-불교탄생과 불교전파과정
-석가와 불교 탄생
-불교의 탄생
-인도 원시불교의 출현
본문내용
色迦王) 계일왕(戒日王) 등이 다스리는 시기였다. 인도가 여러 나라로 분열되면 불교도 따라 쇠퇴하였다. 이러한 현상 역시 원시불교가 정복왕조의 이념에 합치되었음을 방증해 준다.
정복군주였던 아육왕이 불교의 전도나 홍포에 힘을 기울였던 까닭은, 스스로 불법에 의한 정복이 가장 우수한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시불교는 작은 성읍국가가 합쳐져서 중앙집권적 고대 정복국가를 성립시킨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확립되었다. 그것은 소국가 내지 부족 사이의 통합능력을 가졌고, 삼국사회 역시 이러한 성격의 불교를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국가체제가 변화되었다.
*내용 확인 참고문헌<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무렵 기원전 6세기경의 인도 사상계는 매우 복잡하였다. 기존의 바라문 사상에 대해서 사문(沙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대거 출현하여 새로운 우주관, 인생관을 제시하였다.
당시 바라문들은 베다의 종교를 신봉하고 제사를 지냈다. 바라문 사상가들은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어 열(熱)을 일으켜 하늘과 땅을 낳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브라만은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고, 우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바라문 사상을 부정하며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사문(沙門)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집을 떠나서 걸식 생활을 하며 직접 유행기의 생활로 들어간다.
불교 경전에는 당시 이와 같은 사문을 대표하는 여섯 명의 사상가가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도의 정통바라문 사상에서 볼 때 이단(異端)또는 외도(外道)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모두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라문교에 반항하였으며, 신흥 도시의 왕후, 귀족, 부호의 정치적, 경제적 원조아래 활동하였다. 이들을 육사외도라고 한다.
육사외도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선악의 행위는 결과를 가져 오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도덕적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도덕 부정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란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는 숙명적으로 미리 정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혼 따위가 있을 수 없고, 오직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의 네 가지 원소만이 실재한다는 유물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사상가도 있었고,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본능을 극복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수행자도 있었다. 그래서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소유(無所有)를 강조하고 의복까지도 버리고 나체로 수행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바탕으로 불교는 탄생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당대의 사상들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극단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겨내는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복군주였던 아육왕이 불교의 전도나 홍포에 힘을 기울였던 까닭은, 스스로 불법에 의한 정복이 가장 우수한 것임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시불교는 작은 성읍국가가 합쳐져서 중앙집권적 고대 정복국가를 성립시킨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확립되었다. 그것은 소국가 내지 부족 사이의 통합능력을 가졌고, 삼국사회 역시 이러한 성격의 불교를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국가체제가 변화되었다.
*내용 확인 참고문헌<불교입문/조계종출판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무렵 기원전 6세기경의 인도 사상계는 매우 복잡하였다. 기존의 바라문 사상에 대해서 사문(沙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상가들이 대거 출현하여 새로운 우주관, 인생관을 제시하였다.
당시 바라문들은 베다의 종교를 신봉하고 제사를 지냈다. 바라문 사상가들은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어 열(熱)을 일으켜 하늘과 땅을 낳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해 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브라만은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고, 우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바라문 사상을 부정하며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사문(沙門)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집을 떠나서 걸식 생활을 하며 직접 유행기의 생활로 들어간다.
불교 경전에는 당시 이와 같은 사문을 대표하는 여섯 명의 사상가가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도의 정통바라문 사상에서 볼 때 이단(異端)또는 외도(外道)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모두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바라문교에 반항하였으며, 신흥 도시의 왕후, 귀족, 부호의 정치적, 경제적 원조아래 활동하였다. 이들을 육사외도라고 한다.
육사외도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선악의 행위는 결과를 가져 오는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도덕적 결과를 받지 않는다는 도덕 부정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란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는 숙명적으로 미리 정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혼 따위가 있을 수 없고, 오직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의 네 가지 원소만이 실재한다는 유물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사상가도 있었고,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이나 본능을 극복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수행자도 있었다. 그래서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소유(無所有)를 강조하고 의복까지도 버리고 나체로 수행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도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바탕으로 불교는 탄생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당대의 사상들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극단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 겨내는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나 노력의 가치를 부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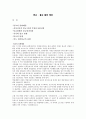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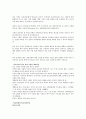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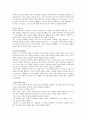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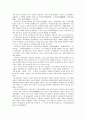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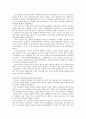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