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언
Ⅱ. 좌선법
Ⅲ. 무시선법
Ⅳ. 좌선과 무시선과의 관계
Ⅴ. 결론
Ⅰ. 서언
Ⅱ. 좌선법
Ⅲ. 무시선법
Ⅳ. 좌선과 무시선과의 관계
Ⅴ. 결론
본문내용
선의 공부법에는 정시의 선과 정처의 선공부도 잘하라는 뜻이 들어 있다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9장.
고 밝힌바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좌선과 무시선 간에는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을까? 좌선이 정공부로서 정시에 한하는 공부라면 무시선은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선법이므로 여기에는 먼저 상호 간에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즉 좌선은 잘 행하므로서 그 힘에 의하여 무시선도 잘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무시선을 잘 행하므로서 안정된 마음으로 좌선을 잘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무시선을 잘 행하므로서 안정된 마음으로 좌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좌선을 잘 하지 못하고서 무시선을 결코 잘 할 수가 없으며, 동정간에 안정된 마음으로 잘 생활하지 못하고 보면 마음이 산란해 지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조용하고 오롯하게 선정에 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경에 「보살은 시끄러운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 『대종경』 수행품 50장.
는 말은 보살을 항상 무시선의 心念으로 살고 있으므로 처소에 구속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외도는 잡념이 끊이지 않으니 설사 조용한 한정처에서는 정에 들었다 해도 마음은 오히려 번잡해지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정의 형으로 볼 때에 좌선이 체적인 선이라면 무시선은 체용을 겸전한 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좌선은 정시에 정 위주 공부이기 때문이요, 무시선은 동정간에 불리자성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 자성은 떠나지 않고 바탕함은 곧 체를 떠나지 않고 이에 바탕함이 되고 생활 속에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은 곧 체에 바탕한 용의 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선은 체용불이의 선공부 생활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좌선은 기본적인 선정이요, 무시선은 활용하여 활불을 지향하는 선정법이며 좌선이 소극적인 선법이라면, 무시선은 적극적인 선법이요, 현대사회에 절실히 요청되는 대중적인 선법이라 하겠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원불교 선법을 고찰하여 보고자, 『원불교사상』 제4집에는 그 (Ⅰ)편을 게재했고, 그 후속으로 본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다.
고찰해 온 바와 같이 좌선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구경에는 그 양성한다는 일심마저도 놓아버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래심, 즉 진여자성 그 자리에 합일되고 그 위력을 얻는 정 공부법이다.
이러한 좌선에 대하여 혜능은 『법보단경』에서 「…외어일체선악경계심염불기명위좌내견자성불동 명위선(外於一切善惡境界心念不起名爲坐內見自性不動 名爲禪)」
) 『육조법보단경』, 교수좌선 제4, 영온사장판, p. 86.
이라 하여 내외간에 안정을 얻고 부동하는 자성을 지켜 나감을 좌와 선으로 구분하여 설파하였고, 대각선사는 좌선론에서 「…일좌좌선일좌불야 일일좌선일일불야 일생좌선 일생불야(一座坐禪一座佛也 一日坐禪一日佛也 一生坐禪 一生佛也)」
) 『國譯禪學大成』 제23권, 국역선학대성편집소, 昭和5년, p.1.
라고까지 하여 좌선을 행하는 시간과 그 처소는 곧 불(佛)이 그곳에 계심과 같고, 만일에 일생을 계속한다면 일생을 자성을 여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므로 곧 일생을 불의 생활을 하게 되고 곧 불이 된다고 설파하였다.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대종사도 좌선을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며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라
) 『정전』 좌선의 요지.
하였으며, 선을 성품을 오득,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 『정전』 무시선법.
라 했고 정산종사는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학」
)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이라고까지 설파해 주심에서 우리는 선의 의의와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선을 닦고 행함에 있어서 좌선이 그 기본이 됨은 사실이나 그 원리를 알고 보면 그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이야말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계를 위하여 아주 적합한 약재요, 처방이라고 본다. 오늘날 특히 서구사회에서 비상한 관심 속에 선이 보급되고 있다 함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인간상실을 체험한 인류는 인간회복을 위하여 이 선법을 찾아 크게 활용하리라고 확신한다.
『원불교사상』 제4집에 게재했던 본 논문 (Ⅰ)편에서 고찰한 재래불교의 좌선에서는 수식법과 수식법, 그리고 간화선과 묵조선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도 천태의 지관법이라든지 혜능의 정혜쌍수 등도 고찰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제한된 지면사정 등으로 다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선의 자세나 방법은 다르다 해도 결국 그 방향이나 구경은 하나이므로 제시한 원리만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한다 해도 충분히 실천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그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천태지의 선사도 「부행자초학좌선 욕수십방삼세불법자 응당선발대서원(夫行者初學坐禪 欲修十方三世佛法者 應當先發大誓願)」
) 大正藏經 제46편, 修習止觀坐禪法要, p.465.
이라고 하여 먼저 대서원이 서 있어야 고난을 참고 선정을 닦아 나갈 수 있음을 교시하고 있다. 이 점은 원불교에서 제시한 좌선법이나 무시선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서원 없이 대신심이 있을 수 없고, 대신심 없이 대실천력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원불교 좌선법은 곧 단전주법이며 무시선법은 종래의 선법에 대하여 혁신적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무시선법을 소태산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 송천은, 「원불교사상의 연구」, p.64.
좌선은 시간이나 처소 등에 구애를 받지마는 무시선은 때와 곳에 구애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선법이므로 대중적인 선법이요, 현대적인 선법이며 미래 지향적인 선법이다. 좀더 깊이 있게 고찰하고 제시해 보고자 했으나 뜻대로 차분히 정리하지 못했으며 막상 쓰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도 간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과 시간사정 등으로 요긴하다고 보는 점을 중심으로 논술했으며, 전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려웠다. 차후 좀 더 면밀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출전 : 『원불교사상』5, 원불교사상연구원, 1981>
)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9장.
고 밝힌바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좌선과 무시선 간에는 어떠한 상호 관계가 있을까? 좌선이 정공부로서 정시에 한하는 공부라면 무시선은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선법이므로 여기에는 먼저 상호 간에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즉 좌선은 잘 행하므로서 그 힘에 의하여 무시선도 잘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무시선을 잘 행하므로서 안정된 마음으로 좌선을 잘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무시선을 잘 행하므로서 안정된 마음으로 좌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좌선을 잘 하지 못하고서 무시선을 결코 잘 할 수가 없으며, 동정간에 안정된 마음으로 잘 생활하지 못하고 보면 마음이 산란해 지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조용하고 오롯하게 선정에 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마경에 「보살은 시끄러운데 있으나 마음은 온전하고, 외도는 조용한 곳에 있으나 마음은 번잡하다.」
) 『대종경』 수행품 50장.
는 말은 보살을 항상 무시선의 心念으로 살고 있으므로 처소에 구속없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외도는 잡념이 끊이지 않으니 설사 조용한 한정처에서는 정에 들었다 해도 마음은 오히려 번잡해지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정의 형으로 볼 때에 좌선이 체적인 선이라면 무시선은 체용을 겸전한 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좌선은 정시에 정 위주 공부이기 때문이요, 무시선은 동정간에 불리자성의 공부이기 때문에 그 자성은 떠나지 않고 바탕함은 곧 체를 떠나지 않고 이에 바탕함이 되고 생활 속에서 자성을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은 곧 체에 바탕한 용의 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무시선은 체용불이의 선공부 생활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좌선은 기본적인 선정이요, 무시선은 활용하여 활불을 지향하는 선정법이며 좌선이 소극적인 선법이라면, 무시선은 적극적인 선법이요, 현대사회에 절실히 요청되는 대중적인 선법이라 하겠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원불교 선법을 고찰하여 보고자, 『원불교사상』 제4집에는 그 (Ⅰ)편을 게재했고, 그 후속으로 본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다.
고찰해 온 바와 같이 좌선은 마음을 일경에 주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구경에는 그 양성한다는 일심마저도 놓아버려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본래심, 즉 진여자성 그 자리에 합일되고 그 위력을 얻는 정 공부법이다.
이러한 좌선에 대하여 혜능은 『법보단경』에서 「…외어일체선악경계심염불기명위좌내견자성불동 명위선(外於一切善惡境界心念不起名爲坐內見自性不動 名爲禪)」
) 『육조법보단경』, 교수좌선 제4, 영온사장판, p. 86.
이라 하여 내외간에 안정을 얻고 부동하는 자성을 지켜 나감을 좌와 선으로 구분하여 설파하였고, 대각선사는 좌선론에서 「…일좌좌선일좌불야 일일좌선일일불야 일생좌선 일생불야(一座坐禪一座佛也 一日坐禪一日佛也 一生坐禪 一生佛也)」
) 『國譯禪學大成』 제23권, 국역선학대성편집소, 昭和5년, p.1.
라고까지 하여 좌선을 행하는 시간과 그 처소는 곧 불(佛)이 그곳에 계심과 같고, 만일에 일생을 계속한다면 일생을 자성을 여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므로 곧 일생을 불의 생활을 하게 되고 곧 불이 된다고 설파하였다.
원불교의 교조 소태산 대종사도 좌선을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며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라
) 『정전』 좌선의 요지.
하였으며, 선을 성품을 오득,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
) 『정전』 무시선법.
라 했고 정산종사는 「선은 마음 허공을 알리며, 마음 허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대학」
)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0장.
이라고까지 설파해 주심에서 우리는 선의 의의와 필요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선을 닦고 행함에 있어서 좌선이 그 기본이 됨은 사실이나 그 원리를 알고 보면 그 형식에 크게 구애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이야말로 인류의 현재와 미래 세계를 위하여 아주 적합한 약재요, 처방이라고 본다. 오늘날 특히 서구사회에서 비상한 관심 속에 선이 보급되고 있다 함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인간상실을 체험한 인류는 인간회복을 위하여 이 선법을 찾아 크게 활용하리라고 확신한다.
『원불교사상』 제4집에 게재했던 본 논문 (Ⅰ)편에서 고찰한 재래불교의 좌선에서는 수식법과 수식법, 그리고 간화선과 묵조선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 밖에도 천태의 지관법이라든지 혜능의 정혜쌍수 등도 고찰할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제한된 지면사정 등으로 다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선의 자세나 방법은 다르다 해도 결국 그 방향이나 구경은 하나이므로 제시한 원리만 분명히 파악하고 이해한다 해도 충분히 실천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그 마음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천태지의 선사도 「부행자초학좌선 욕수십방삼세불법자 응당선발대서원(夫行者初學坐禪 欲修十方三世佛法者 應當先發大誓願)」
) 大正藏經 제46편, 修習止觀坐禪法要, p.465.
이라고 하여 먼저 대서원이 서 있어야 고난을 참고 선정을 닦아 나갈 수 있음을 교시하고 있다. 이 점은 원불교에서 제시한 좌선법이나 무시선법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서원 없이 대신심이 있을 수 없고, 대신심 없이 대실천력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원불교 좌선법은 곧 단전주법이며 무시선법은 종래의 선법에 대하여 혁신적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무시선법을 소태산선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 송천은, 「원불교사상의 연구」, p.64.
좌선은 시간이나 처소 등에 구애를 받지마는 무시선은 때와 곳에 구애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행할 수 있는 선법이므로 대중적인 선법이요, 현대적인 선법이며 미래 지향적인 선법이다. 좀더 깊이 있게 고찰하고 제시해 보고자 했으나 뜻대로 차분히 정리하지 못했으며 막상 쓰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도 간파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과 시간사정 등으로 요긴하다고 보는 점을 중심으로 논술했으며, 전반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려웠다. 차후 좀 더 면밀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출전 : 『원불교사상』5, 원불교사상연구원, 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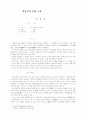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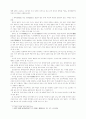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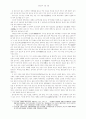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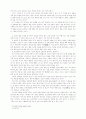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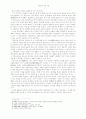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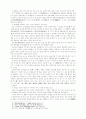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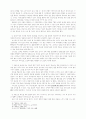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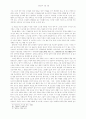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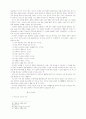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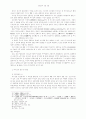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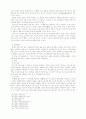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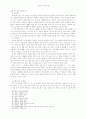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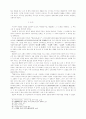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