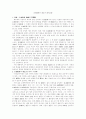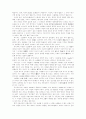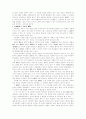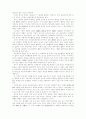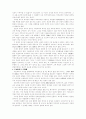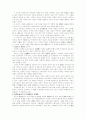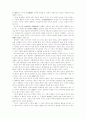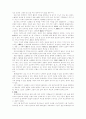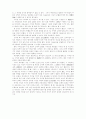목차
1. 序論 : 自由敎育 論議의 問題點
2. 自由敎育의 理念으로서의 ‘스콜라’
3. 自由敎育의 目的과 難點
4. 自由敎育의 自我觀
5. 現代社會에서의 自由敎育의 妥當性
6. 結論
2. 自由敎育의 理念으로서의 ‘스콜라’
3. 自由敎育의 目的과 難點
4. 自由敎育의 自我觀
5. 現代社會에서의 自由敎育의 妥當性
6. 結論
본문내용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개념적 또는 논리적 구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론적 구분이 갖는 현실적 의의는 분명히 일상인들이 주어진 급박한 현실에 安住하는 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世界를 그들의 머리 속에 선명히 부각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현대인이 스콜라의 궁극적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론적 활동과 실제적 활동의 구분이 갖는 의미를 의의있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스콜라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6. 結論
현대사회를 관조적으로 살펴 보면, 일의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현대인들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압도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더구나 가장 이론적 활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현실적 유용성의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자유교육의 목적으로서 보편적 자아를 이야기한다면 시대 착오적인 목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대 사회인들은 자유교육의 이념이 점점 퇴색해간다 해도 그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현실적 무감각 상태가 빚어내는 암담함은 도리어 바로 자유교육의 이념이 부활되어야만 하는 現實的 理由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한 가지를 더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앞의 이유보다 더 根源的이다. 자유교육의 이념이 점차 소멸해 간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人間性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유교육의 가치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 가지게 되는 불만은 현재의 교육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교육의 이념과 현대 사회에서의 그 타당성을 논하고자 했으나, 그것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계를 갖는다. 또, 구체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유교육을 다루지 못했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는 못했지만 자유교육은 반드시 그 구체적 교과교육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자에 와서 자유교육의 이념이 편협한 主知主義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교과과정의 지성의 개발이나 지식의 형식에만 치중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덕성이라든가 미적 감각 등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자유교육을 부활하자는 주장이 현대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 비판은 검토되어야 한다.
흔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은 지식을 백 번 가르치는 것보다 도덕적 습관 한 가지를 형성 시켜주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학생들이 지적 전통은 구태의연한 관습의 다발로 여기고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만을 훌륭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지성의 몰락을 의미한다.
마리땡에 의하면 지성은 본질적으로 의지보다 숭고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한 대로, 지성의 활동은 가장 自足的이고 連續的이며, 플라톤도 욕망이나 의지는 결국 지성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마리땡은 지성 그 자체가 인간성 또는 인격의 전부라고 보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지성이 이르러야 할 세계의 성격에 내재해 있다. 그 實在의 세계는 絶對眞理의 세계, 絶對善의 세계, 絶對美의 세계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성은 그 세계에 도달하는 데 반드시 구비해야 할 가장 훌륭한 통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다. 말하자면 지성은 인간의 意志, 그리고 善에 대한 사랑을 연결시켜 주는 사다리에 비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세계에 대해 二次的이다. 따라서, 사다리로서 지성을 거치지 않고 몰아세울 수 있다면 이르러야 할 절대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보아 이차적 의미를 갖는 지성을 절대시하면서도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교육관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편협한 主知主義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겠다.
하지만 지성과 의지의 문제와 관련해 자유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체의 입장은 주지주의 교육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유교육관을 주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주지주의라고 단정짓기 전에 왜 지성을 강조해야만 했는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겠다. 주지주의라는 비판이 정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성과 의지의 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현대인이 스콜라의 궁극적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론적 활동과 실제적 활동의 구분이 갖는 의미를 의의있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은 스콜라가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6. 結論
현대사회를 관조적으로 살펴 보면, 일의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현대인들의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압도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더구나 가장 이론적 활동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현실적 유용성의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자유교육의 목적으로서 보편적 자아를 이야기한다면 시대 착오적인 목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대 사회인들은 자유교육의 이념이 점점 퇴색해간다 해도 그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현실적 무감각 상태가 빚어내는 암담함은 도리어 바로 자유교육의 이념이 부활되어야만 하는 現實的 理由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한 가지를 더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은 앞의 이유보다 더 根源的이다. 자유교육의 이념이 점차 소멸해 간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人間性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자유교육의 가치를 역설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에 대해 가지게 되는 불만은 현재의 교육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유교육의 이념과 현대 사회에서의 그 타당성을 논하고자 했으나, 그것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계를 갖는다. 또, 구체적 교육과정으로서의 자유교육을 다루지 못했다. 이 점은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는 못했지만 자유교육은 반드시 그 구체적 교과교육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자에 와서 자유교육의 이념이 편협한 主知主義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교과과정의 지성의 개발이나 지식의 형식에만 치중하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덕성이라든가 미적 감각 등은 도외시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자유교육을 부활하자는 주장이 현대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 비판은 검토되어야 한다.
흔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은 지식을 백 번 가르치는 것보다 도덕적 습관 한 가지를 형성 시켜주는 것이 낫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학생들이 지적 전통은 구태의연한 관습의 다발로 여기고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만을 훌륭한 것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지성의 몰락을 의미한다.
마리땡에 의하면 지성은 본질적으로 의지보다 숭고하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지적한 대로, 지성의 활동은 가장 自足的이고 連續的이며, 플라톤도 욕망이나 의지는 결국 지성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마리땡은 지성 그 자체가 인간성 또는 인격의 전부라고 보지 않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지성이 이르러야 할 세계의 성격에 내재해 있다. 그 實在의 세계는 絶對眞理의 세계, 絶對善의 세계, 絶對美의 세계가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세계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성은 그 세계에 도달하는 데 반드시 구비해야 할 가장 훌륭한 통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다. 말하자면 지성은 인간의 意志, 그리고 善에 대한 사랑을 연결시켜 주는 사다리에 비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 세계에 대해 二次的이다. 따라서, 사다리로서 지성을 거치지 않고 몰아세울 수 있다면 이르러야 할 절대세계를 기준으로 하여 보아 이차적 의미를 갖는 지성을 절대시하면서도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교육관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편협한 主知主義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겠다.
하지만 지성과 의지의 문제와 관련해 자유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체의 입장은 주지주의 교육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유교육관을 주지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주지주의라고 단정짓기 전에 왜 지성을 강조해야만 했는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겠다. 주지주의라는 비판이 정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성과 의지의 관계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시민 교육에서 보이는 한계는 무엇인가?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시민 교육에서 보이는 한계는 무엇인가? 지체부자유아의 2차 장애와 그에 따른 교육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
지체부자유아의 2차 장애와 그에 따른 교육적인 문제점과 해결방법 지체부자유아의 2차 장애와 이에 따른 교육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체부자유아의 2차 장애와 이에 따른 교육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제자유도시에 발맞추어 나아가야하는 제주의 음악교육 방향
국제자유도시에 발맞추어 나아가야하는 제주의 음악교육 방향 자유 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
자유 발도르프 학교 교육과정 평생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행동주의
평생교육의 철학적 기초로서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행동주의 <이것이 미래 교육이다 - 일본의 자유학원> 을 보고
<이것이 미래 교육이다 - 일본의 자유학원> 을 보고  (교육사회) 고교평준화에서 신자유주의 논쟁까지
(교육사회) 고교평준화에서 신자유주의 논쟁까지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 한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의 변화들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의 구체...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 한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의 변화들 중 하나를 선택해 그것의 구체... 자유선택활동의 개념 및 교육적 의의
자유선택활동의 개념 및 교육적 의의 [교육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양교육론 연구 - 자유교양교과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양교육론 연구 - 자유교양교과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자유주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레포트 [교육학]
자유학기제에 관한 레포트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