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재판의 경과
1.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6가단89267 판결)
2. 항소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 10. 23. 선고 96나35711 판결)
3. 상고이유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상고기각
III. 문제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교부청구
가. 쟁점
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Ⅱ. 재판의 경과
1.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 7. 18. 선고 96가단89267 판결)
2. 항소심판결(서울지방법원 1996. 10. 23. 선고 96나35711 판결)
3. 상고이유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상고기각
III. 문제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교부청구
가. 쟁점
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전후에 의한 구별
다. 소결
3.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쟁점
나. 학설에 대한 검토
다. 판례분석
(1) 구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관한 판례
(2) 강제경매 및 민사소송법 개정 후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판례
라. 검토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V. 결 론
본문내용
의의 소개는 金賢錫(註17), 225-228面 및 三ケ月/鈴木 共編, 注解 民事執行法(3), 386面 이하 참조.
, 독일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법의 소개에 관하여는 李在桓, \"프랑스법상 不動産押留節次 및 配當節次\", 判例實務硏究(Ⅰ)(1996), 622面 이하 참조.
나 미국
) 이 문제에 관한 미국법의 소개에 관하여는 李聖昊, \"美國法上 擔保權實行 및 强制執行節次와 債權者의 請求金額 擴張의 問題\", 判例實務硏究(Ⅰ)(1996), 629面 이하 참조.
에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5) 二分說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 담보권자를 일반채권자와 구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찬성할 수 없다.
(6) 別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면 配當異議의 남용이 우려될 수도 있다
) 曺南大(註17), 277面.
.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하지 못하니 配當異議를 하여 놓고 보자는 채권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염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배당기일의 정확한 소환, 배당표 작성기간의 준수 등을 통하여 이의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배당에 불만이 있는 以上은 配當異議의 申請 및 配當異議의 訴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한 불복방법을 즉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럼 배당절차가 종료한 후 몇 년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593조이다. 同條는 일단 配當異議를 하여 놓으면 別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가능케 하고 있다. 配當異議를 하고도 기간을 해태하여 配當異議의 訴를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나,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상소기간을 도과한 자,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한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자 등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권리행사를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실체법상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주도하는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편의 개정작업에서 민사소송법 제593조의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
) 법원행정처,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서\"(徐基錫判事 發題 부분)(1996), 57面.
에 전폭적으로 찬동한다. 日本이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舊民事訴訟法에 있던 위와 같은 조항(同法 제634조)을 삭제한 것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현재 일본의 경우. 구 민소법 시대에는 우리 나라의 민소법 제593조와 같은 rwjd을 갖고 있어서(일본 구 민소법 제634조) 긍정설이 통설이었으나, 현재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두지 않고 있고 학계에서는 부정설이 다수설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학계와 판례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분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즉,「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저당부동산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권 또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위 채권자는 위 저당권자가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저당권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며, 배당기일에 있어서 배당이의의 신청이 없이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 위 배당의 실시는 계쟁 배당금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이득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最高載判所 平成 3. 3. 22. 판결과「임의변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복수의 채권자에게 평등변제를 하지 이니한 경우 어느 채권자에 대한 다액의 변제가 당연히 소액 변제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소액변제수령자의 다액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에 있어서도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실체법상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임의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느 채권자에의 다액의 배당이 당연히 소액배당수령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東京高載 平成 2.5.30.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분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判示 부분은 찬성할 수 없다. 그러한 조세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견해이다.
둘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배당기일에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실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 부분도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의견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당원은 아직 위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한 마디로 못박고 있으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지를 재고하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 독일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참고로 이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 이 문제에 관한 프랑스법의 소개에 관하여는 李在桓, \"프랑스법상 不動産押留節次 및 配當節次\", 判例實務硏究(Ⅰ)(1996), 622面 이하 참조.
나 미국
) 이 문제에 관한 미국법의 소개에 관하여는 李聖昊, \"美國法上 擔保權實行 및 强制執行節次와 債權者의 請求金額 擴張의 問題\", 判例實務硏究(Ⅰ)(1996), 629面 이하 참조.
에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5) 二分說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점에서 긍정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배당절차에서 담보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이 담보권자를 일반채권자와 구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역시 찬성할 수 없다.
(6) 別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면 配當異議의 남용이 우려될 수도 있다
) 曺南大(註17), 277面.
.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하지 못하니 配當異議를 하여 놓고 보자는 채권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염려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바람직한 것이다. 물론, 배당기일의 정확한 소환, 배당표 작성기간의 준수 등을 통하여 이의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배당에 불만이 있는 以上은 配當異議의 申請 및 配當異議의 訴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한 불복방법을 즉시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처럼 배당절차가 종료한 후 몇 년 있다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訴를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593조이다. 同條는 일단 配當異議를 하여 놓으면 別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가능케 하고 있다. 配當異議를 하고도 기간을 해태하여 配當異議의 訴를 제기하지 못한 채권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나, 이는 잘못된 발상이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상소기간을 도과한 자, 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한 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자,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자 등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권리행사를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도 실체법상의 구제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주도하는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편의 개정작업에서 민사소송법 제593조의 삭제 필요성이 제기된 것
) 법원행정처,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서\"(徐基錫判事 發題 부분)(1996), 57面.
에 전폭적으로 찬동한다. 日本이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舊民事訴訟法에 있던 위와 같은 조항(同法 제634조)을 삭제한 것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IV. 일본의 판례경향(이분설)
현재 일본의 경우. 구 민소법 시대에는 우리 나라의 민소법 제593조와 같은 rwjd을 갖고 있어서(일본 구 민소법 제634조) 긍정설이 통설이었으나, 현재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두지 않고 있고 학계에서는 부정설이 다수설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학계와 판례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분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즉,「저당권자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저당부동산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채권 또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위 채권자는 위 저당권자가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저당권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며, 배당기일에 있어서 배당이의의 신청이 없이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 위 배당의 실시는 계쟁 배당금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이득에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最高載判所 平成 3. 3. 22. 판결과「임의변제에 있어서 채무자가 복수의 채권자에게 평등변제를 하지 이니한 경우 어느 채권자에 대한 다액의 변제가 당연히 소액 변제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소액변제수령자의 다액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에 있어서도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실체법상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임의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느 채권자에의 다액의 배당이 당연히 소액배당수령자의 손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한 東京高載 平成 2.5.30.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분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이상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한 압류등기를 한 조세채권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判示 부분은 찬성할 수 없다. 그러한 조세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별도로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筆者의 견해이다.
둘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배당기일에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실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 부분도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의견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당원은 아직 위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고 한 마디로 못박고 있으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변경할 필요성이 없는지를 재고하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법대로-부동산특별조치법과태료규칙
법대로-부동산특별조치법과태료규칙 세무회계-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세무회계-국세 부과권과 제척기간, 납세의무 승계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해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대해서... 국민연금가입자와보험료
국민연금가입자와보험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쟁점 [조세][조세제도][조세법률주의][조세부담률][세금][조세구조개혁]조세제도의 구성, 조세제도...
[조세][조세제도][조세법률주의][조세부담률][세금][조세구조개혁]조세제도의 구성, 조세제도...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 관세환급
관세환급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원천징수세액]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국세기...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 납세자권리구제제도, 원천징수세액]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국세기... [기업 지원제도][중소기업 지원제도][여성기업 지원제도][신노사문화추진기업 지원제도][중소...
[기업 지원제도][중소기업 지원제도][여성기업 지원제도][신노사문화추진기업 지원제도][중소... [벤처기업 지원][보증지원][창업지원][세제지원][융자지원]벤처기업의 보증지원, 벤처기업의 ...
[벤처기업 지원][보증지원][창업지원][세제지원][융자지원]벤처기업의 보증지원, 벤처기업의 ...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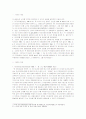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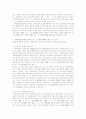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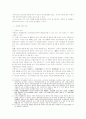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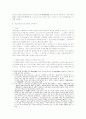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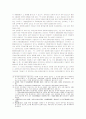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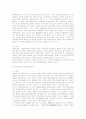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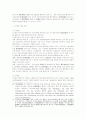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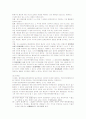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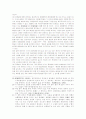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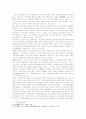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