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판례의 문제점
1. 신분의 개념
2. 형법 제33조의 적용
3. 단순위증죄의 공소시효 완성문제
Ⅳ. 결 론
Ⅱ. 대법원 판결 요지
Ⅲ. 판례의 문제점
1. 신분의 개념
2. 형법 제33조의 적용
3. 단순위증죄의 공소시효 완성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킬 필요도 없었으며, 형법 제33조가 개입될 문제도 아니게 된다. 또한 제33조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판결까지 이르지 않게 될 수도 있었다. 대상판례를 비판하기 전에 이 판례의 원심판결에서 정범 丁에게 모해위증죄가 아닌 단순위증죄로 판결한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Ⅳ. 결 론
대상판례는 신분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분의 개념에 모해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이 판례는 신분의 개념을 너무 확장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례와 같이 모해의 \'목적\'을 신분의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판례이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하였을 때에는 진정신분범의 경우는 제33조의 본문에 의해서 부진정신분범의 경우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르지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대상 판례와 같이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한 경우는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정범이 단순위증죄로 처벌받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정범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는가?
대상판례와 같이 모해의 \'목적\'을 신분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공범과 정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법 제31조 제1항으로 처벌하면 된다. 정범은 교사범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아야 하므로 甲이 丁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지라도 丁이 단순위증만을 했을 때는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서 丁을 단순위증죄로 판단한 결과, 甲을 공소시효 완성으로 단순위증교사가 아닌 모해위증교사로 기소한 점 역시 처벌을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근거 없이 처벌을 하기 위한 방책으로 모해위증교사로 甲을 기소한 것과, 그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丁을 단순위증으로 판단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
결론적으로 모해의 \'목적\'은 신분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상판례의 내용은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제33조의 단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신분범과 공범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순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甲이 단순위증죄의 신분자인 丁에게 가공한 행위로 보아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甲은 진정신분범인 丁의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Ⅳ. 결 론
대상판례는 신분의 개념에 대해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분의 개념에 모해의 \'목적\'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이 판례는 신분의 개념을 너무 확장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례와 같이 모해의 \'목적\'을 신분의 개념에 포함시킨다고 해도 형법 제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판례이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하였을 때에는 진정신분범의 경우는 제33조의 본문에 의해서 부진정신분범의 경우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르지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대상 판례와 같이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행위에 가공한 경우는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정범이 단순위증죄로 처벌받는데 어떻게 그에 대한 정범이 더 무거운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는가?
대상판례와 같이 모해의 \'목적\'을 신분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공범과 정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형법 제31조 제1항으로 처벌하면 된다. 정범은 교사범이 실행한 범위 내에서 처벌받아야 하므로 甲이 丁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을지라도 丁이 단순위증만을 했을 때는 甲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서 丁을 단순위증죄로 판단한 결과, 甲을 공소시효 완성으로 단순위증교사가 아닌 모해위증교사로 기소한 점 역시 처벌을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떠한 근거 없이 처벌을 하기 위한 방책으로 모해위증교사로 甲을 기소한 것과, 그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丁을 단순위증으로 판단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
결론적으로 모해의 \'목적\'은 신분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상판례의 내용은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제33조의 단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신분범과 공범간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단순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자인 甲이 단순위증죄의 신분자인 丁에게 가공한 행위로 보아 제33조 본문을 적용하여 甲은 진정신분범인 丁의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이 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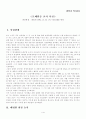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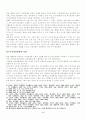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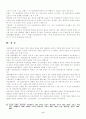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