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사항으로 신설한 이상(49조 2항 9호) 당연히 이를 정관에도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주38) 그러나 양자가 서로 연결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38) 民法案審議錄(上). 42면.
3. 제140조(法律行爲의 取消權者)
(1) 改正案
_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153]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무능력자 다음에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를 한 자\"를 삽입한다.
(2) 理 由
_ 본조는 \"瑕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자\"를 취소권자로 드는데, 이 표현은 舊民法 제120조와 똑 같다. 그런데 舊民法(95조)에서는 착오의 효과를 無效로 하였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행민법은 착오의 효과로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정하였기 때문에(109조),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이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위 표현대로 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가 빠지게 되어 제109조와 본조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4. 제153조(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1) 改正案
_ 제153조는 ① 期限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期限의 利益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본조를 삭제한다.
(2) 理 由
_ (a) 본조는 總則編 제5장 法律行爲의 제5절 條件과 期限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5절의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附款으로서 정하여진 것인데, 그러나 본조가 정하는 期限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에 걸리는 부관이 아니라 \'債務履行\'의 기한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지어 그 속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한편 본조가 규정하는 期限의 利益은 債權編 제468조(辨濟期 前의 辨濟)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이고, 또 期限의 利益의 喪失을 債權編 제388조에서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주39) 이 있다.
주39) 梁彰洙, 民法硏究 제4권, 8면.
[154] _ (b) 본래 舊民法은 總則編 제136조에서 본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이어서 제137조에서 \'期限의 利益의 喪失\'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만주민법은 이 양 규정을 총칙편에 규정하지 않고, 期限의 利益의 喪失은 채권편 제2절 채권의 효력 내에 제375조로서 규정하였고,주40)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는 그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것으로 보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를 채권편 변제의 款에서 제455조로서 이를 규정하였다.주41)
주40) 만주민법 제375조 :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담보를 훼손 또는 감소시킨 때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때
주41) 만주민법 제455조 : 채무자는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_ 그런데 현행 민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舊民法 제137조의 규정만을 債權編으로 옮겨 현행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만주민법(375조)의 例에 따라 총칙편에 있던 위 규정을 債權編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주42) 한편 민법 제468조(변제기 전의 변제)는 舊民法에는 없던 신설조문인데, 이것 역시 만주민법(455조)과 그 취지가 동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주43)
주42) 民法案審議錄(上). 98면. 232면.
주43) 民法案審議錄(上). 275면.
_ 위와 같은 입법과정을 미루어보면, 만주민법은 기한의 이익의 상실과 포기를 채권편으로 옮겨 이행지체에서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또 변제와 관련하여 정한 것이고, 이를 우리 민법이 따른 것인데, 그러면서도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총칙편에 남겨둠으로써 변제기 전의 변제와 그 내용이 중복되게 되었고 나아가 그 편성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5. 指示債權과 無記名債權의 위치 이동 여부
(1) 改正案
_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제7절 指示債權(508조 522조)과 제8절 無記名債權(523조 526조)의 위치는 그대로 두되, 이를 \'제7절 證券債權\'으로 통합하여 이름하고 그 안에 \'제1관 指示債權\'과 \'제2관 無記名債權\'을 규정한다.
[155]
(2) 理 由
_ 본래 舊民法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을 \'債權의 讓渡\'의 節 속에서 같이 규정하였는데(舊民 469조 473조). 현행 민법은 특히 지시채권에 관해 어음, 수표법과 그 정신을 같이 하는 규정을 많이 신설(509조 514조, 516조, 517조, 519조 522조)하면서 그리고 만주민법(496조 514조)의 예에 따라 이를 채권편 총칙의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 위와 같이 정한 것이다. 이러한 체재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도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채권양도의 절에서 이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주44) 가 있다.
주44) 徐敏. \"債權法의 改正方向\", 민사판례연구(VII). 331면.
_ 그러나 현행 민법은 舊民法과는 달리 어음, 수표법과 그 정신을 같이 하는 많은 규정을 신설한 점, 민법이 규율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인 점등의 이유에서 볼 때, 지금처럼 지명채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후 (즉 채권의 소멸까지) 그 다음 부분에서 이를 규율하는 체재가 틀린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나 증권채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이를 별개의 절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만주민법의 예에서처럼 證券債權으로 통합하여 그 안에 이를 각각 두는 것이 좋을 듯 싶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입법당시에도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증권채권으로 이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주45) 이 있었다.
주45) 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153면 이하 참조(徐燉珏. 박사 집필).
주38) 民法案審議錄(上). 42면.
3. 제140조(法律行爲의 取消權者)
(1) 改正案
_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자,[153]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무능력자 다음에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를 한 자\"를 삽입한다.
(2) 理 由
_ 본조는 \"瑕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자\"를 취소권자로 드는데, 이 표현은 舊民法 제120조와 똑 같다. 그런데 舊民法(95조)에서는 착오의 효과를 無效로 하였기 때문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행민법은 착오의 효과로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정하였기 때문에(109조),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이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위 표현대로 하면 착오에 의한 취소가 빠지게 되어 제109조와 본조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4. 제153조(期限의 利益과 그 抛棄)
(1) 改正案
_ 제153조는 ① 期限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期限의 利益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본조를 삭제한다.
(2) 理 由
_ (a) 본조는 總則編 제5장 法律行爲의 제5절 條件과 期限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5절의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附款으로서 정하여진 것인데, 그러나 본조가 정하는 期限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에 걸리는 부관이 아니라 \'債務履行\'의 기한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행위의 내용과 관련지어 그 속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한편 본조가 규정하는 期限의 利益은 債權編 제468조(辨濟期 前의 辨濟)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것이고, 또 期限의 利益의 喪失을 債權編 제388조에서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비판주39) 이 있다.
주39) 梁彰洙, 民法硏究 제4권, 8면.
[154] _ (b) 본래 舊民法은 總則編 제136조에서 본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이어서 제137조에서 \'期限의 利益의 喪失\'에 관해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만주민법은 이 양 규정을 총칙편에 규정하지 않고, 期限의 利益의 喪失은 채권편 제2절 채권의 효력 내에 제375조로서 규정하였고,주40)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 대해서는 그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취지의 것으로 보이는 \'변제기 전의 변제\'를 채권편 변제의 款에서 제455조로서 이를 규정하였다.주41)
주40) 만주민법 제375조 : 채무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담보를 훼손 또는 감소시킨 때 2.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때
주41) 만주민법 제455조 : 채무자는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_ 그런데 현행 민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舊民法 제137조의 규정만을 債權編으로 옮겨 현행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를 만주민법(375조)의 例에 따라 총칙편에 있던 위 규정을 債權編으로 옮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주42) 한편 민법 제468조(변제기 전의 변제)는 舊民法에는 없던 신설조문인데, 이것 역시 만주민법(455조)과 그 취지가 동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주43)
주42) 民法案審議錄(上). 98면. 232면.
주43) 民法案審議錄(上). 275면.
_ 위와 같은 입법과정을 미루어보면, 만주민법은 기한의 이익의 상실과 포기를 채권편으로 옮겨 이행지체에서의 이행기와 관련하여 또 변제와 관련하여 정한 것이고, 이를 우리 민법이 따른 것인데, 그러면서도 기한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총칙편에 남겨둠으로써 변제기 전의 변제와 그 내용이 중복되게 되었고 나아가 그 편성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5. 指示債權과 無記名債權의 위치 이동 여부
(1) 改正案
_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는 제7절 指示債權(508조 522조)과 제8절 無記名債權(523조 526조)의 위치는 그대로 두되, 이를 \'제7절 證券債權\'으로 통합하여 이름하고 그 안에 \'제1관 指示債權\'과 \'제2관 無記名債權\'을 규정한다.
[155]
(2) 理 由
_ 본래 舊民法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을 \'債權의 讓渡\'의 節 속에서 같이 규정하였는데(舊民 469조 473조). 현행 민법은 특히 지시채권에 관해 어음, 수표법과 그 정신을 같이 하는 규정을 많이 신설(509조 514조, 516조, 517조, 519조 522조)하면서 그리고 만주민법(496조 514조)의 예에 따라 이를 채권편 총칙의 마지막 부분으로 옮겨 위와 같이 정한 것이다. 이러한 체재에 대해서는, 채권의 양도라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채권양도의 절에서 이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주44) 가 있다.
주44) 徐敏. \"債權法의 改正方向\", 민사판례연구(VII). 331면.
_ 그러나 현행 민법은 舊民法과는 달리 어음, 수표법과 그 정신을 같이 하는 많은 규정을 신설한 점, 민법이 규율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인 점등의 이유에서 볼 때, 지금처럼 지명채권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후 (즉 채권의 소멸까지) 그 다음 부분에서 이를 규율하는 체재가 틀린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나 증권채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이를 별개의 절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만주민법의 예에서처럼 證券債權으로 통합하여 그 안에 이를 각각 두는 것이 좋을 듯 싶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입법당시에도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증권채권으로 이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주45) 이 있었다.
주45) 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153면 이하 참조(徐燉珏. 박사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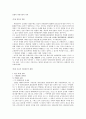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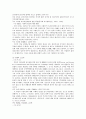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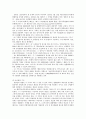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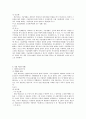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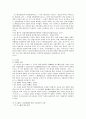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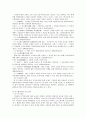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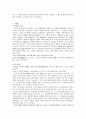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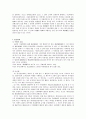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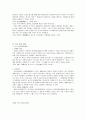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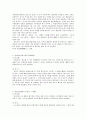









소개글